-

-
복수의 심리학
마이클 맥컬러프 지음, 김정희 옮김 / 살림 / 2009년 3월
평점 :

품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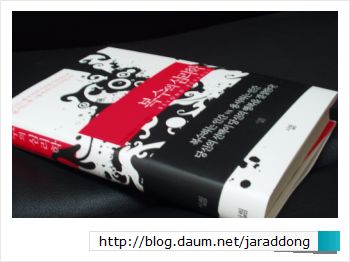
복수는 선택이 아니라 본능이며, 용서는 인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본능이다 ?
요즘 사회에서는 복수를 일종의 정신적 병의 하나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복수는 유전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정신병이라고 하기보다는, 환경적인 요소로 그 욕망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듯 하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용서를 하고자 마음을 다잡았다 하더라도 피의자를 마주하는 순간 일어나는 증오와 복수라는
순간적인 욕망과 본능으로 복수의 살해를 하게되는 경우도 많다. 이럴경우 우리는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변한 그를 두고
정신병자라고 말 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그 순간의 치기어린 분노를 잠재우지 못했을 뿐이지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었거나,
처음부터 복수라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피의자에서 피해자로 변한 그를 만난것은 아닐테니까 말이다.
[복수의 심리학]에서는 인간만이 복수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새나 물고기조차 복수와 용서라는 본능과 진화를
갖고 있다고 주장해오고 있으며, 이에대한 과학적 증거도 제시해주었는데, 나에게는 무척 신기하면서도 흥미로운 점이였다.
오랜 세월 인간들이 살아오면서 숙제처럼 떠안고 오던 <복수>라는 욕망에 대해 동물들은 이미 그 해결책을 찾은것이 아닌가,
결국 인간은 동물보다 못한 존재인가..라는 생각도 잠시 들었다.
예를 들어 거피라는 물고기의 경우, 이들은 무리중에서 3~4 마리정도 탐색조를 짜서 자신들을 위협하는 포식 물고기로부터
안전한가를 탐색한다고 한다. 이때, 만약 게으름을 피우거나, 혼자만 살겠다고 꾀를 부르는 동료가 있다면,
다른 동료들은 그 꾀쟁이 물고기를 가장 위험한 자리로 밀어버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꾀쟁이 물고기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로 다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면 동료들은 게으름뱅이 물고기를 용서해준다고 한다.
하물며, 이렇게 물고기 조차도 쉽게 용서를 해주는데 반해 인간은 어째서 잔인한 복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일까?
대개 모든 복수와 원망은 대부분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정말 별것도 아닌 사소한 일이 커다란 원망을 만들고, 그 원망은 복수라는 결정체를 생산해 냄으로써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뉴스에서 흔히 보는 '말다툼 끝에 살해' 라던가, '술기운에 벌어진 폭행이나 살인'사건 같은 것들은 이런 경우에 해당 되는 것 같다. 분명 그 시작점은 아주 조그마해서 보이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상대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으로 맺어졌으니,
사소함이 만들어낸 원망과 분노의 힘은 참으로 경악할 만한 수준인듯 하다.
우리는 분명용서를 하면 평화를 얻고 용서를 하지 않으면 평화 역시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버릴 수 없는 복수라는 욕망은 어떤 것이고, 왜 우리안에 존재하는 것일까?
인간에게 복수심은 복수심이라는 허기를 채워주는 욕망의 산물이다.
인간은 이 허기심을 채워주는 복수를 위해 좌측 전전두엽을 사용한다고 한다.
즉 우리는 복수를 계획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노력할때 사용하는 신경계 하드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복수를 함으로써 생기는 쾌감과 희열감을 잊을 수 없기에, 복수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복수라는 치명적인욕망을 이겨낼 수는 없는 것일까??
저자는 그 복수라는 허기심을 채워주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공감>을 내새웠다.
복수대신 용서에서 모든 기쁨을 얻는 회선의 방법은 가해자에게 공감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예를 들어 얼마전에 미국에서 비행기가 추락해서 한인가족이 몰살당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지만,
이 사고로 아내와 아이를 잃은 남편은 그 비행기의 조종사를 용서한다고 말해 큰 감동을 주었었다.
그가 조종사의 입장에서 조종사를 공감하였기에 가능했던 일이 아니였을까?
툭하면 법적인 싸움을 하는 미국에서는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였으며, 여러 사람들에게 <용서>라는 희망을 보여주기도 한 사건이였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큰 아픔을 겪었음에도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에게는 <용서 능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인간 본성에 내재되었으나, 복수라는 큰 욕망에 눌린 용서라는 본능은 복수와 하나의 맥락에서 공존하고 있는 것 같다.
인간은 호모사피엔스, 호모 이그노센스, 호모울토르로 진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용서라는 진화적인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또 한번 진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