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터널 103 ㅣ 소설Y
유이제 지음 / 창비 / 2024년 2월
평점 :




책을 읽다보면 다음 페이지를 먼저 훑어 보지 않아도 대강의 그림이 그려지곤 한다. SF소설의 독파력을 좀 쌓아두었더니 다음 페이지에 보여질 세상의 미래가 보인달까? 그게 당연했으면 싶은 이유는 이후의 이야기가 절망보다는 희망의 방향으로 기울어지길 바라는 마음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이 책을 두고 김칸비 만화가는 이런 말을 했다.
'인간은 왜 인간인가? 인간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존을 건 사투, 그리고 마침내 도달한 고립의 끝. 하지만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희망인지 정말인지 모호하다. 우리의 삶이 늘 그렇듯이.'
삶이 항상 해피엔딩이 될 순 없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흘러가듯 유유히 이어지는 방식은 아니다. 어떻게든 버텨내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 인간이며, 인간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어떻게든 그 순간을 넘서야하고, 넘어 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힌트 같았다. 그래서인지 다형의 코 앞에 닥쳐온 시련, 혹은 인생의 가장 큰 선택의 순간을 잘 넘겨 인간다운 인간의 삶을 살 수 있을거라는 기대를 하게 만들었다.

사람 사는게 나와 같은 마음만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없고, 나의 의견에 무조건적인 응원을 보내는 이도 없다. 어디든 대립이 되는 인물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의지와 간절함이 더해지는 느낌도 든다. 이야기의 초반 다형이 터널에 머무를 수 없도록 자극하는 황필규. 전형적인 밉상의 캐릭터이며 자신의 이득은 당연한 것이고, 남들의 희생이 단체생활에 필요한 부분이라 여기는 인물이다. 어찌보면 권력을 등에 지고 자기 살 길은 터 넣고 남들을 쥐어짜는 악역이기도 한데 이 자가 이 책의 말미에도 이리 당당하게 요구하며 다형을 내몰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며 이야기를 따라가도 좋다.
터널로 들어 올 수 밖에 없었던 이유. 괴생명체를 피해 해저 터널로 들어와 자진 고립을 감수해야 했던 존재. 짠물이 들어오는 순간 더이상 이 곳도 안전하지만은 않다는 걸 알지만 터널 밖의 세상이 두려움으로 가득한 것. 이건 어찌보면 요즘 사람들이 갖고있는 마음의 빗장 같을 수도 있음을 생각해본다. 마음을 닫아두고 타인의 자극을 외면 하는 것. 밖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해결 할 수 있진 않을까를 고심하며 어떻게든 마음의 확장을 기대하기보단 점점 안으로 빨려들어가는 그야말로 요즘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터널103이지 않을까를 생각해본다.
무피귀는 학창시절 과학실에서 보았던 인체모형을 떠올리게 했다. 키는 성인 남성의 두 배에 육박했고, 피부가 없는 탓에 근육, 힘줄, 인대 뼈 등이 고스란히 드러나있는 존재. 눈꺼풀 없이 돌출된 안구. 그것을 움직이는 실타래와 같은 근육의 움직임.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사람이 아닌 몰골. 낯선곳, 변화된 환경에 발가벗겨진 채 그대로 방치된 또 다른 인간의 거죽과 동시에 심연 불완전한 마음과도 이어짐을 느꼈다.
다형은 터널 안의 사람을 구하기 위해. 무엇보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터널 밖을 나섰고, 터널 밖에서 무피귀와 그간 모르고 지내온 같은듯 다른 인간들과 마주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심한다. 그러면서 만난 싱아. 무피귀로 변하기 이전의 그야말로 다형과 같은 모습을 한 아이. 무피귀가 되려는 모체의 상태에서 나왔던 터널 밖의 생존 아이. 싱아를 통해 미리 짐작해보는 이들의 앞날. 산과 들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로 어린순은 나물로도 먹고, 약재로도 쓰이는 어디서든 잘 자라는 풀. 그리고 6월 경 흰 꽃을 피우는 것에 대한 학명으로 다형은 싱아의 도움으로 꽃을 피울 것이고, 싱아로 인해 어디서든 잘 자라는 것 마냥 어디서든 해결책을 제시 해 줄 것을 이름에 숨겨놓음을 생각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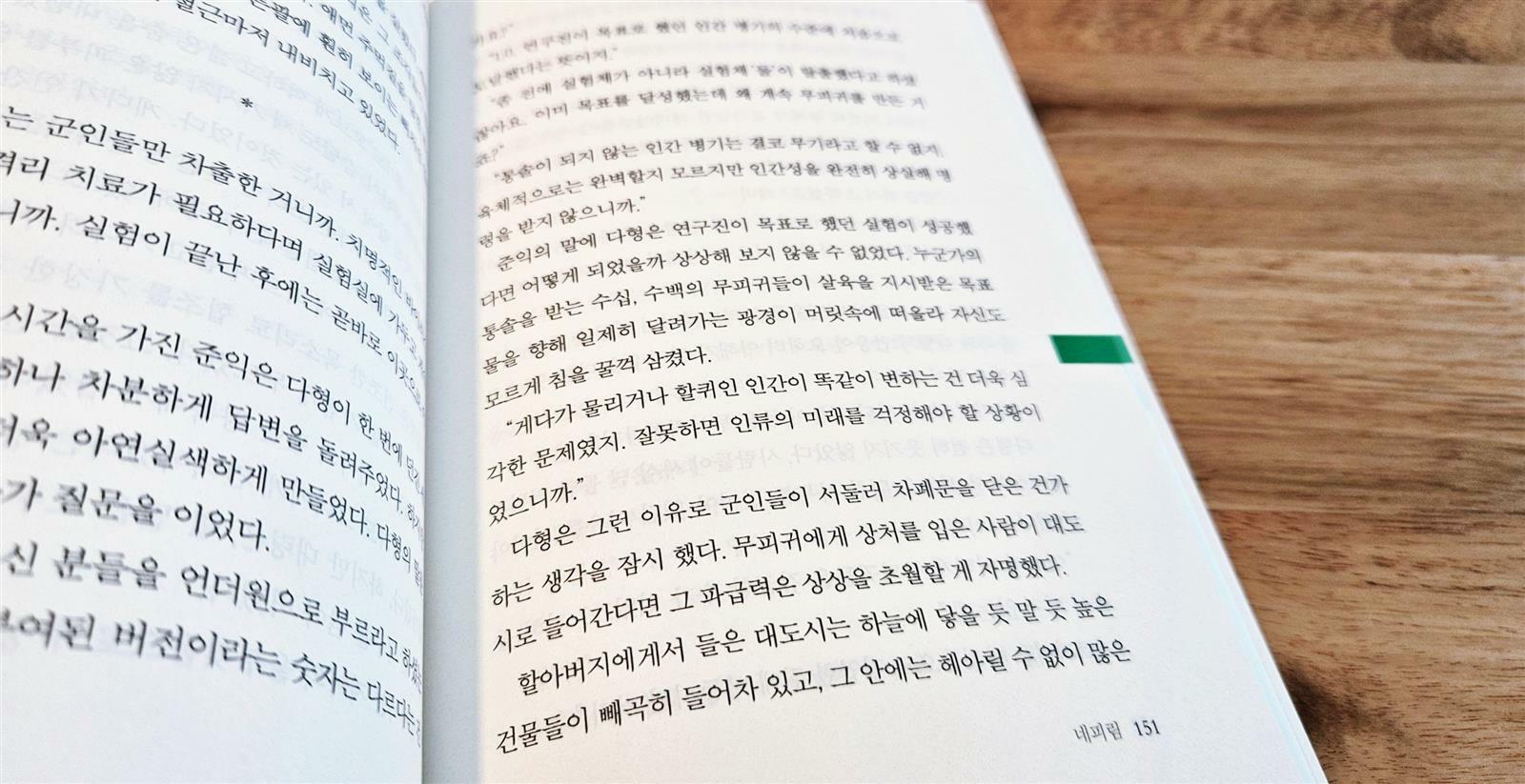
준익이 말했던 무피귀.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을 빌미로 이뤄진 연구를 빙자한 인간 병기의 결말. 물리거나 할퀴인 인간이 똑같이 변하는 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했던 말 처럼 사람의 탈을쓰고 악인으로 바뀌고 상대를 해할 수 있는 것은 큰 작심 없이 이룰 수 있는 이기심으로 보였다. 사람이 사람을 그리 만들었고, 자신은 아닐거라 했지만 환경에 휩쓸려 악인이 되는 것은 한순간임을 무피귀와 무피귀를 만들어낸 연구진들을 통해 어쩌면 우리도 반반한 인간의 낯짝을 한 무피귀가 될 수 있음을 내비친 대목이었다.
태관은 아버지의 이야기로 횡설수설하며 자신의 이득을 위해 서슴없는 행보를 이어가다 결국 제 발에 걸려 넘어진 인간의 약은 수를 보여주었다. 가뭄을 탓하라 했고, 운 좋으면 살아남아보라는 말을 통해 극한 상황속에서 협업보다는 개인의 득을 꾀하며 그 값을 톡톡히 치르는 모습이 보인다.
때로는 권선징악이 너무 흔한 결말 같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바라게된다. 현실에서 잘 없는 깔끔한 엔딩이니 이러한 책 속 이야기에서 만이라도 이뤄져 주면 그래도 세상은 따뜻하고 선한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껀덕지(?)가 있긴 한가보다 싶어지니 태관의 에피소드가 스치는 인물 중 하나이지만 그래도 다형에게 전화위복이 되어주는 듯 해 한시름 덜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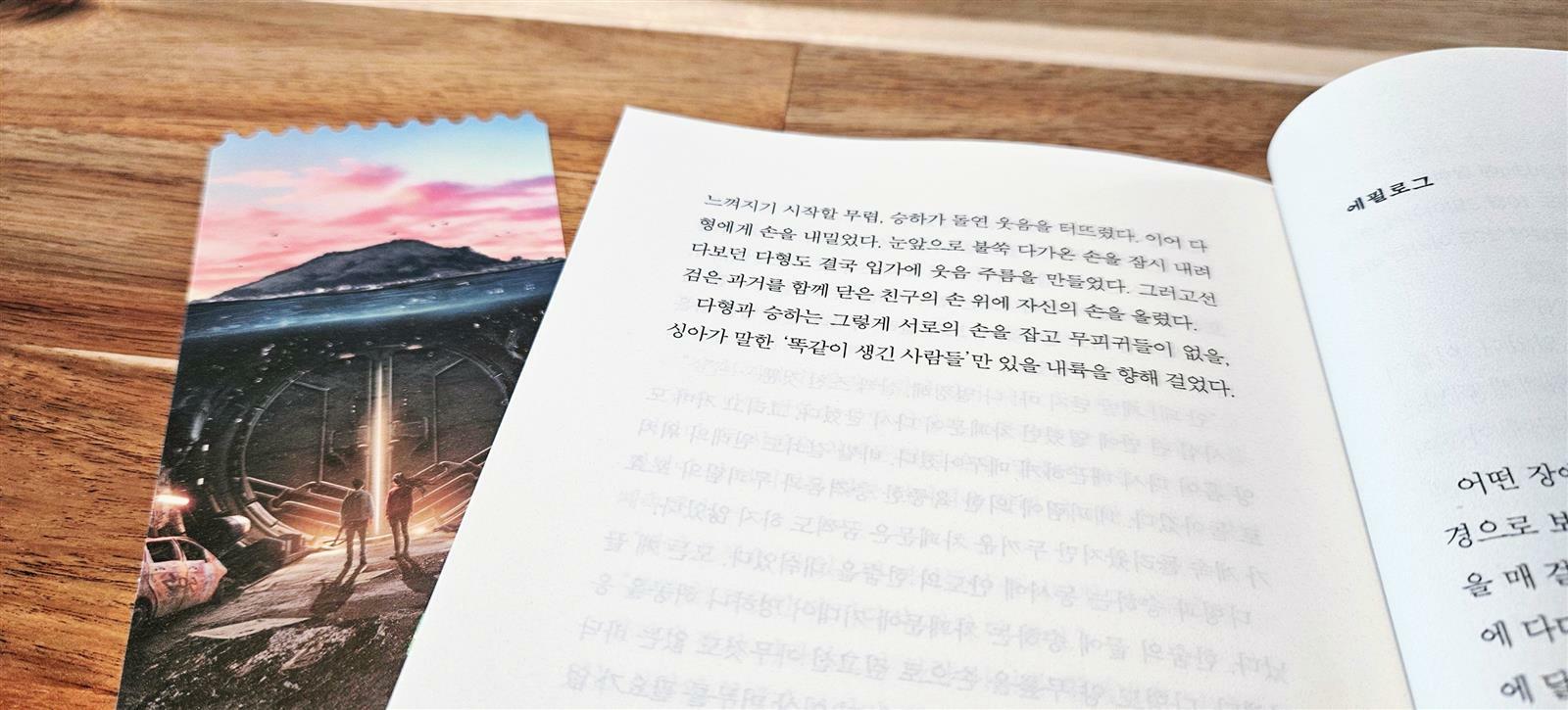
똑같이 생긴 사람들만 있는 내륙.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 이뤄낸 결말. 다형의 입가에 지어진 주름. 함께 꾼 악몽이 아닐까 의심스러웠던 순간.
결국 내가 원했고, 저자가 바라는 이 이야기의 끝이 마지막 문장에 걸려있다. 마음의 꺼풀이 벗겨져있지 않은, 힘줄과 근육의 핏빛 서늘함이 없는 완전히 꽉 채워진 이야기의 끝이지만 어딘가 아쉽다. 다형이 열어낸 터널의 문. 어쩌면 다형의 마음 깊숙이 막혀있던 마음의 빗장까지도 열린게 확실한지. 많은 이들에게 두루두루 쓰여지며 결국 봄의 끝에 꽃을 피우는 식물 싱아처럼 싱아가 보게될 세상의 모습은 어떨지 이야기가 좀 더 이어지면 어땠을까를 생각해본다.
터널103의 문은 같은 외형을 하고 있으나 서로 다른 모습을 감춘 마음의 문과도 같았다. 스멀스멀 들어오는 타인의 인기척에도 벽을 쌓고 살 것인지. 어떻게든 열어 또 다른 세계로 이어질 다리를 건널지에 대한 것을 나는 다형을 통해 계속 이입하게 되었다. 익숙한 소재이며 충분이 예견 가능한 흐름이지만 그럼에도 궁금하고 살아나주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의 끝엔 나도 이 옹졸한 마음의 문을 열고 넓은 곳에서 유영하고픈 바람이 가득 얹어져있기에 완독 할 수 있었다.
📖창비를 통해 가제본만은 제공받아 완독 후 기록한 서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