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물에 대해 쓰려 했지만
이향규 지음 / 창비교육 / 2023년 6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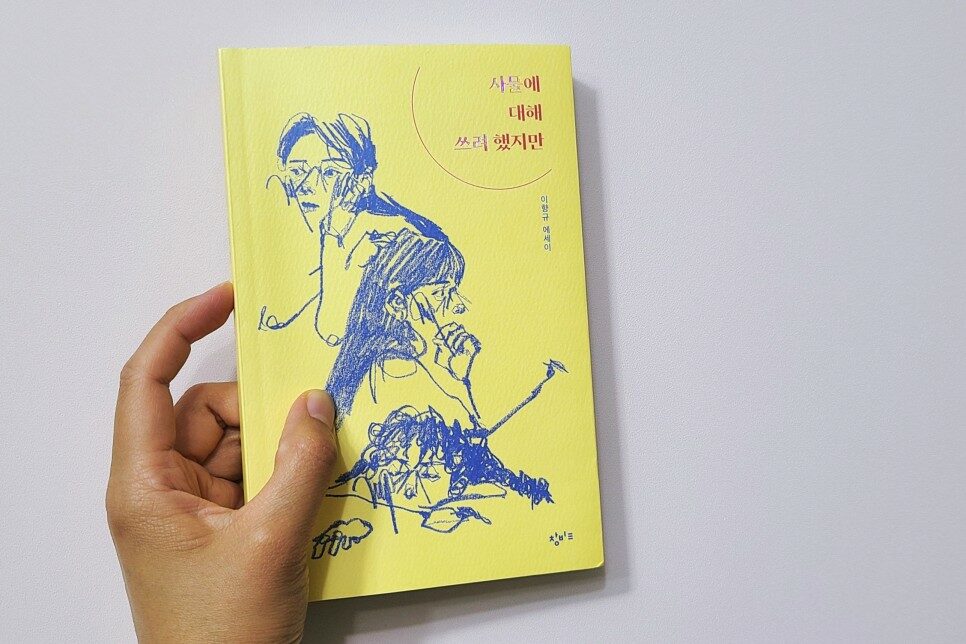
한국에세이들을 많이 읽어봤지만 처음 만나는 저자의 이름이다. 이항규는 정말 나와 다른 삶의 목표를 갖고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다. 다문화 청소년과 탈북 이주민, 결혼 이주 여성을 돕는 활동가이자 연구자. 재영 어린이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치는 교육자, 소수자의 소외 문제와 연대의 의미를 탐색하는 저술가. 이향규를 일컫어 말하는 문장에는 내가 공감하고 함께하는 지점이 하나도 없었다. 언론을 통해 접하기만 했고, 탄식은 했으나 공감보다는 그러려니 하는 마음이 더 컸던 저자의 삶이라 과연 내가 이 책에서 감정 이입 될 부분이 있긴 할까 의심을 가지며 책을 보게만들었다. 저자의 전작 '후아유'도 읽지 않았고, 최근에 출간된 이 책으로 먼저 대면해도 되는건가 싶어하며 의심과 호기심을 둘 다 쥐고 일단 읽어보기로 했다. 읽다보면 뭐라도 나오겠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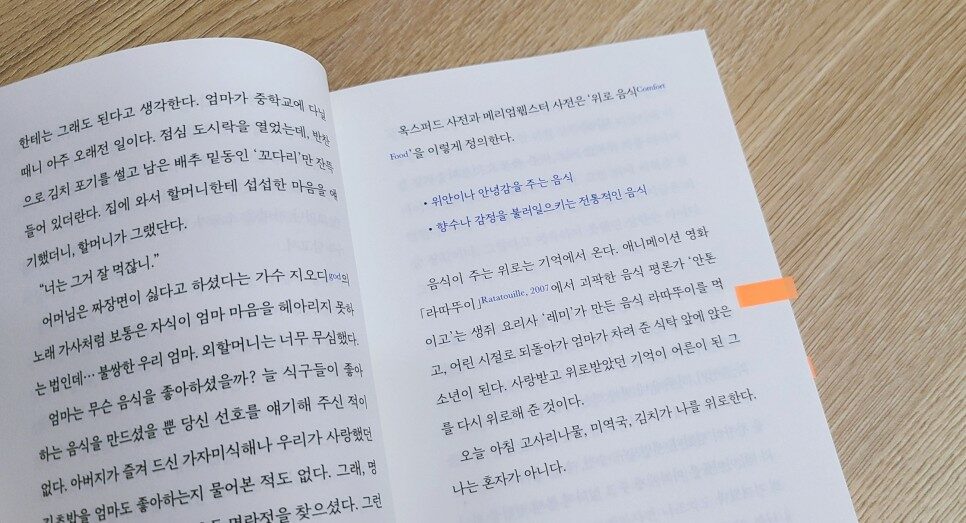
📖 위로 음식_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 엄마가 차려 준 식탁 앞에 앉은 소년이 된다. 사랑받고 위로받았던 기억이 어른이 된 그를 다시 위로해 준 것이다. 오늘 아침 고사리나물, 미역국, 김치가 나를 위로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소울푸드라는 말 보다 위로의 음식. 아플 때 생각나는 그거! 라는 게 더 어울릴 듯한 것들이 있다. 가령 나에겐 엄마가 밥통으로 해주셨던 노오랗고 달큰한 카스테라라던가 친구들과 가정시간 요리실습을 끝낸 후 다같이 모여 양푼에 비벼먹던 비빔밥이라던가 남편이 집에 있는 것들로만 만드는데도 계속 먹게되는 볶음밥이라던가. 우리에겐 비싸거나 귀한 음식도 기억의 한 자락을 차지하고 있으나 사사로운 것들에도 추억과 낭만과 행복이라는 필터로 보정되어 계속 생각이 나곤 하더라.
저자는 타국에서 둘째를 낳고 몸을 추스릴 때, 아이들의 도시락을 챙길 때, 그런 일반적인 순간에도 음식에 대한 아련함이 같이 피어오른다. 먹고사니즘이 바빴던 우리의 어린 시절이었다. 그래서 더 많이 떠오르고, 더 많이 애틋해지나보다. 저자의 아이들도 음식을 통해 엄마를 떠올리고, 아빠를 추억하는 것들이 있어주면 좋겠다. 오래 살진 않았으나 30년 넘게 살아보니 그러한 위로의 음식과 낭만이 가득한 순간은 사는데에 제법 든든한 지지대 역할을 하게되니 지금이라도 하나 만들어보라고 일러주고싶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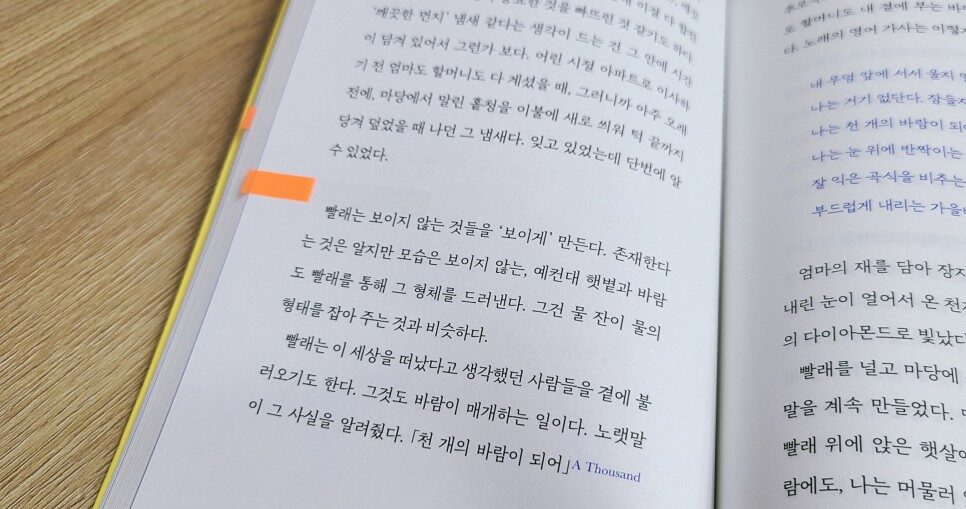
📖 빨래_ 존재한다는 것은 알지만 모습은 보이지 않는, 예컨대 햇볕과 바람도 빨래를 통해 그 형체를 드러낸다.
바싹 마른 빨래의 감촉과 향은 뜨거운 열기를 품고 단숨에 말려지는 건조기의 그것과 사뭇 다르다.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뽀얀 구름이 하늘에 툭툭 얹어진 날이면 공기의 감촉도 느낄 수 있다. 그늘이 되어 줄 곳이 없는 쨍한 햇살만 비칠 때엔 후끈한 열기만 느껴지다가도 구름에 가리거나 나무덕에 그늘이 생기게 되면 목덜미에 흐르던 땀도 금새 말라가는 순간을 누리게 된다. 이런날 햇살과 바람을 담아두지 못해 아까운 마음을 달래듯 부지런히 몸을 놀려 빨래를 하고 건조대에 축축한 옷가지와 이불을 널어둔다. 가장 촌스러운 색깔의 빨랫집게를 무심하게 툭툭 꼽아놓으면 그것마저도 나름의 멋이 들곤 한다. 저녁밥을 앉혀두고 한숨돌리며 빠작하게 마른 빨래들을 걷어 어깨에 척척 얹어두면 진득했던 햇살의 내음과 유유자적 흐르던 바람의 흔적과 우리집 빨래에서만 느낄 수 있는 비누냄새까지 켜켜이 쌓여 오늘의 날씨와 시간을 헤프게 쓰진 않았음에 혼자만 느끼는 뿌듯함으로 가득해진다. 나의 빨래는 그렇게 정의하고 기록할 수 있겠다.
지금의 아이들에게 이 감성을 전해주고파도 집에 건조기가 없는건지. 왜 그렇게 말려야하는건지를 물을수도 있겠다만 이건 나이가 먹을 만큼 먹은 우리만이 갖고 있는 기쁨이라 여기고 반듯하게 개어놓고 싶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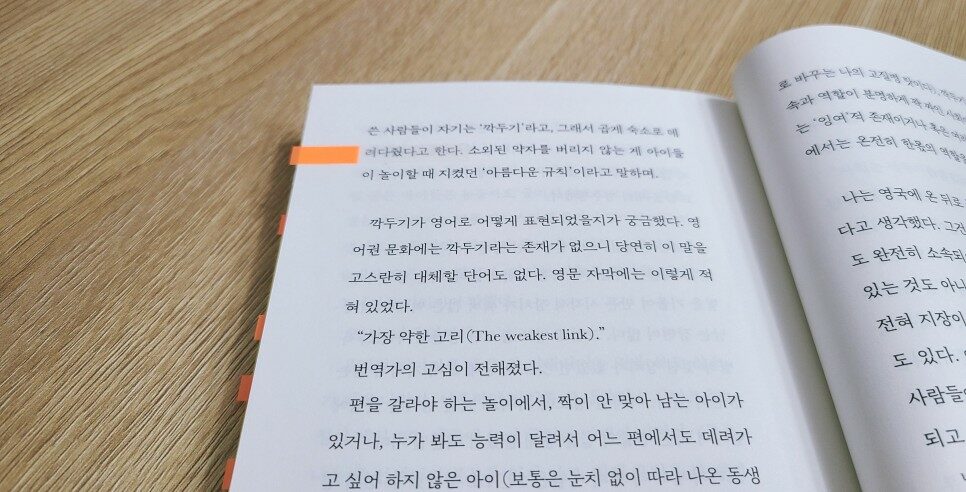
📖 깍두기_ 소외된 약자를 버리지 않는 게 아이들이 놀이할 때 지켰던 '아름다운 규칙'이라고 말하며.
아름다운 규칙이자 외면하기 싫은 아이들의 예쁜 심성으로 만들어진 단어. 집단에서 깍두기처럼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던 저자는 자신의 능력이 필요로 하는 곳에 자원했고, 그렇게 빈 곳을 채웠다. 그러한 시간들이 채워져 깍두기의 노고를 인정받아 학교라는 집단의 교장이 되기까지를 보면 쉽지만은 않았겠지만 그렇다고 깍두기의 능력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다. 어디서나 기존에 형성된 집단과 새로 진입하는 구성원에는 장벽이 있고 이슈가 있겠다. 그럼에도 열심히 맞춰가려한 깍두기와 무조건적인 홀대가 없었기에 가능했음을 느낀다. 생각해보면 이러한 존재마저도 김치의 한 종류인 깍두기로 명명된걸 보니 피식 웃음이 나기도 한다. 그노무 김치가 참....
그리고 나는 이 단어만 보면 언니가 떠오른다. 저자는 잉여들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부제로 적어두었지만 나에게 그 단어는 챙기고픈 여린 마음이 겹쳐진다. 4살 터울 자매로 한창 무리지어 놀기 좋아하는 아이가 4살 어린 유치원도 안 다니는 동생을 데리고 다니기엔 쉽지 않았을 터. 그럼에도 몰래 도망가서 놀거나 혼자 내버려두지 않고 항상 깍두기를 옆구리에 끼고다녔을 국민학생(언니가 학교를 다닌 시절은 국민학교였다)을 눈앞에 그려보면 장하고 기특하다. 이러한 마음이 자란 어른들이 있었기에 저자도 타국에서 학교 교장까지 할 수 있었던게 아닌가 짐작해본다.
제목처럼 '사물에 대해 쓰려 했지만'..... 결국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와 감상이었고, 그러한 삶 속에서 꼭 언급하고픈 '사람'사는 이야기였다. 다문화 청소년과 탈북 이주민, 결혼 이주 여성을 돕는 활동가이자 연구자이며 남편의 투병생활을 돕고, 아이들을 양육하며 지역 아이들의 선생의 몫까지 하며 다양한 경험과 사건들에 마주한 찰나들을 보여주었다. '사물에 대해 쓰려 힜지만'그 사물로 인해 기억나는 저자의 과거 이야기. 사전적 정의와는 다르게 해석되는 저자만의 또 다른 의미들을 보면서 시대가 반영된 새로운 의미를 알게되고, 내가 귀히 여기지 않았던 점들에서도 시선을 맞추는 저자의 눈길에 배울점이 그득해 보였다. 각자의 삶을 살면서도 또 한 켠으로는 연대하며 의지하고 으쌰으쌰 하는 기운을 북돋워 줄 수 있는 존재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내일의 나에겐 어떤 사물과 단어들이 잘 살고, 잘 늙어 갈 수 있도록 지지해줄지를 생각해보면 이 세상엔 버릴게 없고, 외면할 것도 없다고 단언하고 싶어진다.
📖 미디어창비를 통해 도서만을 제공받고 기록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