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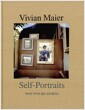
-
비비안 마이어 : 셀프 포트레이트 ㅣ 비비안 마이어 시리즈
비비안 마이어 사진, 존 말루프 외 글, 박여진 옮김 / 윌북 / 2015년 8월
평점 :

품절

천재의 자화상, 원조셀피, 셀프 포토레이트라는
제목이나 광고의 문구들에서 알수 있다시피 이책은 비비안 마이어의 셀프 포토레이트 즉 요즘말로 셀카 혹은 셀피를 모아 묶어낸 책이다. 사진생활을
해온 기간동안(아주 어렸던 10대 이전을 제외한 생의 거의 전기간이라 해도 무방하다) 15만장 이상의 사진을 찍어온 그녀가 꾸준히 찍은 피사체가
있다면 그건 바로 그녀 자신이었다. 자기자신의 사진을 찍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녀는 젊어서 혹은 막 사진을 배우기시작한 무렵 사진을 찍는
몇몇 이들과 교류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식 사진작가로서 활동하지 않고 보모로 평생을 살아가며 그저 묵묵히 사진을 찍어왔다. 누구에게
보여주기는 커녕 인화하지도 않은 필름이 창고 5개를 가득 채웠다고 하니 그녀 특유의 고집과 방식을 짐작할만하다. 그녀는 새로운 집에 취직할때마다
필름이 가득찬 짐가방을 잔뜩 가져오곤 했다는데 생각보다 많은 짐에 고용주가 그녀에게 물으면 이 안에 자신의 인생이 담겨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녀에게 사진은 자신의 삶이자 인생이었으며 사진을 찍는 행위는 창조적 예술행위보다는 자신의 시각을 고스란히 담을 수 있는 실존적 일상행위에
가까웠을지도 모른다. 그런 그녀가 스스로의 모습을 사진에 담는다. 자신이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을 담고자 한 것이었을까? 개인적으로 추측하기에는
단지 그것뿐만은 아니었을 것 같다.
.



그녀의 셀피가 꾸준히 지속된만큼 연령에 따른 그녀의 모습을
남기는 역할도 했겠지만 그녀의 사진을 봤다면 그 사진안에 그녀의 온전한 모습 즉, 전신이나 얼굴의 눈코입이 전부 고스란히 담긴사진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걸 눈치챌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사람이나 거리의 풍경을 포착해내는 것을 좋아했고, 자신의 모습 또한 그 순간에 자연스레 녹아
들게끔하거나 자신이 우연히 발견한 독특한 프레임안에 자신의 일부를 넣어 사진을 찍은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몇몇 사진은 자기자신을 찍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장면이나 인물을 찍었는데 마치 덤마냥 우연히 유리에 비치거나 그림자가 찍힌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다른 사진집을 읽고난 후 느낀 부분이기도 한데 그녀는
그녀 스스로를 인물사진의 훌륭한 피사체로 생각하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그녀의 인물사진이 생동감넘치는 이유는 그녀가 카메라를 들이밀었을 때 예쁘게
웃거나 인상을 찌푸리거나 혹은 사진을 찍는지도 모르고 방심한 얼굴을 보여주는 대상의 반응과 즉석적인, 순간적으로 보여주는 그 신선함에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녀 자신은 타인이 보여주는 그런 반응을 보일 턱이 없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지도 않았다. 그녀는 사진안에서 예쁜척을 하거나
표정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카메라로 얼굴의 절반 이상을 가린다거나 그림자만을 찍기도하고 오히려 심각하거나 뚱한 어쩌면 무관심한척 별 표정없이
정면을 응시하며 찍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책에서 그녀가 웃는 사진은 단 2장 뿐이다. 하지만 이것마저 카메라를 향해 웃어보인다기보다는 찍을
당시에 기분이 좋았거나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해 자연스레 지어진 웃음으로 보인다.
커다란 키와 커다란 눈동자, 마르지도 뚱뚱하지도
않은 건강한 체격. 개인적으론 젊었을 때의 그녀는 상당히 예쁜 얼굴이라고 생각한다. 한가지만 고집하는 성격을 반영하듯 다부지게 다문 입술과 다소
뻣뻣한 몸은 사진을 찍을 때만 빠르고 유연하게 움직이지 않았을까. 하지만 자신의 외양이 어쨋든간에 그녀에게 자기자신은 인물사진의 주역이 아니라
자신의 사진활동에서 자주 시야에 걸리는 단순한 피사체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다. 의도적이건 아니건 카메라의 시야에 자신이
걸린다면 그건 곧 그녀의 시선에도 자신이 걸렸다는 이야기니 본인은 별 상관이 없었을지도 모른다.(셀프포토레이트와 기타 사진들을 의도적으로
구분해서 찍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온통 추측뿐인 이야기로 서평이 가득찼지만 그런 그녀와 그녀의 사진이기에 더욱 흥미롭고 마음이 간다.


개인적으로 그녀의 그림자가 찍힌 사진들이 좋다. 눈코입은 없어도 꼿꼿하게 선 자세나 카메라를 들고있어 꺾여있는 팔꿈치, 가끔은
챙이 둥그런 모자를 쓰고 우뚝 서있는 그림자마저 사진찍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적으로 서있지만 그림자 안에 마치 표정이 있는
것처럼 몰입해 있다는게 느껴진다. 그리고 이 밑에 첨부한 이 사진도 나는 참 좋다. 옮기고 있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찍은 이
사진에서 그녀는 웃고있다. 이 트럭안에 거울이 한 가득 있었는지 사진안에 찍힌 것이 전부였는지는 알수 없지만 남자가 거울을 번쩍 든 그 찰나에
자신을 온전히, 그것도 정확히 중앙에 맞추어 담아낸 것이 뿌듯하다는 듯이- 재미있다는 듯이 웃는 얼굴이 장난꾸러기 같다. 1955년이면 그녀의
나이 29일 때다. 마이어만의 고유의 스타일이 자리잡은 20대 중후반의 사진은 그녀의 젊은 시절 모습만큼
반짝인다.

이전에 읽은 책과 겹치는 사진이 있었지만 셀프 포토레이트만을
모아 사진과 동시에 그녀 자체에도 더 관심과 집중을 쏟아붓게 만드는 책이었다. 초반엔 그저 약간의 독특함에 끌리다가 후반엔 머리를 자르면서,
아이들을 돌보면서(그녀의 평생직업은 보모였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길에, 티비를 보다말고 자신이 걸리는 프라임을 찾아내 셔터를 누르고 마는
그녀가 보여 혀를 내둘렀다. 일상에서도 진정으로 사진찍는 것을 놓지 못하는 일종의 집착과 그에 따른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던 그녀라는 것을
느낄수 있어서 웃음이 났다.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만두지 못하는 것처럼 언제어디서든 카메라를 들고다니며 원하는 순간순간을 담은 그녀의
사진에 대한 순수한 애정이 느껴진다.
올해 그녀에 이야기로 만든 영화가 개봉되었었고, 그녀의 사진
전시회가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참고 : 성곡미술관-비비안마이어x게리위노그랜드전) 관련 사진집이 계속해서 출간될 것 같다. 그녀에 대한 내
관심도 지속증가될 예정이므로 그녀와 그녀의 사진을 알리려는 이런 노력들이 참 반갑다. 생전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렸던 그녀의 본명,
비비안 마이어. 어쩌면 그녀는 스스로 그렇게 불리길 원하지 않았는지 몰라도 우리는 이제 그 이름을 잊지 못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