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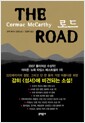
-
로드
코맥 매카시 지음, 정영목 옮김 / 문학동네 / 2008년 6월
평점 :



필사를 하고 싶어 졌다.
한 줄고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무딘 눈으로 좇다가 거슬한 손가락으로 스르륵 훑기엔 내 기억이 너무 짧다. 마음가는대로 꼭꼭 배기게 눌러쓰고 힘가는 대로 흘려버리듯 흘려쓰다보면 다시 한 번 아니 오래오래 끌고 갈수 있을까. 남자와 아들의 생존 보급품이 들어있는 식료품 카트처럼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도둑 맞아도 다시 그러모아 바퀴를 굴려야 하는 것처럼 내 안에도 이렇게 지구가 재로 변해 내 숨통을 콜록거리는 기침으로 막아 폐를 망쳐버려도 기억해야 하는 낙인처럼.
한 방울까지 탈탈 털어 짜낸 기름의 무게를 손 대중으로 가늠하듯 잿빛 어둠에 섞일 희미한 빛의 무게를 잰다. 그것은 늘 정해져 있는 절망과 결핍을 향해 가기위해 희망을 태워 무게없이 흩날리는 재로 변할 시간을 재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음을 위해 걷고 또 걷고 무언가 얻기 위해 걷고 또 걷는다.
너무 어둡고 너무 정적이고 너무 잿빛이고 너무 굶주리고 너무 방어적이다. 말라비틀어진 시체가 열기에 녹았다 굳은 아스팔트에 반쯤 파묻혀 있고 나쁜 사람들이 피운 연기에는 자식의 내장을 들어내고 그을려 놓은 광경이 널려 있다. 머릿속에 집어넣은 것들은 영원히 남는다.
암흑같은 고요가 재로 변한 세상을 떠돈다. 그가 기억하는 옛 세상의 추억마저 호수의 표면처럼 잔잔하다. 따스한 온기도 식구끼리 둘러 앉은 저녁시간의 아스라한 불빛속에 어수선함도 달그락거리는 소리도 없이 그저 호수를 떠가는 친근함뿐이다. 그래서 잿빛 침묵속에서 호수의 고요를 떠올렸던 것일까.
코카콜라를 마실 수 있는 행운을 만났을 때 왜 그 톡쏘는 탄산의 칼칼함에 눈물이 나는지. 이미 말라비틀어진 행운의 여신 주머니에 그 만큼이라도 어딘가.
남자가 말했다. 저 아이가 신의 말씀이 아니라면 신은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는 거야. P9
남자는 플라스틱 뚜껑을 꽉 닫고 걸레로 병을 닦은 다음 손으로 무계를 가늠해보았다. 긴 잿빛의 어스름을, 긴 잿빛의 새벽을 밝힐 작은 헝겊 심지 등에 쓰일 오일이었다. 저한테 이야기를 읽어주실 수 있겠네요. 그죠, 아빠? 소년이 말했다. 그럼, 그럴 수 있지. 남자가 말했다.P12
네가 머릿속에 집어넣은 것들은 거기 영원히 남는다는 걸 잊지 마. 한번 생각해보렴. 남자가 말했다.
어떤 건 잊어멎기 않나요?
그래. 기억하고 싶은 건 잊고 잊어버리고 싶은 건 기억하지.P17
나무 밑동은 뒤에서 흐느적거리며 천천히 따라왔다. 어느덧 저녁이었다. 노걸이가 천천히 주기적으로 비틀리고 끌리는 소리뿐이었다. 호수는 캄캄한 유리였다. 호숫가를 따라 늘어선 집들의 창문에 불이 밝혖ㅆ다. 어딘가에서 들리는 라디오 소리 둘 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유년의 어느 완벽한 날이었다. 그 뒤에 올 날들의 본이 될 그런 날.P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