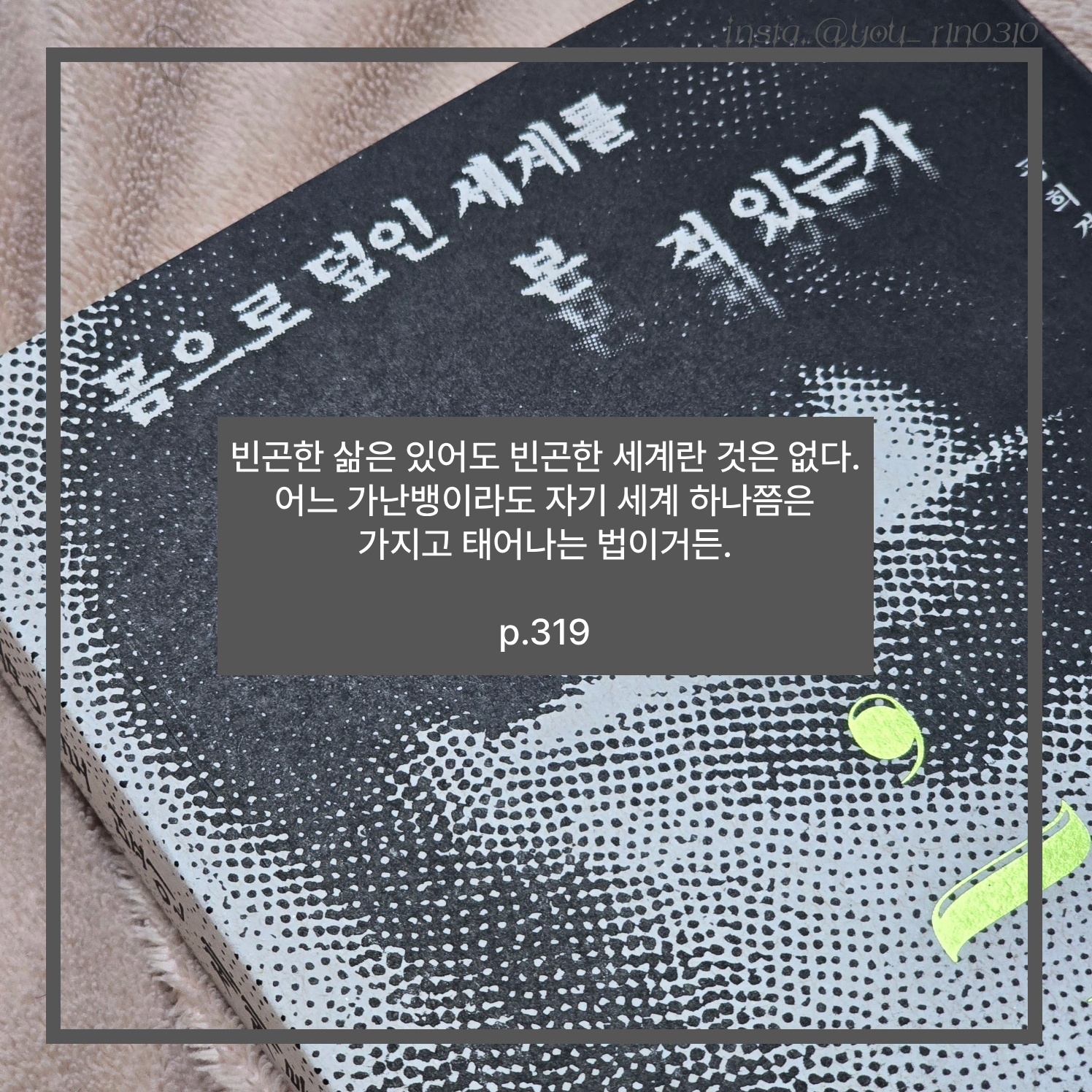
#도서제공
p.299 우리는 때로 지켜야 할 것이 많아 살아남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잊어버리고 마는데, 결국 그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길을 가고 마니…….
이 거대한 서사의 첫 페이지에서는 그 어떤 특별한 인간도 아닌 상어 바나가 등장한다. 500살이 거의 다 된 바나는 기묘하게 달라진 지구의 자기장을 느낀다. 곧이어 사람을 증발시키는 비가 내리고, 인간은 그 비를 ‘움’이라고 부르게 된다.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흥미로운 아포칼립스 SF처럼 시작된 소설은 챕터를 구르고 구르며 점점 방대해져서, 정신을 차려 보면 상어 바나에게서 출발한 독자는 어느새 신인류 루시의 이야기에까지 다다른다. 이야기의 배경은 더 먼 미래가 되었는데도 루시와 사가르가 다른 계층으로 나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몇백 년간 피로 성장해 온 인권이란 얼마나 부질없는지, 하고 조금 허탈해지기도 한다.
짧고 간결한 문장에 더 익숙한 독자들에게는 문체가 조금 낯설지도 모르지만, 『몸으로 덮인 세계를 본 적 있는가』에는 어딘가 사람을 빨아들이는 매력이 있다. 길게 늘어진 문장들은 조금은 고전적인 뉘앙스를 풍긴다. 조금 가깝게 보자면 『드래곤 라자』가 유행하던 시절의 문장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더 멀리 거슬러가면 단어 수로 원고료가 책정되던 시대의 만연체가 주는 고유한 느낌을 갖기도 한다. 그런데도 신기할 정도로 세련되었다. 숏폼처럼 치고 빠지는 단편들에 지친 독자들에게는 단비 같은(이 소설의 서평에서 비 같다는 표현을 사용해도 되는 것일까?) 존재가 되어주리라는 확신이 든다. 『몸으로 덮인 세계를 본 적 있는가』의 거대한 세계관은 독자 앞에 뚝 떨어져 전시되지 않는다. 대신 쉼없이 독자를 그 세계 속으로 빨아들인다.
p.214 서서히 번지는 소녀의 핏자국처럼 젖어드는 눈송이처럼 점점 불어나는 눈발처럼 시린 기억이 하나둘 쌓여갔다. 시린 기억들로 가슴이 아팠다. 그저 예쁨받는 게 세상 가장 큰 기쁨이었던 나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눈을 갖게 되었다.
계층, 부, 신과 재난, 절망과 사랑…… 독자는 글 안에 떨어뜨려 놓고서 글 바깥에서 인간을 관망하는 작가의 필력이 대단하다. 『몸으로 덮인 세계를 본 적 있는가』는 미래의 이야기인 동시에 현재의 이야기인 글이다. 재난은 멀리 있지 않다. 차별도 계층도 착취도 모두 멀리 있지 않다. 우리는 고랑지의 죽음이 단지 픽션일 뿐 현실에는 정말로 없다고 확언할 수 있는가? 고랑지가 버스를 타지 못하는 사건은 과연 소설 속 가상의 것인가?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라면 이 책은 그쯤에서 덮는 게 좋을 것이다. 그것들을 픽션이고 나와 동떨어진 것으로 치부해서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 수 세기를 가로지르는 인류 단위의 사건들에 정신없이 휩싸이는 동시에 카와 아난의 사랑이 굳건히 남는다. 어떤 재난에서도 사랑은 그렇다.
장면들은 강렬한데 문장들은 시처럼 유려하다. 세대를 건너 마지막 대이동까지 다다른 독자는 숨을 참고 페이지를 넘기게 된다. 생각해보면 ‘비’라는 것은 언제나 신의 영역으로 여겨지지 않았는가. 노아의 방주만을 세상에 남기고 모든 것을 휩쓴 창세기의 대홍수를 포함해 많은 신화에서 홍수가 신의 벌로 등장한다. 비가 멈추지 않거나 강이 범람해 땅 위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죄 없는 새로운 생물들만 살아가게 하는 일종의 종말과 탄생의 순환, 마지막 장은 독자에게 그런 이미지를 남긴다. 300페이지가 넘는 장편인데도 지루하다고 여겨지는 구간이 없었다. 오히려 더 길게, 몇 부로 나뉘어지는 초장편이어도 좋겠다고 생각될 정도였다. 찬바람이 부는 연말, 깊게 몇 번이나 읽기에 손색없는 근사한 SF였다.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서평입니다.
#몸으로덮인세계를본적있는가 #몸덮세 #공희경 #허블 #공삼_북리뷰 #서평 #서평단 #SF #SF소설 #책 #책추천 #책리뷰 #책스타 #책스타그램 #북스타 #북스타그램 #소설 #소설추천 #한국과학문학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