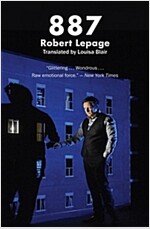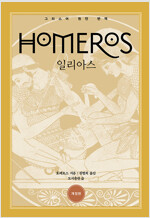우선 2019년 한국에서 로베르 르파주(Robert Lepage)가 연출하고 출연한 연극 <887>을 직접 관람할 수 있었다는 점을 크나큰 행운으로 여기고 싶다. 원래 희곡을 먼저 읽고 해당 연극을 관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여기지만 (연극은 무대 위에서 관객과 함께 동시적으로, 일회적으로 벌어지는 일인데, 이 행위의 참여주체인 관객이 무대 위에 서기 위해 연출가나 배우들이 수백 번도 더 읽었을 해당 희곡을 읽지 않고 관람한다는 것은 연극을 이해하길 포기하는 일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로베르 르파주라는 연출가 겸 배우에 대한 과문함보다 호기심이 더 앞섰기에 예정에 없이 공연을 관람했다. 연극을 본 결과, 2019년 한해를 넘어 평생 기억에 남을만한 연극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 연극은 기억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연출가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연극은 시간과 기억의 예술이므로, 이 연극은 연출가 자신의 기억을 소재로 삼아 연극 속에서 기억의 문제를 성찰하는 메타 연극이라고 볼 수 있다. 연출가는 시를 암송하는 행사를 위해 어느 시를 외우는 데 겪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제목이 가리키는 주소지에 있던 어릴 적 자신이 살던 퀘벡(Quebec City)의 아파트를 기억술에서 사용하는 '기억의 궁전'으로 삼는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있는 어릴 적 가족과 집을 둘러싼 개인적인 기억을 통해 기억의 문제에 접근해나간다. 이를 바탕으로 당대 퀘벡과 캐나다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을 떠올리며, 그 기억 속에 잠재해 있던 언어적, 문화적, 계급적 갈등 양상 역시 풀어낸다. 배우는 기억술, 기억과 예술, 기억과 매체, 개인적 기억과 집단기억, 역사적 기억 간의 관계, 기억들 간의 투쟁, 기억과 망각 등 기억과 관련된 온갖 문제들을 무대 위로 소환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 연극이라는 예술이 얼마나 탁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기억의 이면에 놓인 망각은 등장인물이자 연출가 겸 배우의 할머니가 겪었던 치매가 암시하듯이, 일차적으로 신체적 노화와 질병과 관련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오늘날 인간에게 신체의 연장체가 돼 버린 전자기기에게 기억하는 능력 혹은 기억할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 상황과도 맞닿으며, 나아가 기억의 예술인 연극이 오늘날 처한 위기와도 연관된다. 고대 시인 호메로스가 무사 여신에게 의탁하여 서사시를 읊었다는 것이 신화가 돼 버린 오늘날의 이런 상황에서 시를 암송한다는 것, 더 나아가 무대 위에서 기억을 바탕으로 일회적인 공연을 한다는 것은 이제 고리타분하고 시대착오적인 일이 돼버린 걸까? 온갖 멀티미디어 장비를 동원한 이 마술 같은 연극에서 르파주가 전달하고자 하는 대체 불가능한 본질적인 연극적 경험은 그런 위기상황을 연극이 극복해나갈 수 있는 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주인공이 마지막에 이르러 예정된 '시의 밤' 행사에서 열변을 토하는 연설자처럼 거침없이 쏟아내는 미셸 라롱드(Michèle Lalonde)의 <Speak White>라는 시는 (아래의 영상에서 시인 자신이 낭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흑인 노예에게 영어로 '백인처럼 말하라'는 인종차별을 배경으로 한 원래의 말뜻을 되살려, 프랑스어가 아닌 '영어로 말하라'는 당대 퀘벡 사회의 억압적 분위기를 고발하면서 동시에 영국계 지배계급에 맞서는 날카로운 문화적, 계급적 저항시이기도 하다. 이 시가 가진 이러한 역사적 맥락 역시 기억을 통해 행사장이자 무대 위로 그대로 이어져 시와 예술이 장식품으로 전락해버린 '시의 밤' 행사장과 그곳을 채우고 있는 가식적인 유명인사들 앞에서 과연 주인공 자신이 이 시를 읊고, 과연 그들이 이 시를 들을 자격이 있는지 되물으면서 예술이 가진 계급적 차별성을 폭로하는 동시에, 기억의 힘에 의존하는 시와 연극이 어떻게 합일하여 두 예술을 가능하게 하는 그 힘을 관객들이 무대를 통해 생생히 경험하도록 하는지 보여줌으로써 이 연극을 끝맺는다. 이 연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무한히 재생, 반복 가능한 영화가 보여줄 수 없는 연극의 일회적 경험이 가진 힘과, 그 힘의 원천인 인간의 기억, 그것을 경험하면서 관객이 받는 고유한 감동은 대체 불가능한 것이다.
"Hello Fred, it's Robert here. I know there's not enough space on your answering machine to leave a long message, but still, it's probably quite a bit more time than you spent summing up my entire career. So let me ask you this: Does thirty-five years in the theatre mean nothing at all? If something has never been electronically or digitally recorded, does that mean it never existed? If so, then the fundamental philosophical question is this: If a tree falls in the forest, and no one is there to record it on their goddamn iPhone, does it make a sound? Am I to understand that a five-minute cameo on a Radio-Canada comedy show is worth more than thirty-five years in the theatre business? Or was that the only clip you had in your archives?" (Lepage, Robert, 887: A Play, trans. Louisa Blair, Pref. Denys Arcand, Toronto: Arachnide, 2019, p.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