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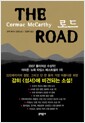
-
로드
코맥 매카시 지음, 정영목 옮김 / 문학동네 / 2008년 6월
평점 :



길.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고, 더군다나 목적지마저 알 수 없는 그런 길.
초기에는 실에 수의 같은 옷을 걸친 난민들이 우글거렸다. 몰락한 비행사처럼 마스크와 고글을 쓰고 넝마를 걸친 채 도로 가에 앉아 있었다. 밀고 가는 손수레에는 잡동사니가 잔뜩 쌓여 있었다. 뒤에도 수레나 카트를 끌고 있었다. 두개골 속의 눈은 반짝거렸다. 열(熱)의 나라에 이주한 사람들처럼 비틀거리며 인도를 걷는 신념 없는 껍데기 같은 사람들. 마침내 만물의 덧없음이 드러났다. 오래되고 곤혹스러운 쟁점들이 무와 밤으로 해소되었다. 어떤 사물의 마지막 예(例)가 사라지면 그와 더불어 그 범주도 사라진다. 불을 끄고 사라져버린다. 당신 주위를 돌아보라. '늘'이라는 것은 긴 시간이다. 하지만 소년은 남자가 아는 것을 알았다. '늘'이라는 것은 결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극한의 상황에서는 인간이 인간이 되지 못하고 시간마저 시간이 되지 못한다.
그 와중에도 그 무엇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숙명인걸까.
다른 좋은 사람들도 있다 그랬죠. 아빠가 그랬어요.
그래.
그런데 어디 있는 거예요?
숨어 있지.
뭘 피해서 숨어 있는 거예요?
서로를 피해서.
많은가요?
모르지.
하지만 있기는 있죠.
있기는 있지.
정말이에요?
그래. 정말이야.
하지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나는 사실이라고 생각해.
알았어요.
내 말을 안 믿는구나.
믿어요.
그럼 됐다.
언제나 믿어요.
안 그런 것 같은데.
믿어요. 믿어야 해요.
그래. 극한이 아닌다한들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나는 무엇을 믿는가. 당신은 무엇을 믿는가.
존재하기 위해 믿는 것인가, 믿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젠 존재 자체가 버거운가?
지금까지 해본 가장 용감한 일이 뭐예요?
남자는 피가 섞인 가래를 길에 뱉어냈다. 오늘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난 거.
정말요?
아니. 귀담아 듣지 마라. 자, 가자.
매카시는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에 대해서 단 한 마디도 쓰지 않는다.
너무도 건조하게 서술을 해버려서, 그의 자세한 묘사와 설명이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을 정도다.
비가 방수포를 후두둑 때리는 순간에도, 내 머릿속엔 사막이 그려지고 있었다.
숨을 내쉴 때 습기라고는 하나 느낄 수 없는, 그런 건조함. 허공에서 손을 모아쥐면 무엇인가 바스라질 것만 같은 건조함.
그렇다고 찌는 듯한 열기가 느껴지는 것도 아니다. 다만 암흑만이 '보일' 뿐.
글을 나누지도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통짜로 가버리기 때문에, 읽는 것이 엄청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다.
게다가 쉽게 '희망' 따위를 던져주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이 '암흑의 사막'이 그저 암울하게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왜일까. 정말 모를 일이다.
글을 읽는 중간 중간, '소년'에게 짜증이 울컥울컥 났다. 지금 '그따위' 소리를 지껄일 때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나, 그렇다고 이 소년에게 '배가 고프니 갓난아이를 구워먹자'는 말을 기대하는 것은 또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다음의 한 마디가 기억에 두고두고 남는다.
남자는 소년과 소년의 관심에 관해 생각해보았다. 잠시 후에 남자가 말했다. 네 말이 맞을 것 같다. 아마 죽었을 거야.
그 사람들이 살아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 걸 뺏는 게 되잖아요.
정말 간만에 읽었던 소설. 마지막으로 소설을 읽었던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날만큼 오랜만이었다.
그런데 오랜만에 읽는 소설치고 너무 힘겨운 소설을 고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