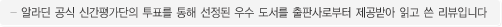[그 남자의 웨딩드레스]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그 남자의 웨딩드레스]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웨딩드레스
피에르 르메트르 지음, 임호경 옮김 / 다산책방 / 2012년 7월
평점 :

품절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화자의 기억이 불분명 하다는 설정이 있고, 그 이야기가 사람이 여럿 죽어나가는 장르물로 분류된다면, 일단 화자를 범인으로 의심해 봐야 한다. 이건 일종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추리-미스터리 소설 범인잡기 팁인데, 이런 중심인물의 불분명한 기억이 아주 그럴듯하게 서술트릭의 근거(혹은 변명)나 반전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나는 일련의 끔찍한 사건 한가운데에 놓이게 되는 불행을 몰고 다니는 여자 소피를 유력한 범인으로 생각했었다. 아니, 이미 단정하고 있었다고 해야 되겠다. 이유가 어쨌건 일단은 그녀가 범인이닷!
아닌 게 아니라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과 점점이 이어지는 과거의 기억, 살인이 분명한 사건(내가 범인일리 없지만 상황이 이상하다. 하지만 ‘아! 내가 범인이다!’라는 체념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이 벌어졌는데 ‘도망치자!’라고 생각해 버리는 비범한 판단력 등을 볼 때 나의 추리(라고 쓰고 헛다리라고 읽는다! 라나 뭐라나)는 전혀 무리가 없었다. 하지만 반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더라. 소피의 시점에서 진행되는 이야기가 끝나고, 프란츠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시작될 때, 나는 새삼 이 작가의 전작을 떠올렸다. <알렉스>의 작가 피에르 르메트르. 단서를 하나 하나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반전을 차곡차곡 쌓아가서 종극에 반전 잔치를 벌이는 이 늙은 오빠의 독특한 스타일이 요 책 <그 남자의 웨딩드레스>에서도 잘 드러나 있더라.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다. 소피라는 여자가 있다. 이 여자 참 미스터리한 구석이 있다. 구린 구석이 있다고 해야 정확할까? 지금은 보모 일을 하고 있다. 돌보는 아이와도 아이의 부모와도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이 여자, 뭔가 불안정 하다. 그녀의 기억은 구멍이 송송난 스펀지 같다. 이따금 잘생기고 다정한 남편과의 행복했던 과거가 조각조각 떠오르지만 행복했던 기억마저 온전치 못하다. 정신병을 앓고 있는 그녀는 종종 몽롱하고 희뿌예지는 의식 속을 헤맨다. 그녀 스스로도 자신을 잘 알 수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랄까. 어느 날은 깨어나 보니 돌보는 아이 레오가 움직이질 않는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도무지 알 수 없지만 자신의 운동화 끈에 졸려 웅크린 체 굳어버린 아이를 내버려 두고 그녀는 달아나 버린다.
아이를 죽인 건 누구일까? 설마 소피 자신일까? 몽롱해진 의식 속에 터무니없는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만 것일까? 그녀는 기억이 없다.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뻗뻗하게 굳어버린 레오를 발견한 그날과 같은 일이 또다시 소피 앞에 반복되고 만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를 쫓아 살인사건이 연거푸 벌어지고 1급 수배범이 된 그녀는 신분을 세탁하고 새로운 삶을 위해 결혼을 결심한다. 평범하지만 건실해 보이는 남자와 함께. 소피가 결혼을 결심하는 이야기 뒤로 이어지는 프란츠의 일기에는 소피의 이야기를 한꺼번에 뒤엎는 뜻밖의 전말이 드러난다. 프란츠의 일기로 비로소 소피의 기억에 대한 공백이 메워지게 되지만 새로운 의문이 생긴다. 소피를 왜? 프란츠는 왜 그런 일을 벌인 걸까?
소피의 혼란스럽고 미스터리하고 무섭기까지 한 생활과 치밀하고 소름 돋는 프란츠의 일기는 ‘결혼’과 ‘청혼’이라는 단어로 마무리되고, 프란츠와 소피 그리고 소피와 프란츠 두 사람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소피 - 프란츠 - 프란츠와 소피 - 소피와 프란츠’라는 소제목에 맞게 그녀와 그의 시점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는 장이 끝날 때마다 반전과 함께 어떤 의문을 남기게 된다. 소피의 불완전한 의식과 살인사건의 진실은 무엇인지 에 대한 의문은 프란츠의 시점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로 해소되고, 프란츠의 행동에 대한 의문이 ‘프란츠와 소피’ 장에서 해소되고, ‘프란츠와 소피’ 장에서 생겨난 의문 X가 ‘소피와 프란츠’ 장에서 해소되며 모든 이야기가 정리되는 구조인데, 장과 장을 넘나드는 사이사이에 이전의 전개를 통째로 뒤흔드는 반전이 장치되어 있다. 덕분에 마치 끊임없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어 370여 페이지의 굵직한 두께임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중간에 눈을 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치밀한 뒤통수는 앞서 소개된 작가의 다른 책 <알렉스>에서도 잘 나타났었더랬다. 달랑 두 작품만 두고 이 작가의 스타일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 하는 것은 이르지만, 달랑 이 두 작품만 두고 작가 피에르 르메트르에 대해 이야기 하자면 참 이야기를 찰지게(다른 표현으로 ‘끈덕지게’) 잘 쓰는 작가! 라는 말만은 할 수 있겠다. 덧붙여 여성 캐릭터가 상당히 당차고 강하다는 점도 이야기 해 볼 수 있으려나. 한편으로는 ‘아무리 소설이라지만, 과연 그렇게 까지 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사건의 개연성이 부족하다거나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음. 파격이었달 까.
불완전한 기억으로 인해 무서운 상황에 빠지는 인물의 이야기를 다룬 추리-스릴러물은 많았다. 하지만 그 설정을 이런 식으로 풀어나간 것은 꽤 신선했다. 나는 덕분에 초장부터 엉뚱한 헛발질만 계속 해댔고 말이다. 읽는 재미는 개인적으로 평하기로는 <알렉스>보다 좋았다. <알렉스> 만큼 매력적인 캐릭터와 문득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문장은 눈에 잘 띄지 않았지만, 피에르 르메트르라는 작가에 대한 신뢰도를 쌓는 데는 엄청난 플러스가 된 작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