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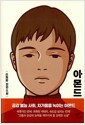
-
아몬드 (양장) - 제10회 창비 청소년문학상 수상작
손원평 지음 / 창비 / 2017년 3월
평점 : 
절판

인상깊은 구절
부모는 자식에게 많은 걸 바란단다. 그러다 안 되면 평범함을 바라지.
그게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말이다, 평범하다는 건 사실 가장 이루기 어려운 가치란다. (pg 90)
5월 한 달, 이직한 보람도 없이 주말이고 평일이고 정신없이 보낸 나에게 간만에 소설 한 권 읽을 여유를 주기로 했다.
배송이 이상하게 늦어져서 토요일에 받았는데 주말에 받은 김에 아이는 유튜브 키즈에게 맡기고 모처럼 책 속에 빠져 들었다.
별 기대없이 그냥 잘 팔린다길래 선택한 책인데 다행히(?) 몰입도가 상당해서 손에서 놓을 수 없이 읽어 나갔다.
작품의 주인공인 윤재는 머릿 속 아몬드만한 사이즈의 편도체에 이상이 있어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다.
좋다, 싫다, 기쁘다, 슬프다 등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사건들이 일어나면 이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만 있다.
어릴 적 윤재의 병을 알게 된 엄마와 외할머니는 필사적으로 아이를 사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다 뜻밖의 사건으로 엄마와 외할머니를 잃은 윤재는 학교에서 '곤이'라는 문제아를 만난다.
어릴 적 부모를 잃어버려 범죄의 길로 접어든 곤이는 자신의 가족이 눈 앞에서 죽어도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윤재를 괴롭히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둘 사이에 일어나는 내면의 변화들이 소설의 주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
사실 줄거리로 정리하면 별 것 없어 보이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작가의 문장력 덕분인지 이상하게(?) 재미가 있다.
260여 페이지 정도로 길이도 길지 않은 덕분에 배송 온 당일에 다 읽은 몇 안되는 책이 되었다.
집사람이 뭔 내용이길래 벌써 다 봤냐고 묻길래 대충 스토리를 전달했더니 '그게 재밌다고?'라는 반응이었다.
나도 스토리를 통해서는 그 이상 설명을 못하겠어서 일단 좋았던 점을 추려보려 한다.
일단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묘사가 생각보다 현실감 있었다.
감정이 없으니 모든 현상을 무미건조한 느낌으로 볼 것 같은데 그 무미건조함 속에 뭔가 울림이 있는 느낌이랄까.
늘 한 가지 정답을 제시하던 엄마의 가르침에는 좀 위배됐지만 나는 그런 결말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마치 이 세상에 정해진 답은 없다고 말해 주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남들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한다고 해서 꼭 정해진 대응을 할 필요도 없는 게 아닐까.
모두 다르니까.
나같이 '정상에서 벗어난 반응'도 누군가에겐 정답에 속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pg 74-75)
등장인물이 많지는 않은데 각기 명확한 특징들이 있어서 좋았다.
불운하게 태어났지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았던 윤재와 유복하게 태어났지만 나쁜 사람들 손에서 자라난 곤이의 차이도
극명하게 볼 수 있다.
엄마는 절대로 내 손을 놓지 않았다. -중략-
우린 가족이니까 손을 잡고 걸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반대쪽 손은 할멈에게 쥐여 있었다. 나는 누구에게서도 버려진 적이 없다.
내 머리는 형편없었지만 내 영혼마저 타락하지 않은 건 양쪽에서 맞잡은 두 손의 온기 덕이었다. (pg 171-172)
작가의 말을 보면, 작가가 '내 자식이 이래도 나는 자식을 사랑할 수 있을까' 싶은 캐릭터로 윤재와 곤이를 만들어냈다고 한다.
결국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었다고 생각된다.
이 책이 '영어덜트'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있고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지만,
상기의 이유 때문에 어린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도 한번쯤 읽어봄직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제를 조금 더 확대해보자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는지도 사람의 성장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한 번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낙인이 찍히고 나면 그 낙인을 벗어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느끼게 된다.
인터넷을 보면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 같지만,
진짜 그렇다면 교육도, 종교도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어차피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소설일 뿐이지만 이 책에는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더 좋았는지도 모르겠다.
내용 상 감상에 담지 못했지만 가슴에 남았던 구절들을 옮겨둔다.
할멈의 표현대로라면, 책방은 수천수만 명의 작가가 산 사람, 죽은 사람 구분 없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인구 밀도 높은 곳이다.
그러나 책들은 조용하다.
펼치기 전까진 죽어 있다가 펼치는 순간부터 이야기를 쏟아 낸다.
조곤조곤, 딱 내가 원하는 만큼만. (pg 132)
멀면 먼 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외면하고, 가까우면 가까운 대로 공포와 두려움이 너무 크다며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껴도 행동하지 않았고 공감한다면서 쉽게 잊었다. 내가 이해하는 한, 그건 진짜가 아니었다.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았다. (pg 245)
여담이지만 읽으면서 영상물로 제작되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작가가 영화화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한다.
청소년들이 책 읽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모양이다.
아무래도 영상물로 보면 상상의 여지가 사라지는 것 같긴 할테니 내심 이해가 간다.
당장 수중에 들어올 돈 보다 그런 가치를 소중히 하는 작가라고 하니 뭔가 더 마음에 드는 기분이다.
작가의 다음 작품이 기다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