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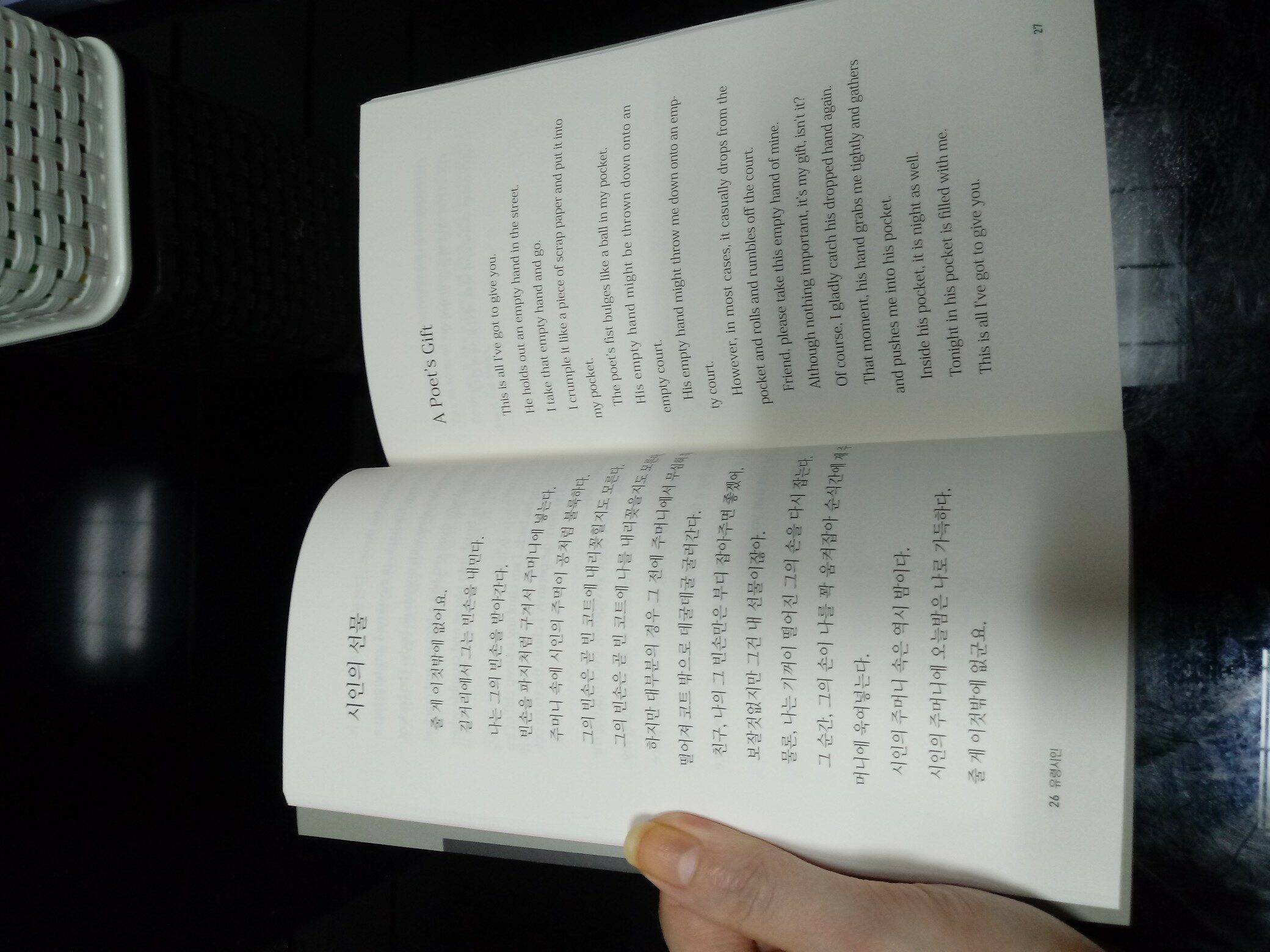
후자는 몰라도 전자는 coat로 이해했는데, 왜 둘다 court를 썼을까. 함축적인 내용보다는 줄글이 많은데도 영어로 옮겨놓으니 뉘앙스도 많이 달라진다. 다른 단어를 쓰는게 더 비슷한 느낌이지 않았을까, 아쉬운 부분도 생긴다.
이 책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이거다.
"지붕 위에 일년 내내 걸터앉아있던 장미도
땅으로 첨벙 뛰어내린다"
유령시인이라 그런지, 거꾸로 된 장면들이 있다. 세계관이 독특해서 곱씹어 읽어야한다. 산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인식하지 못하듯,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한다. 각자의 풍경이 펼쳐져있는 공간이 겹쳐있다. 하지만 이 '유령시인'은 다른 존재와 끊임없이 만나고 싶어하는 것 같다. 허공에 돌을 던져 세계를 깨뜨리려고 한다. 또, 투명한 창문 사이를 통과하고 창문 너머 누군가를 잡는데, 창문이 열린다. 열린 창문으로 손을 뺄 수가 없다.
작가는 배를 타고 먼바다로 나가려고 하는데, 어렀을 때의 꿈 때문이다. 중년남성이 꿈에 찾아와 꼬마작가를 들여다본다. 건드리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 뱃사람이 아빠인줄 알았다가, 할아버지인줄 알았다가, 결국 그가 죽는 꿈에서 펑펑 운 시인은 그가 자기 자신이었음을 알게 된다. 다른 '나'라는 존재가 있을까? 몇십년 뒤의 내가 어린 나를 만나는 게 가능할까? 상갓집을 다녀온 그에게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걸 보면 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나라는 존재에 대해, 나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된다. 나를 이분화하기가 어렵다.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대중에 의해 만들어진 나도 나일까. 내 속성 중에서 한두개를 빼더라도 나로 남을 수 있을까. 계속해서 생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