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결정에 2억 5천만년 이상 갇혀져있던
포자를
간단해보이는 영양액으로 다시 살린 연구도
놀라웠지만
고열,
가뭄,
상상도 못할
충격,
영양
결핍,
우주 방사선
심지어 항생제에도 살아남는 그 저항력은
어디에서 왔으며
그 생명의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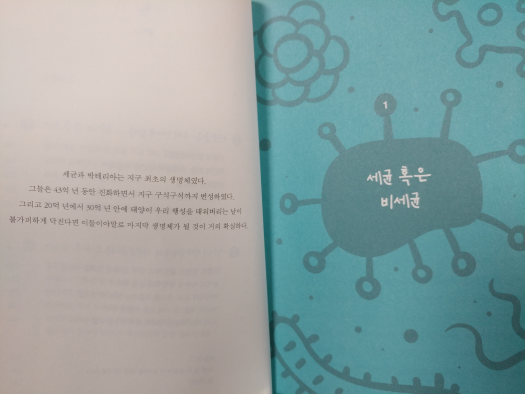
일상적인
먹을거리,
각종
화학물질
그리고
많은 식물들의 성장과 수정은 물론 하수의
오염물질 제거 기능까지
현재
우리 주변에 미생물이 관여하지 않는 활동을 찾기란 불가능하다.
심지어
300~600g이라는
적지 않은 양의 미생물이 성인의
몸 속에도 들어있다.
미생물의
쿼럼센싱과 분자생물학에서 말하는 변형은 사실 반대작용이지만
그것이
의도하는 목적과 결과는 동일했다.
즉,
어떤
작용이든 미생물의 유전물질은 더 풍부해지고,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 것이다.
우리
생활 구석구석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기까지는
단세포
생물의 작용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든 이런 과정이 기반되어 있었다니
책을
읽을수록 미생물의 세계가 점점 더 흥미로워졌다.
미생물에
대해 내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사실 면역체계와
관련된 부분이었다.
몇
년 전 A형간염에
걸려 혼수상태로 며칠 있다가 죽을 고비까지 넘겼던 나로서는
내
나이 또래 90%가
갖고 있다는 항체가 없었다는 사실이 매우 충격적이었다.
아직까지도
알 수 없는 발병원인에 대해
나는
아직까지 여기에도 소개된 스트라찬의 주장이 설득력있다고 생각해왔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 요한 드 용스테 연구에 기반을 둔,
‘거대한
멸균 지역’의
영향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사실
살모넬라,
노로바이러스,
포도상구균,
소양충,
네글레리아
파울러리같은 편모충 등
보기좋은
상태나 결과와는 거리가 먼 세균들이 더 잘 알려진 탓에
세균이라고
하면 유해하고 위험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세균은 연구소,
샬레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청결을
중요시하는 부엌,
잘
가꾼 화단,
심지어는
힐링을 위해 떠난 여행지에도 있으며
수술집도의의
안경,
성수,
세탁기,
의류,
반려동물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있었다.
우리가
위생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쓰는 제품들이 오히려 면역체계에 위협이 되고
극한의
기후변화,
환경조건이
매일 일어나는 곳이 우리의 집안이고
매일
사용하는 수세미가 세균들에게는 이상적인 공간이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가
늘 세균과 공생하면서도
피해는
받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계기도 되었고,
미생물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어야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음을
쉽게,
위트있게
알려주어 읽는 내내 흥미로웠다.
질병이
악취를 통해 발생한다고 믿었던 시대를 지나
안톤
판 레이우엔훅의 현미경 덕분에 이 작은 존재가 알려진 이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앞으로
인체미생물연구,
범죄학,
무중력상태에서의
박테리아 대사 등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더욱 활발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그
결과가 나올 때마다 이 책에서 읽은 내용들이 생각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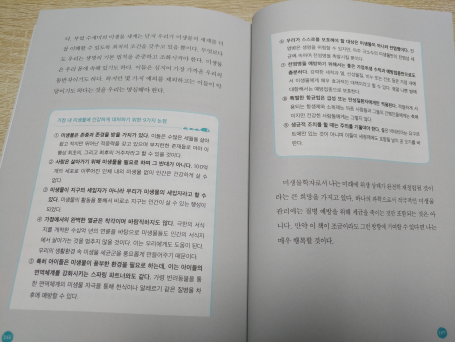
‘우리는
집에 있는 미생물을 침입자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똑바로 보자면
그들이
우리와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과 같이 사는 것이다‘(p.19)
라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우리가
늘 생활하는 공간 그 어느 곳도 미생물과 분리되어서는 생각할 수 없으니
있을
수 있는 위협에 화학적 항생제를 이용하기보다
저항력을
키울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노력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세균은
우리와 함께 사는 룸메이트는 맞지만
그
두 얼굴 중 어느 얼굴을 더 많이 볼 수 있는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책
제목만 보고 매우 과학적이고 이론적이기만 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했지만
각종
균의 사진이 없는 것이 다소 아쉽긴 했어도
불완전한
상식에서 벗어나 그들과 공생하는 유용한 팁을 많이 얻을 수 있어
나같은
과.알.못도
재미있게 읽었고
이런
류의 무겁지않은 과학도서가 많이 출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