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루브르와 오르세의 명화 산책
김영숙 지음 / 마로니에북스 / 2007년 7월
평점 :

구판절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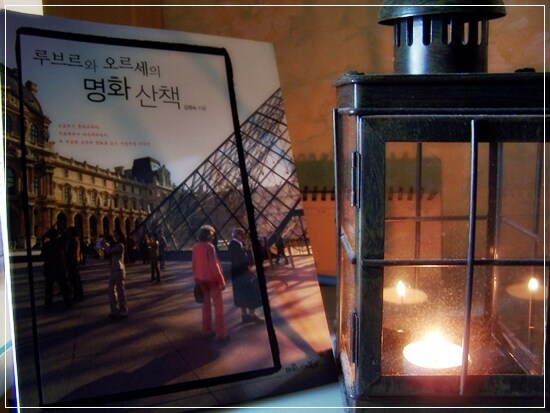
「고즈넉한 분위기가 흐르는 미술관, 한 아리따운 여성이 미술작품을 보며 감상에 빠져있다. 그녀의 곁으로 다가간 한 젊은 남성 “흠.. 이 작품은 자연주의의 대가인 OOO의 작품이군요. 이 자유로운 붓 터치, 옷의 주름까지 세밀한 묘사....” 그림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 남성, 겉모습과 달리 작품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진 모습에 여자는 새로운 시선으로 남자를 바라본다.」
가끔 찾는 미술관이나 전시회 때면 매번 떠오르는 상상이다. 멋진 미술작품 앞에서 지식을 뽐내며 여자에게 부러움을 혹은 대단하다는 시선을 받는 상황을 그려본다. 그런 마음에서일까? 미술관 시리즈 중 하나인 “루브로와 오르세의 명화산책”은 이런 나의 상상을 실현시켜줄 좋은 책이라 생각되어 무작정 붙잡고 읽었다. 훗날 작품 앞에서 나의 지식을 뽐내보자는 생각 속에서...
세계적인 미술관 ‘루브르’와 ‘오르세’. 다빈치코드의 무대이기에 더욱 익숙한 이곳 루브르. 아마 그 전에는 그냥 유명한 박물관이 아니었나 생각 했을 정도로 미술과는 거리가 먼 나이지만 저자의 세밀한 작품 묘사와 시대별 대표 화가들의 작품과 화풍을 연결해서 쉽게 설명해주기에 이해하기가 참 편하게 느껴진다.
먼저 이 책을 읽고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유럽 문화 부흥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 준 책이라는 것이다. 유럽 역사 속에서 한 획을 그었던 예술가의 혼이 담겨진 작품들을 접할 수 있었기에 마치 루브르 박물관에서 미술 수업을 듣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중세자연주의 화풍은 글을 읽지 못하는 평신도들에게 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거룩하게 그 뜻을 전하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고 한다.
이 책은 초반에 중세미술화풍과 르네상스화가들의 시도를 조금씩 비교 분석해서 보여준다. 원근법이 없는 중세그림에서 과감히 원근법을 넣은 우첼로,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위해 미를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응용해 이상미와 자연주의적 예술을 결합시킨 미켈란젤로, 성서를 세속의 아름다움으로 포장한 보티첼리를 통해 새로운 화풍의 등장과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초기르네상스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가 등장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리고 대중에게 널리 사랑받았다는 라파엘로까지. 레오나르도가 인물그림에서 미소, 우는 모습 등 감정을 절대로 넣지 않았는데 모나리자에서 만큼은 야릇한 미소와 부드러움을 넣었다고 한다. 그래서 더욱 미술사에 높은 작품으로 기록되는 것이라 한다. 혹시 꿈에 보살님을 만난 것은 아닐까? 모나리자의 미소를 보고 있으니 온화한 미소와 다정한 눈빛이 인상적인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이 아닐까?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가 동성애자라는 속설도 저자가 콕 꼬집어서 이야기 해준다. 그림속의 미소년, 미청년이 두 화가의 동성애 때문에 그렇다는 주장과 인문학과 자연과학에 정통한 그들이 내놓은 양성합일의 개념이 담긴 그림이라는 주장이 있다고 말해줘 화가의 새로운 면을 볼 수 있었다. 다시 한 번 작품을 바라보니 주인공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다. 원래 저 시대 사람들은 다 미소년이었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군.
후기르네상는 정치적 혼란기의 그림이란 느낌이고 베네치아 화풍은 그동안의 그림들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채도의 차이가 팍팍 나는 느낌이다. 전체적인 그림이 뿌옇거나 색감이 새롭게 느껴졌다. 이것이 베네치아의 기후와 관계있으며 훗날 인상파의 시초가 된다고 전한다.
페미니스트 미술가의 공격 대상이 된 틴토레토. 그에게 무슨 죄가 있겠는가 하지만 작가의 말처럼 그의 작품들은 “대단한 발상의 전환과 발칙한 상상이 낳은 위대한 작품들”임에 분명하다. 이전 시대의 작품에 비해 더 강한 느낌과 독특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아르침볼드의 사계는 미술책에서 어렴풋이 본 기억이 있다. 온갖 종류의 꼭과 과일로 사람의 얼굴을 그려낸 그의 독특한 발상이 대단하다. 괴기스럽기까지 한 이 작품을 보면서 작가는 왜 저렇게 얼굴을 표현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또한 카라치의 작품은 작가의 말대로 “콘트라스틀 가득 준 그림”같다. 뿌옇다기보다 탁하다는 느낌이 날 정도다. 그 전까지 그림들이 밝거나 사실적인 색조였는데 이곳은 색감이 너무 짙어졌다. 그러다가 18세기 베네치아 풍경화 ‘베두타’를 보는 순간 감탄 또 감탄이 절로 나온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사실적으로 묘사해뒀는지, 당장 가방 싸서 베네치아로 가고 싶어지게 만든다.
책의 장이 넘어갈 때마다 역사적 흐름과 세계적 충돌을 다룸으로서 역사의 흐름과 화풍의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해 준다. 무엇보다도 다비드의 ‘나폴레옹의 황제 대관식’은 그림이라기보다 영화의 스크린 샷이라해도 믿을 만큼 정교하고 장엄해 그 분위기가 너무나 엄숙하게 느껴진다.
마지막으로 그림속의 자신의 얼굴을 보며 “내가 점이야?”라고 말했다는 인상주의 작품들, 우리에게 알려진 작가들의 작품 외면 받던 그들이 훗날 최고의 화가로 불리게 될 때까지의 이야기들 모두가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온다.
한 권의 책 속에 수많은 작가가 나오고 작품이 나오지만 막상 책을 덮고 나니 이 화가는 자연주의였던가?? 하며 기억이 다시 가물가물해진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작품들 속에 시대적 사상과 개인적 신념 사상이 담겨져 있으며 대략적으로 작품을 어떻게 관찰해야 하는지를 조금은 깨닫게 되었다. 미술작품 앞에서 작품에 대한 지식을 뽐내려면 자주 작품을 접하고 이런 책을 많이 읽어야 할 것 같다. 나는 아직 멀었나 보다 자주 예술작품을 접하며 내공을 쌓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