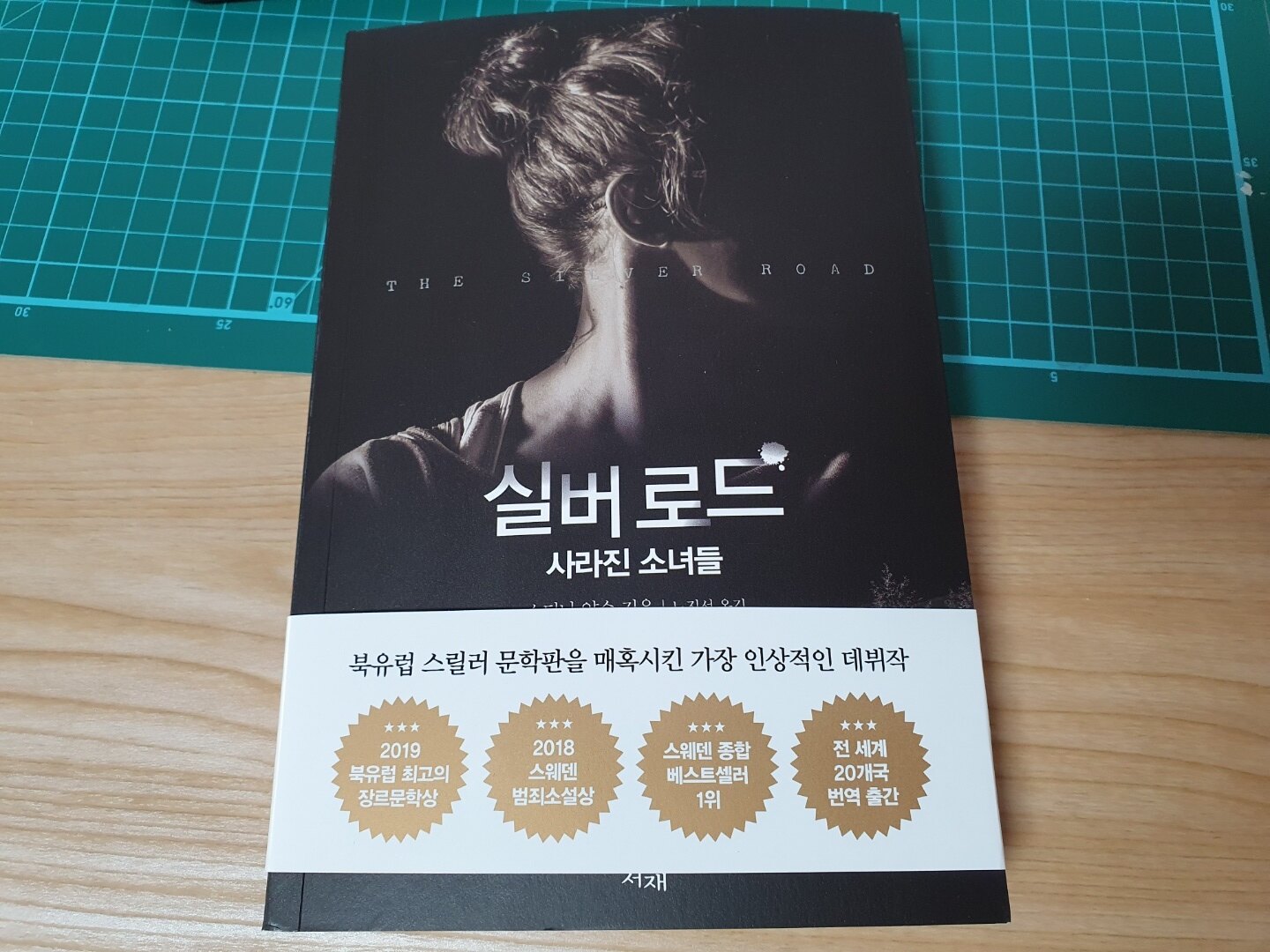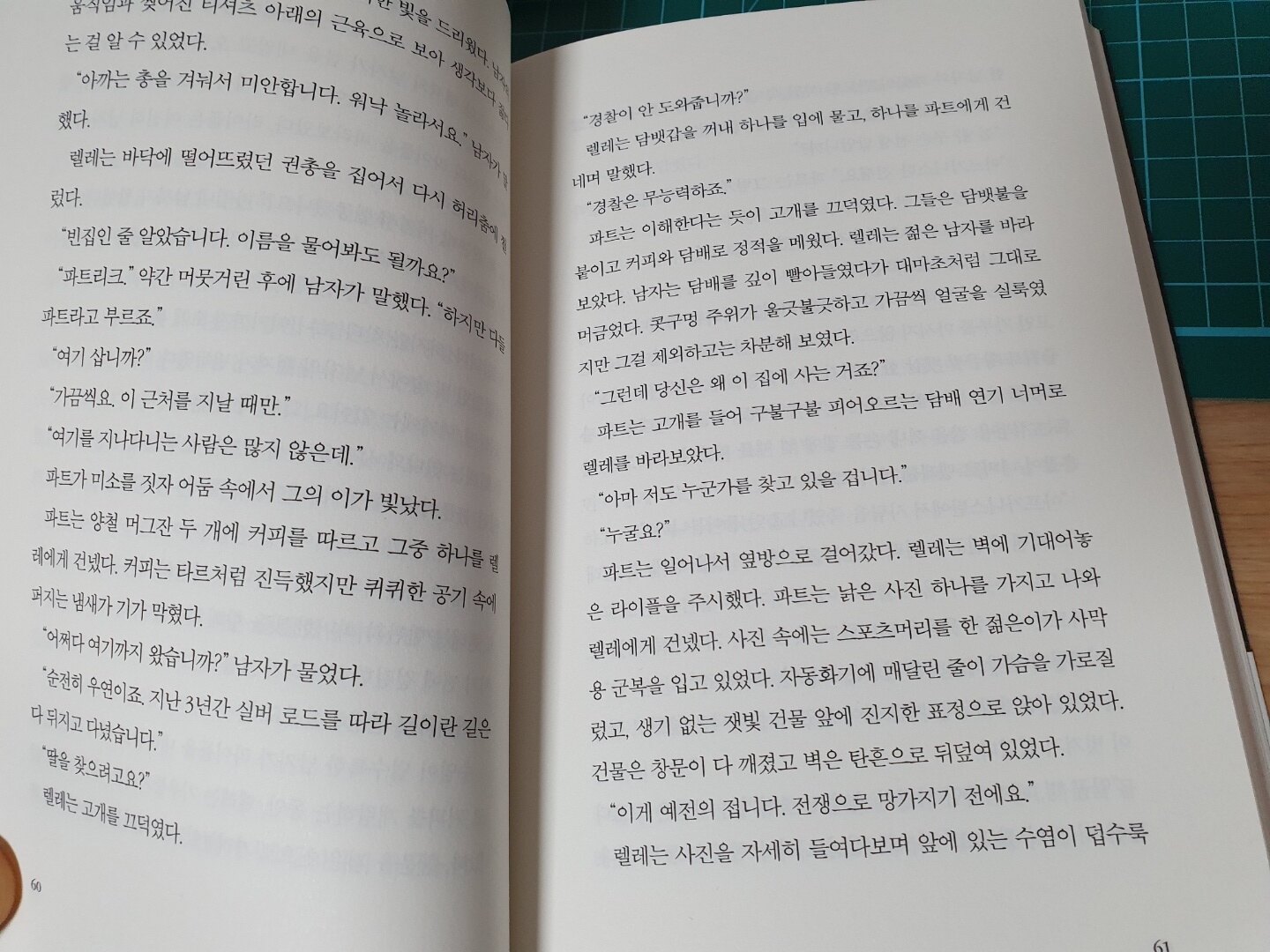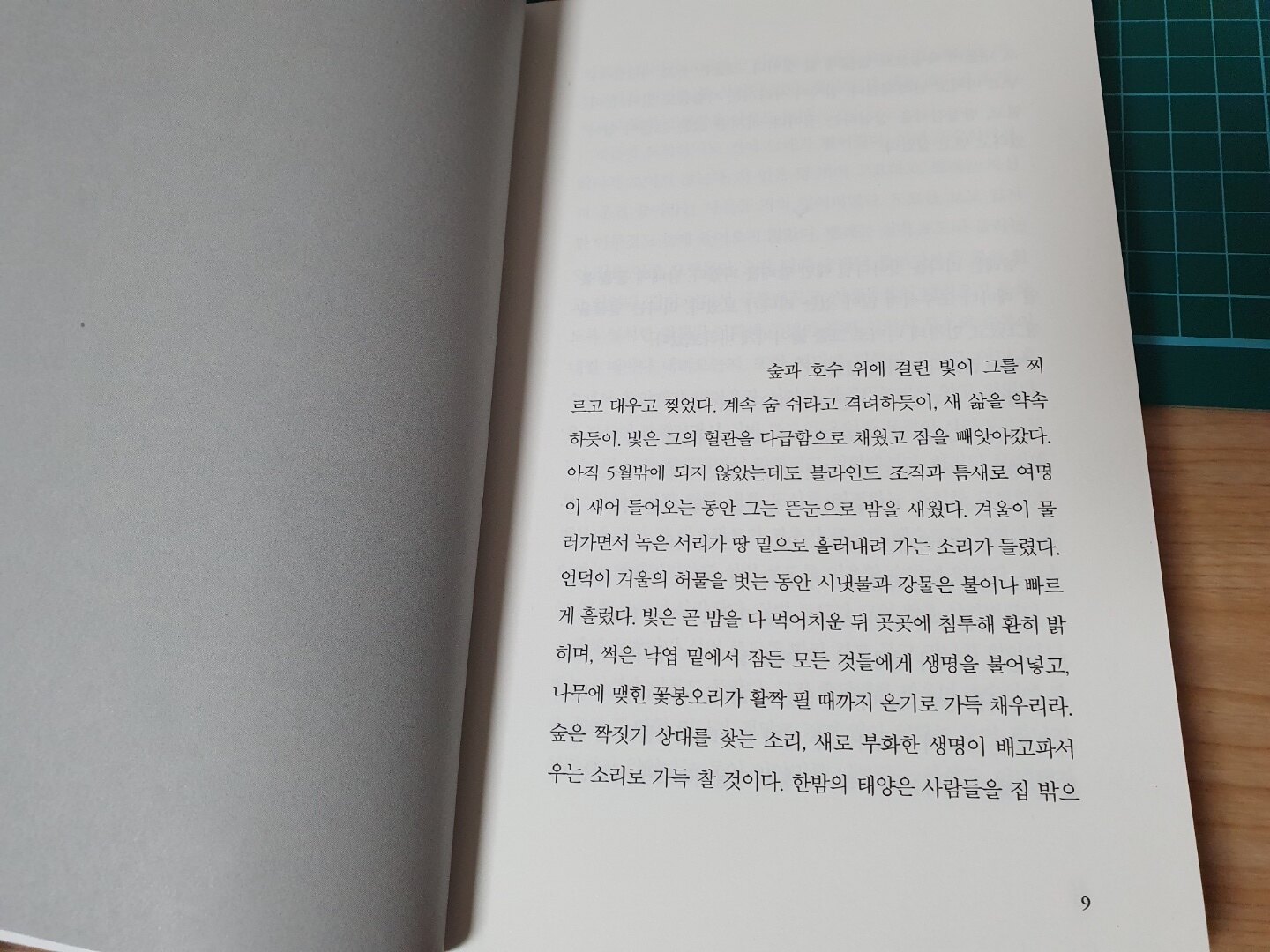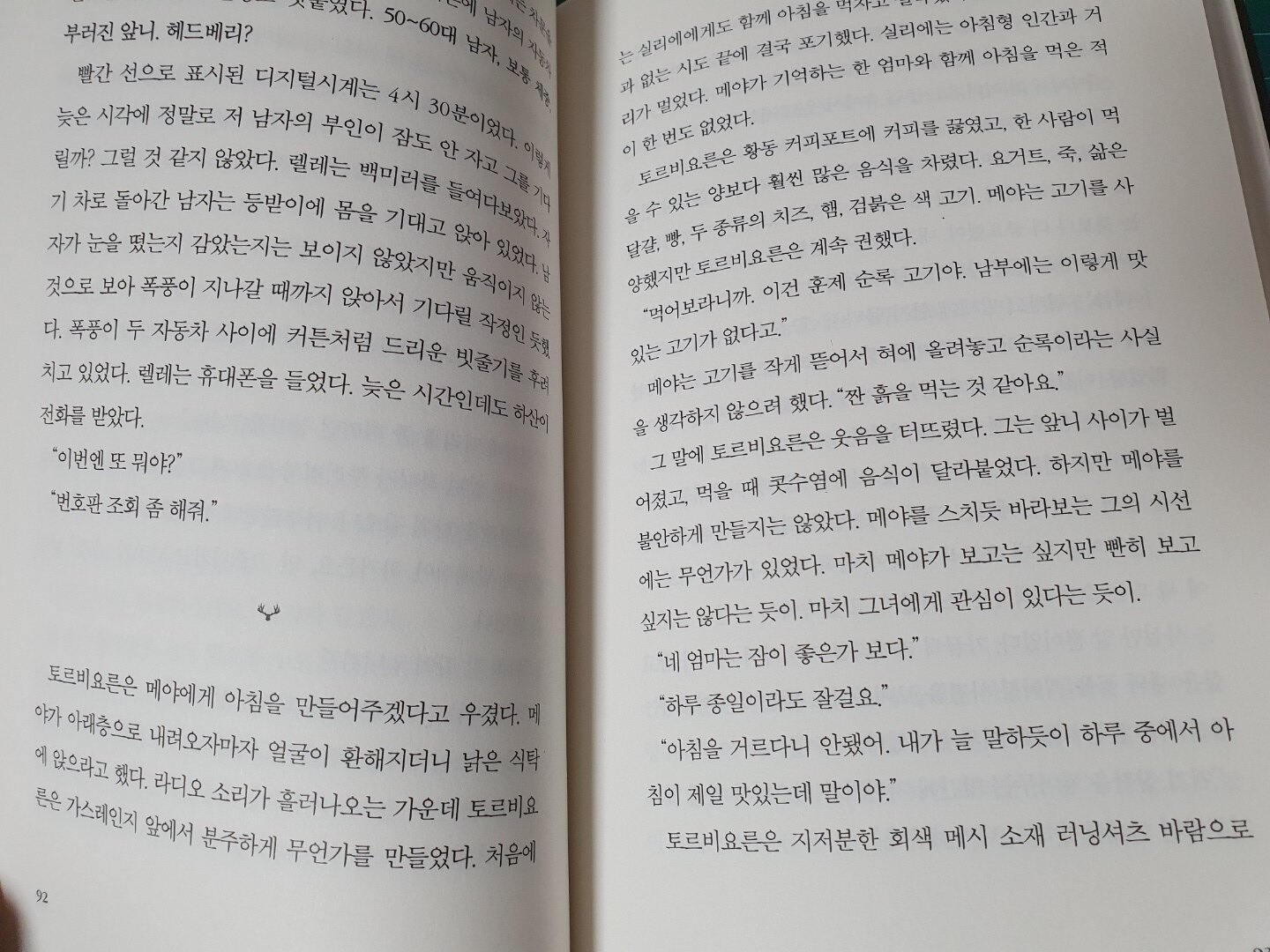-

-
실버 로드 - 사라진 소녀들
스티나 약손 지음, 노진선 옮김 / 마음서재 / 2020년 4월
평점 :



북유럽 소설은 그 지역만의 느낌이나 특색이 있다.
아마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다르고
내가 경험했던 문화와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북유럽 소설은 뭔가 새롭게 다가온다.
<실버로드> 소설도 마찬가지다.
2019년 북유럽 최고의 장르 문학상인 유리열쇠상을 받은 작가인 스티나약손이
고향을 무대로 소설을 쓰면서 향수를 달랜 데뷔작이 바로 <실버로드>이다.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실버로드>
나와 다른 지역의 이야기지만
소설을 읽는 동안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실버 로드에 도착하자 목구멍이 따끔거렸다. 메야는 버스 기사가 잘 볼 수 있도록 거의 길 한 가운데에 서 있어야 했다. 기사는 키가 작고 얼굴이 붉은 남자로 보온병에 든 커피를 마셨다. 어찌나 빠른 말투로 퉁명스럽게 말하는지 비르게르의 안부를 묻는 것 외에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버스는 주변 마을에 사는 학생들로 차츰 채워졌다. 집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그저 나무들 사이를 가리키는 표지판만 보였다. 학생들을 도로변에 서서 버스를 기다렸다. 뺨은 장밋빛으로 상기되었고, 쌀쌀한 공기 속에서 입김이 피어났다. 메야는 학생들이 탈 때마다 눈을 감고 차가운 유리창에 머리를 기댔다. 자신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호기심 어린 그들의 시선에 눈꺼풀이 불타는 듯했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 책 중에서
짧은 문체와 눈 앞에 그려지는 듯한 선명한 묘사다 돋보이는 글귀였다.
글을 읽고 있으면 마치 그 공간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드는.
그런 느낌이 책을 읽는 동안 계속 느껴졌다.
렐레는 자신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었다. 몸도 머리도 말을 듣지 않았다. 시간은 정지해서 다른 무언가가 되어버렸다. 믿을 수 없고 딱히 정의 내릴 수 없는 무언가로. 바로 옆에서 비르게르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가 말하는 상대는 렐레가 아니었다. 곧 그들이 다가왔다. 키가 크고 마른 형체들이 렐레의 양쪽 겨드랑이에 소늘 넣고 발목을 들어올렸다. 전혀 무겁지 않다는 듯이. 그렇게 그의 몸뚱이를 들고 복도를 지나 계단을 올라갔다. 한 계단식 오를 때마다 도끼로 갈비뼈를 치는 듯했다. 그러고는 겨울밤 속으로 나갔다.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었던 탓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렐레는 그들의 손아귀 안에서 이리저리 흔들렸다. 머리 위에 서는 별들이 불타올랐고, 옷 속으로는 추위가 파고들어 머리가 맑아졌다. 털모자를 쓴 그들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다. 젊은 청년들이라는 사실만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를 악문 채 그의 시선을 피했다. 그들에게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욕하는 자신의 목소리가 들렸다. 셋 중에서 키가 제일 큰 남자가 여드름이 난 얼굴로 미소를 지었다. 렐레는 결박된 손으로 그를 움켜잡으려 했다. 하지만 남자의 미소만 더 환해질 뿐이었다. _ 책 중에서
이 책은 스릴러물이다.
실버로드.
스웨덴 동부 해안에서 노르웨이 국경으로 이어지는 95번 국도인 이 길에서
3년 전 렐레의 딸이 버스를 기다리다가 실종된다.
목격자도 없고, 단서도 없이 미궁에 빠지는 사건을 바라보며
렐레는 무능한 경찰을 바라보지 않고 직접 딸의 행방을 찾아나선다.
그렇게 용의자를 하나하나 포착해가면서 진실을 향해 접근하는데
또다른 사건을 마주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책에는 가득하다.
이런 내용의 소설이여서 그럴까.
책을 읽는 내내 영화나 방송을 통해 보았던 북유럽의 울창한 숲과
그 가운데 쭉 뻗은 길이 떠오르면서
그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머릿 속에 너무나 선명하게 그려진다.
빛과 어둠. 그 사이의 경계를 왔다갔다하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일상에 대한 답답함.
어디 한 곳에 몰입하면서 훅 빠져보고 싶은 시간이 드는 순간.
<실버로드>를 통해 그 경험과 시간을 마음껏 느껴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