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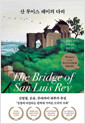
-
산 루이스 레이의 다리
손턴 와일더 지음, 정해영 옮김, 신형철 해제 / 클레이하우스 / 2025년 5월
평점 :



1714년 7월의 어느 날, 페루에서 가장 멋진 다리가 무너지며 다섯 명의 여행자가 그 아래의 골짜기로 추락했다. 산 루이스 레이의 다리는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건너다녔던 그 지역의 대표적인 다리였고, 사고가 일어난 후 사람들은 저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시 한 번 신의 보호 아래 평안이 이어지기를 기도해야했다.
사고를 당한 다섯 명의 운명에 대해 ‘주니퍼 수사’는
그것이 신의 의도인지, 만약 신의 의도라면 그들의 삶이 어떠했기에 신이 한 사람의 삶을 끝내버리는 선택을 한 것인지 그 연관성을 알아내고 싶어했다. 그것만 입증해내면 뿌연 안개가 걷히듯 삶의 모순을 뒤로한 채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에 한 치의 오해나 망설임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것만 같았다.
그리고 이어지는 챕터에서부터 당시 사고를 당한 다섯명의 운명에 대한 철저한 뒷조사가 이루어진다.
우리는 우연히 살고 우연히 죽는 것일까,
아니면 계획에 의해 살고
계획에 의해 죽는 것일까. | 15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자주 발생한다.
세월호 사건에서부터 이태원 참사까지, 사건은 그 당시의 중대한 이슈일 뿐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은 점점 흐려진다. 그래서 산 루이스 레이 다리가 무너지던 날, 절벽 아래로 추락한 다섯 명은 대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까. 수년
간의 조사 끝에 주니퍼 수사가 낸 결론은 무엇일까.
—
작가는 한 줄로 요약되는 결론 보다는
개개인의 고유한 삶 자체에 더욱 집중하는 선택을 한다.
멀리서 보면 그저 잊혀져가는 사건일 뿐이지만 그 안에 속한 각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보면, 모두 저마다의 서사를 간직한 채 다리 밑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그들의 서사에는 어떤 공통점도, 인과관계도 없었고, 있다고 한들 그것을 따지는 것 조차 무의미했다. ‘인간이 죽음을 어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신형철 평론가는 이런 말을 남긴다.
“ 신의 사랑이라는 대양에서 인간의 사랑은 서로 섞인다. 더 크게 섞이기 위한 다리는 많을수록 좋을 것이다. 우리에게 신이 필요한 때는 다리가 끊어지는 때가 아니라 그럴 줄 알면서도 그것을 놓는 때다. ” | 218
—
내 삶의 모든 선택이 신의 의도라면,
그가 내 삶에 이토록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쩐지 기운 빠지고 서글퍼지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인간은 이미 수세대에 걸쳐 이런 고민을 지속해왔다.
우연이건 의도이건 제 나름의 삶을 개척하고 때때로 신의 도움을 갈망하며 오늘날의 인간의 삶 속으로 이어져온 것이다. 이 하찮은 인간의 노력이, 나의 모든 좌절과 인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같은 것들이 그렇게 무의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어느 순간 우리는 신에 대한 질문을 인간에게로 돌렸기 때문에. 신이라는 존재에 앞서 인간이라는 실존에 운명을 걸었고 그 결과가 ‘오늘의 나’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랑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건너왔고
어떤 믿음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은 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전해지고 있다.
마치 <산 루이스 레이의 다리>가 약 100년이라는 시간동안
수 많은 독자의 손을 거쳐 오늘의 우리에게 닿은 것처럼.
—
우리는 곧 죽은 것이고, 그 다섯 명에 대한 모든 기억도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우리 자신도 한동안 사랑받다가 잊힐 것이다. 그러나 그 정도 사랑이면 충분하다. 모든 사랑의 충동은 그것을 만들어 낸 사랑으로 돌아간다. 사랑을 위해서는 기억조차 필요하지 않다. 산 자들의 땅과 죽은 자들의 땅이 있고, 그 둘을 잇는 다리가 바로 사랑이다. 오직 사랑만이 남는다. 오직 사랑만이 의미를 지닌다. |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