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화씨 451 ㅣ 환상문학전집 12
레이 브래드버리 지음, 박상준 옮김 / 황금가지 / 2009년 3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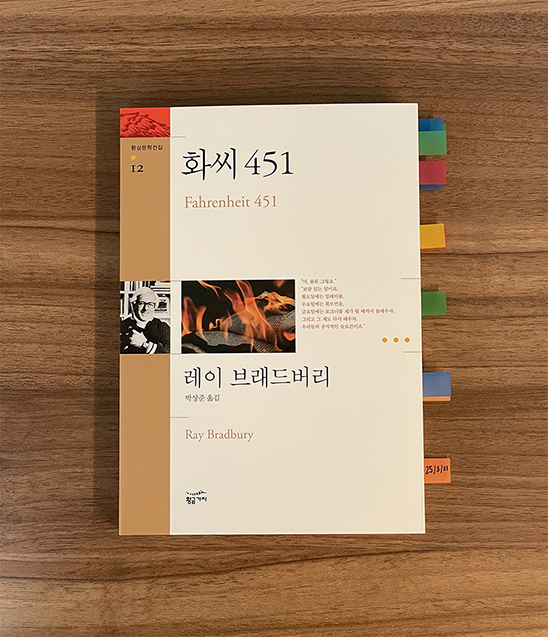
불길이 책장을 삼키고, 활자가 재로 흩어진다. 화씨 451은 단순한 디스토피아적 상상력이 아니라, 불태워지는 것이 단순한 종이 묶음이 아님을 상기시키는 선언과도 같은 작품이다. 그것은 사고의 말살이며, 기억의 단절이며, 인간이 더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과정이다.
브래드버리는 이 작품을 통해 한 개인이 ‘생각하는 존재’에서 ‘수동적 소비자’로 전락하는 순간을 탐구한다. 소방관 가이 몬태그는 불을 끄는 사람이 아니라 불을 지르는 사람이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호스가 아니라 화염방사기이며, 그가 태우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지식이다. 책은 위험한 것이고, 따라서 제거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지의 평온 속에서 살아가던 그가 어린 클라리스와의 만남을 계기로 의심하기 시작할 때, 이 세계의 균열이 서서히 드러난다.
화씨 451의 진정한 공포는 폭력적인 억압에 있지 않다. 이곳에는 전체주의적 독재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거리를 가득 메운 감시 카메라도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사람들은 거대한 벽면 스크린 속 가상의 가족과 대화하며, 이어폰을 통해 끊임없는 소음을 주입받는다. 그들은 더는 독서를 금지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치 않는다. 사고를 요구하는 모든 것이 피곤하고, 불편하고, 불행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사회는 억압이 아니라 유희를 통해 사람들을 통제하며, 시민은 자신을 감시하는 경찰이 필요 없이도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가장 효과적인 검열이란, 검열할 필요조차 없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라는 점을 브래드버리는 예리하게 포착한다. 2025년, 우리는 이미 몬태그의 화염방사기 대신 '알고리즘의 시원한 물줄기'로 스스로를 적시고 있진 않은가?
언어는 건조하지만, 그 안에 흐르는 감정은 뜨겁다. 소설 속 불길처럼 문장은 빠르고 격렬하게 타오른다. 몬태그가 점점 더 거대한 저항 속으로 내던져질수록, 독자 또한 그 불길 속에서 허덕이게 된다. 파버와의 대화, 책을 태우라는 명령 앞에서의 갈등, 그리고 최후의 도망길에서 펼쳐지는 숨 막히는 추격전까지, 작품은 결코 한순간도 느슨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화씨 451이 단순한 경고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불타버린 잿더미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은 존재한다. 책의 문장을 외워 전승하는 사람들, 기억된 지식이 다시금 활자화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폐허에서 새로이 시작될 수 있다는 가능성. 브래드버리는 우리가 불길 속에서 무엇을 지켜내야 하는지를 묻고 있으며, 그 질문은 작품이 출간된 20세기 중반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여전히 책을 읽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읽지 않는다면, 읽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이 화씨 451 속 세계와 얼마나 다른 것일까? 가장 무서운 것은 책이 불타는 것이 아니라, 그 불꽃을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