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도록 공부만 해서 대학에 가니 이젠 죽도록 스펙을 쌓아야 하는 젊음 앞에 좋은 직장만 들어가자 다짐한다.
그렇게 입에 발린 자소서를 들이밀며 수차례의 면접 끝에 드디어 사회로의 첫발을 내딛는 감격적인 순간도 잠시, 세상은 너무도 살벌하고 외롭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긴장의 나날들이 이어지며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어느덧 내 밑으로 바짝 긴장한 신입이 생기기 시작해 남다른 감회를 느끼는 것도 잠시 왠지 거대한 미로 속에 갇혀있는 듯한 혼란에 휩싸이며 이건 아니란 생각이 들어 사표를 내던지고 세계 일주에 나선다!
지금껏 내가 접했던 수많은 에세이의 시작이 이러했던 것 같다.
그렇게 몇 년을 여행 에세이를 읽어젖히다 보니 사람은 다른데 내용은 비슷해서 장소와 지은이가 마구잡이로 겹쳐 보이는 현상에 한동안 여행 에세이를 펼쳐보지 않았더랬다. 뭔가 식상해졌다고나 할까. 그래서 <40일간의 남미 일주>도 늘 봐왔던, 너무도 익숙한 구도의 여행 에세이겠거니 했다.
하지만 내가 간과한게 있었다.
보통 일반적인 웃음 코드에서 빵 터지지 않고 두 타이밍이나 세 타이밍 뒤에 웃음보가 터져 지인들이 입을 모아 당최 나의 웃음 코드를 이해할 수 없다며 혀를 내두르는데 최민석 작가의 입담은 바로 그런 나의 웃음 코드와 딱 맞는다는 것이다. 몇 년 전에 읽었던 <미시시피 모기떼의 역습>이란 책에서 이미 충분히 그것을 경험한바, 예전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며 나는 이 책에 푹 빠져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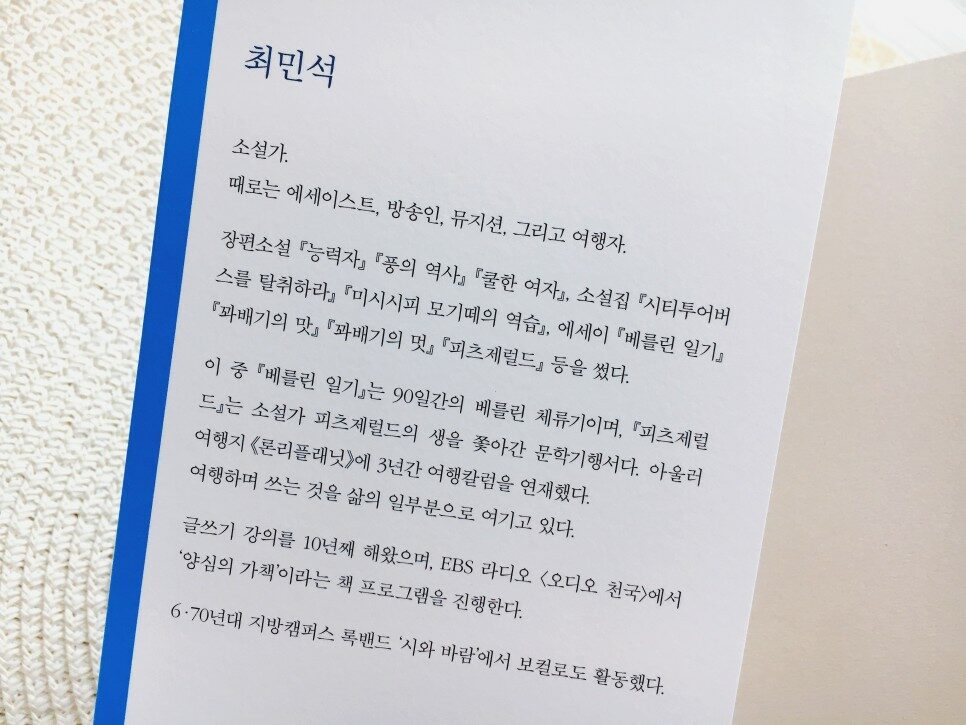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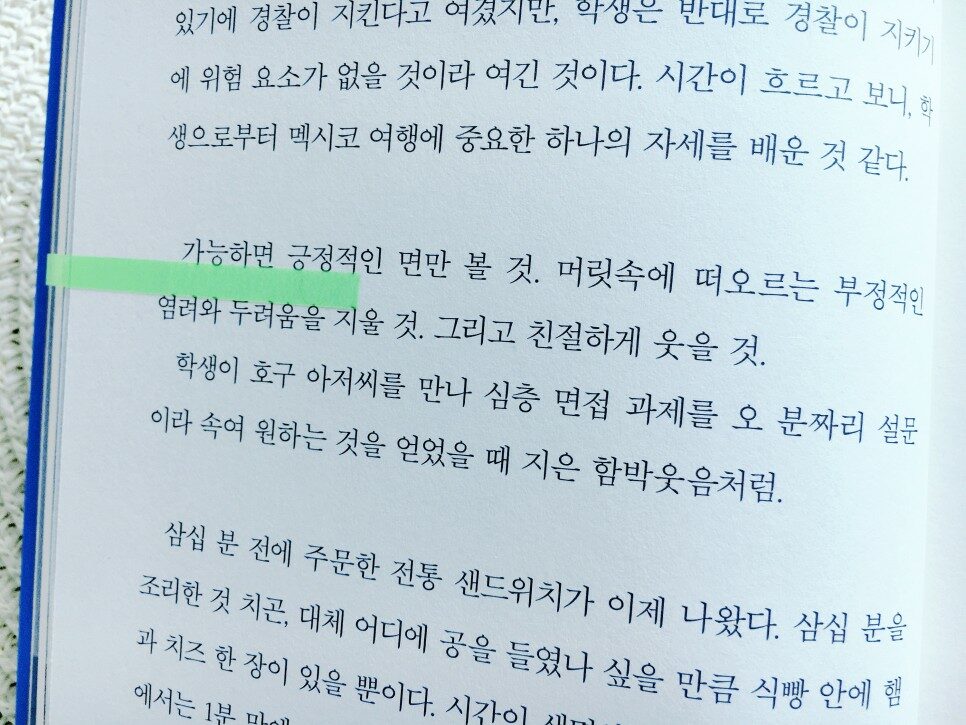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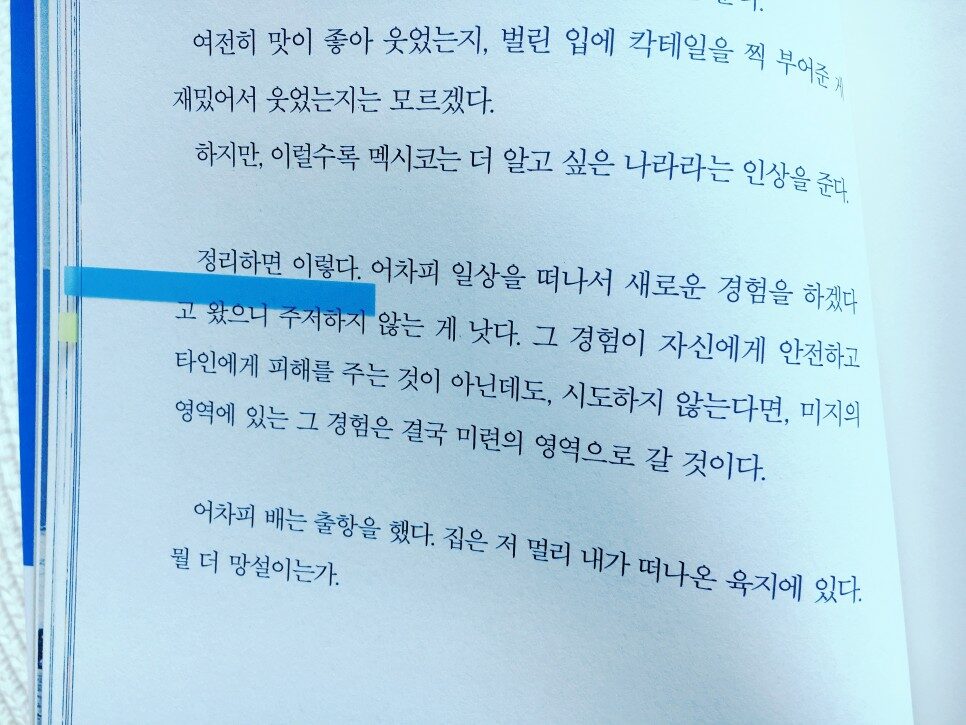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을 40일간 여행하며 매일 여행 일지를 기록한 이 에세이는 그간 너무 앞만 보며 달려왔던 나에게 휴식을 주고 싶다는 짙게 배인 감성보단 한번 보면 빠져들 수밖에 없는 작가의 말재주에 끊임없이 농락당하게 되는 에세이라고 말하고 싶다.
보통 직장인처럼 살기 위해 그보다 덜 자고 더 많이 글을 쓰며 전업작가 10년 차를 버텨낸 작가의 피, 땀, 눈물은 첫날부터 보기 좋게 호구가 되어 여행길에 오른 여정을 보여준다. 호구 짓도 한두 번 당하면 습관이 된다기보다 먼 타향까지 와서 이렇게 바보짓을 한다는 생각에 잠 못 이룰 만큼 화가 날법도 한데 작가는 역시 베테랑 여행자답게 최대한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노력한다. 차마 그 긍정의 의미가 성직자의 그것처럼 숭고하거나 기품 있진 않지만 가장 현실적이기에 몇 문장 되지 않는 글에 깊은 공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어딜 가나 스피커 속에 잠겨 있는 듯 쾅쾅 울려대는 음악과 주문하면 최소 30분 이상 걸리는 느림의 미학은 모든 것을 빨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 갇혀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한국인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기에 충분했고 거스름돈을 덜 주는 다른 나라와 달리 거스름돈을 더 얹어주면서도 정직하게 되돌려주면 그마저도 시크한 답례를 하는 그들의 모습은 은근 사랑스럽기까지 하다.
총으로 중무장한 군인의 모습은 우리에게는 낯설게 다가오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치안이 좋은 거라며 안심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그럼에도 여유 있고 느긋하며 잘 웃고 순수하기까지 한 모습은 깊은 인상을 남긴다.
멋들어지게 화려하고 세련된 이미지는 아니지만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인상이 여행지를 좌우하는 경우가 크기에 사람 냄새가 물씬 풍겼을 남미 여행에서 교통 불편하고 물가도 제각각이며 시차가 안 맞아 좀비처럼 지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다시 가고 싶어지는 게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