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베르 카뮈의 <이방인>보다 몇 년 전 카멜 다우드의 <뫼르소, 살인사건>을 먼저 접하며 이방인을 모티브로 가져와 썼다던 뫼르소, 살인사건의 기원이 무엇인지 늘 궁금했었다. 조금 늦긴 했지만 이제서야 읽게 된 이방인은 확실히 뫼르소, 살인사건보다 더 딱딱하고 군더더기 없는 문체라 소설에 발을 들여놓고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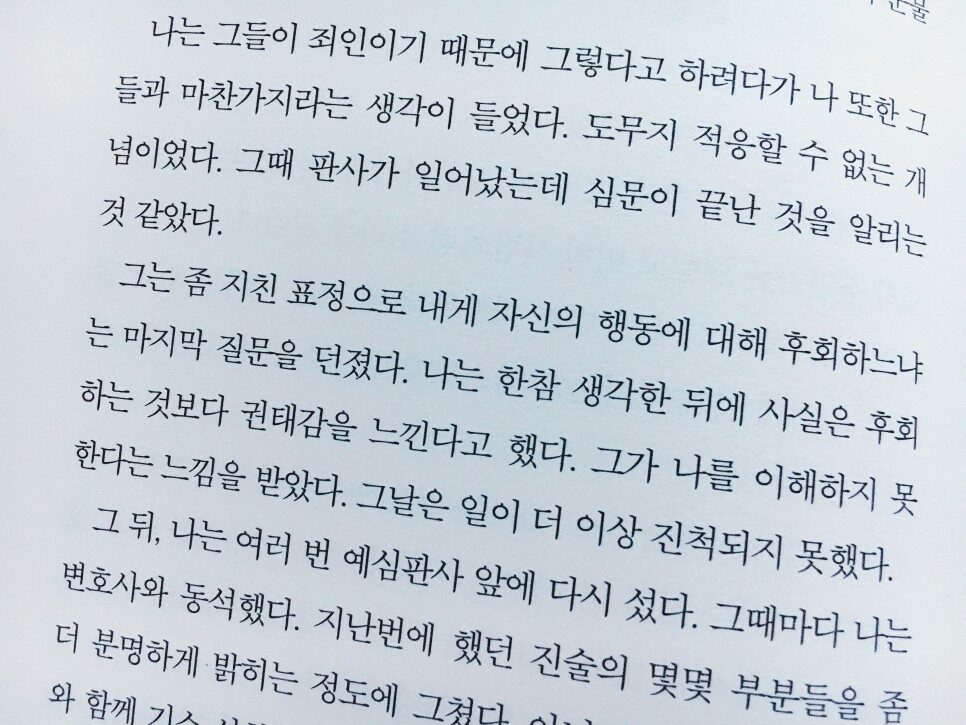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며 혼자 살아가고 있는 뫼르소에게 양로원에 계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부고가 전해진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러야 했던 뫼르소는 직장에 이틀의 휴가를 내는데 노골적으로 싫은 티를 내는 사장에게 한다는 말이 "그건 제 탓이 아닙니다."였다. 처음 등장하는 뫼르소의 말부터 캐릭터의 심상치 않음을 감지할 수 있는데 이후 양로원에 도착해서 장례를 치르기까지 뫼르소의 행동은 그저 무기력하기만 하다. 마지막 해는 거의 찾아보지 못해 한참을 보지 못한 어머니의 안부를 양로원 사람들에게 묻기는커녕 관 속에 있는 어머니의 마지막 얼굴조차 보지 않는 뫼르소의 행동에 주변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한다. 심지어 울거나 괴로워하는 기색조차 비치지 않는 뫼르소를 보며 양로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구태여 소설 속에서 나열하지 않아도 알만하다.
그렇게 별 의미도 없는 장례식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와 쉴 생각으로 가득한 뫼르소는 다음날이 주말이란 사실에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해변으로 향한다. 그곳에서 직장 동료였지만 지금은 그만둔 마리를 만나 욕정을 느끼며 이후 이따금씩 만나는 사이로 발전한다.
날이 밝으면 힘겹게 일어나 직장으로 향하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일하고 점심시간이 되면 밥 먹고 낮잠을 자다 오후 근무시간이 되면 또 기계적으로 일하는 뫼르소의 모습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기력하기만 하다. 별다른 즐거움도, 하고 싶은 것도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듯한 생활을 유지하던 뫼르소에게 자신과 비슷한 연배의 이웃인 레몽이 등장하면서 뫼르소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레몽의 여자친구 오빠가 해변에 나타나 위협하는 일이 생겼던 날 뫼르소는 딱히 죽일 이유도, 마음도 없었지만 너무도 뜨거운 햇살에서 느껴진 권태로움과 한 몸이 되어 아랍인을 잔인하게 죽이게 된다. 이후 법정에 선 뫼르소에게 질문하던 판사는 죄를 뉘우치지도, 신을 믿지도 않으며 아무런 감정조차 느끼지 않는 뫼르소의 모습에 혀를 내두른다.
짤막한 분량의 소설이지만 굉장한 아우라의 무기력함과 권태감이 가득 담겨 있고 딱히 정의 내릴 수 없는 뫼르소의 생각과 행동에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소설 <이방인>. 삶에 대한 의지도 즐거움도 없었던 뫼르소가 느끼는 감정이란 마리와 몸이 닿을 때 느끼는 욕정뿐이랄까, 살아있음에도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은 비로소 모든 것이 끝나기를 바라며 오히려 행복감을 느끼는 뫼르소의 모습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작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