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상에서 고양이가 사라진다면
가와무라 겐키 지음, 이영미 옮김 / 오퍼스프레스 / 2014년 10월
평점 :

구판절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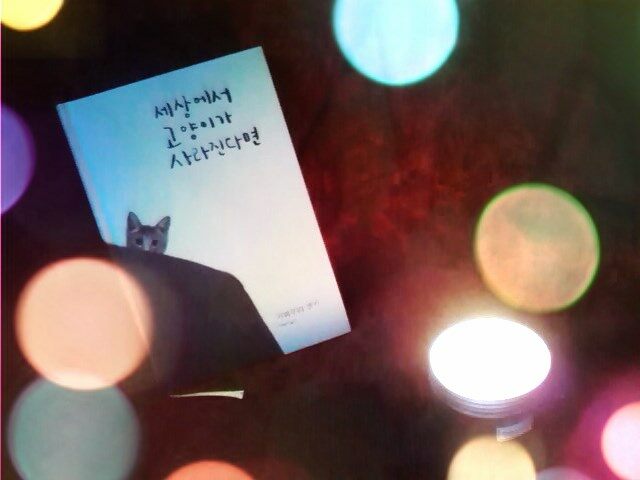
찰리 채플린의 영화를 좋아합니다. 고등학생 때 영화관에서 찰리 채플린의 영화를 단체 관람했었는데요. 라임라이트였는지, 독재자였는지, 모던타임즈였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영화를 보다가 눈물을 흘리는 저를 보고 친구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코미디 보면서 울다니, 괴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슬펐던걸요. 보이는 슬랩스틱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어른이니 모두 다 알 거예요. <세상에서 고양이가 사라진다면>은 채플린의 영화를 닮았습니다. 웃긴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페이지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긴 소설도 아닌데 읽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멈칫 멈칫 문구를 다시 살피게 됩니다. 채플린의 경쾌한 스텝처럼 죽음을 눈앞에 둔 '나'도 경쾌합니다. 그러나 '나'의 눈빛도 채플린의 그것과 같아서 가벼이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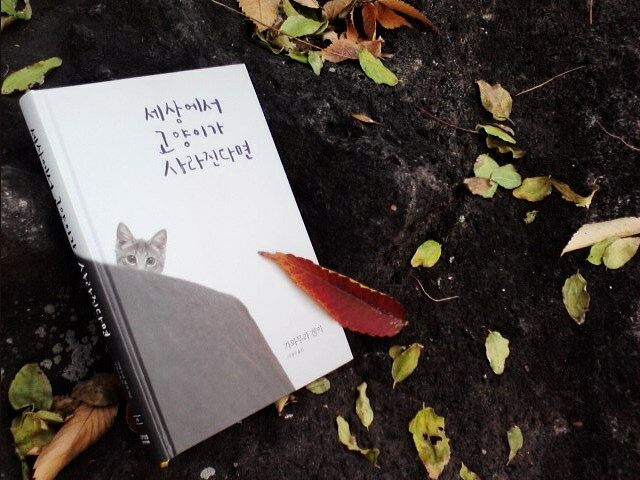
<세상에서 고양이가 사라진다면>의 주인공 '나'는 잦은 두통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뇌종양 4기. 남은 생명은 길어야 반년, 하지만 일주일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더 황당한 건 악마가 찾아와서 죽는 날이 내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딱히 크게 미련은 없지만, 죽고 싶지도 않습니다. 겨우 서른인데. 악마는 한가지 제안을 합니다. 세상에서 뭐든 한 가지만 없앤다. 그 대신 하루치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없앨 것은 악마가 정하고, 없앨지 말지는 '내'가 선택합니다. 그렇게 해서 첫날 전화를 없애는 것으로 하루치 생을 얻습니다. 저 역시 휴대전화의 필요성을 그다지 못 느끼는 데다가 휴대폰이 인간들을 폰 피플(셀- 스티븐 킹)로 만드는 것 같아서 휴대전화가 사라지는 것쯤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휴대폰이 사라진다는 상상만으로 패닉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둘째 날은 영화가 사라졌고, 셋째 날엔 시계가 사라졌습니다. 내 목숨과 바꿀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들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크게 불편하지 않을 텐데, 뜻밖에 그 상실감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전화를 없앰으로써 휴대전화가 보급되기 전의 두근거림이나, 소중한 것들을 떠오르게 했지만, 반대로 전화가 있어서 전해졌던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와의 대화도, 여행도, 사랑도 추억도. 아니, 애초에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전화를 달가워하지 않았던 그녀는 그와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듯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영화가 없어진 날. 영화와 함께 했던 추억들도 함께 날아가 버렸습니다. 첫사랑의 그녀가 무척이나 사랑하던 영화를 없애버리고 목숨을 연장할 만큼 그에게는 영화보다 생명이 중했지만, 사실은 텅 빈 스크린 위로 자신의 기억들이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희로애락뿐만 아니라 어릴 적 부모님과 보았던 E.T의 자전거 신도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사이좋게 행복하게 지냈던 적도 있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몇 년 동안이나 아버지와 연락하고 지내지 않았다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제는 전화를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날. 전화를 없애버렸으니까요.
세 번째 날, 그는 시계를 없앱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나 존재하는 것이므로 없어진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시계 수리공이지만, 그런 건 자신과는 상관없으니까요. 하지만, 시계가 사라진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과거의 추억도 현재의 삶도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희망도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소설에는 크게 셋의 죽음이 드러나있습니다. 오래전 죽은 고양이 양상추. 사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 그리고 겨우 목숨을 이어갈 뿐인 '나'. 그 셋의 죽음은 다른 듯 닮아있습니다. '시간'의 개념이 없으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을 수 있었던 고양이 양상추.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잃어야 한다며 생의 섭리를 지키며 다정했던 어머니, 죽음이 두려워 세상의 것을 하나씩 없애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려는 '나'. 세상의 것들 중 겨우 세 가지를 없앴을 뿐인데, 그것들이 주는 의미들과 삶과 죽음의 섭리를 깨달아갑니다. 이제 악마는 세상에서 고양이를 없애자고 합니다. 어머니가 키우다가 이젠 내가 키우고 있는 고양이 양배추가 세상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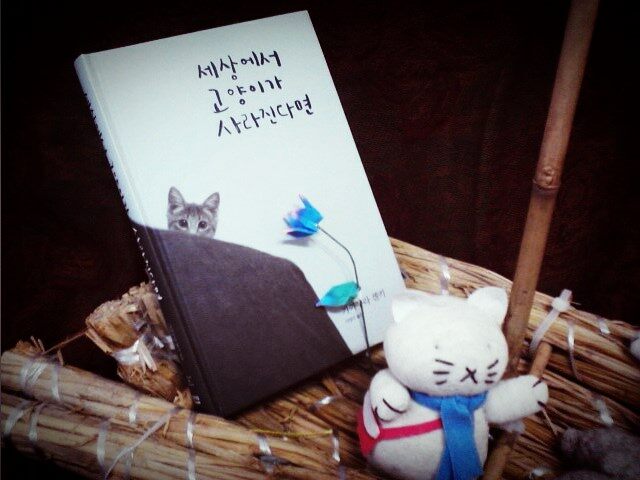
"뭔가를 얻으려면, 뭔가를 잃어야겠지."
어머니의 말을 떠올렸다.
나는 내 생명과 맞바꾸는 조건으로 이 세상에서 전화와 영화와 시계를 없앴다.
그러나 고양이는 없앨 수 없었다.
고양이 대신 자기 생명을 포기하다니, 바보 같은 남자라고 여길지도 모른다.
그 말이 맞다. 어리석기 짝이 없다. 하지만 나는 누군가에게서 뭔가를 가로채 생명을 연장하는 걸 행복이라고 여길 수는 없었다. 그것이 태양이든 바다든 공기든 고양이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뭔가를 없애는 일을 그만두기로 했다. 내 나름으로 타인보다 조금 짧게 주어진 나의 수명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때문에 나는 머지않아 죽는다.
p.193-194

'나'는 고양이를 없애는 대신 '내'가 사라지기로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편지를 씁니다. 긴 유서를.
책의 서두에 이 글은 '내가 당신에게 보내는 처음이자 마지막 편지. 나의 유서'라고 밝힙니다. 저는 그것이 독자인 저에게 하는 말인 줄 알았었는데, 아버지에게 보내는 긴 글이었던 것입니다. 독자로서 책을 덮은 후, 아버지로서 (아니 부모로서)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뚝뚝해 자기감정을 표현할 줄 모르는 아버지이지만,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내가 그리고 아들이 맡기고 간 고양이 양배추의 머리를 하염없이 쓰다듬는 모습이 어른거립니다.
죽기 전에 살아서 못다 한 것들을 해치우고 미련 없이 죽는다는 버킷 리스트 작성보다 살아있는 지금, 소중히 생각해야 할 것들이 내 주위엔 참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쓸모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누가 정하는 것인가요. 길가의 돌멩이 하나도 그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인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