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참 괜찮은 죽음 - 살아 숨 쉬는 현재를 위한 생각의 전환
헨리 마시 지음, 김미선 옮김 / 더퀘스트 / 2022년 7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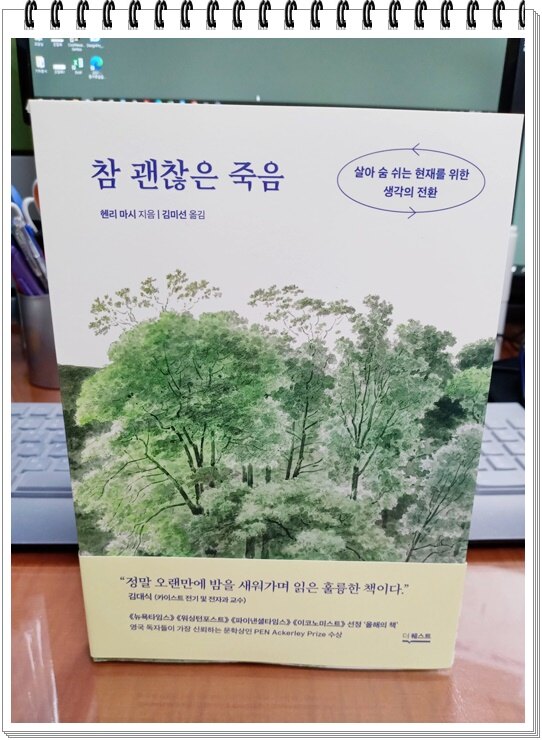


참 괜찮은 죽음
며칠 전부터 명치에 통증이 있어 위경련 약을 먹다가 들지 않아 피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담낭에 결석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 대학병원에 의뢰서를 써줄 테니 수술을 이야기했다. 마음이 내려앉았다. 인생 처음 외과수술을 기다리고 있다. 오늘 읽은 책 <참 괜찮은 죽음>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의사’ 가 환자와 만날 때 서로 느끼는 인간적 어려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저자는 그렇게 서문에서 이야기했다. 뇌를 수술하는 외과 의사 헨리 마시는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경외과 의사이자 섬세한 문필가다. 영국 북부의 탄광촌에서 우연히 병원보조원으로 일하게 됐고 그 경험을 계기로 외과 의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했단다. 특히 신경외과를 선택한 것은 수련의 시절 우연히 보게 된 신경외과수술에 매료되었기 때문. 목차를 보니 처음 들어보는 병명, 이를테면 송과체종, 동맥류, 혈관모세포종부터 암종, 수모세포종, 무감각통증에 이르기까지 그가 겪은 에피소드를 삶과 죽음의 성찰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털어놓는다.
‘앙고르 아니미’ 라는 말을 들어봤는가? 죽음에 대한 공포나 죽고 싶다는 욕망과는 다른, 죽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뜻한다. ‘의사도 언젠가는 환자가 된다’ 는 제목의 글에서 헨리 마시는 자신의 첫 의과대학 생활을 이야기한다. 어떤 강의는 용기를 주었고 어떤 강의는 우스꽝스러웠다고 고백했다. 꽤 사교적인 과정이기도 했다는 해부학 수업은 시체를 둘러싸고 앉아 죽은 조직을 떼어내고 긁어내며 수백 개의 이름을 외워야 했음을 회상한다. 인턴을 거치고 의대생일 때 가졌던 단순한 이타심은 금세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그. 의사에게 있어 환자는 불안과 스트레스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심폐소생을 통해 내출혈로 죽어가는 환자들과 더불어 날마다 죽음을 맞닥뜨렸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지금은 과거보다 환자들에게 더 깊은 연민을 느낀다고 했다.
책 제목이기도 한 ‘참 괜찮은 죽음’ 이란 글에선 저자의 어머니 이야기가 나온다. 앞으로 두세 달간의 시간이 남았을지 모를 그녀. 자신이 아는 사람 중 가장 대범한 달관자가 바로 어머니였지만 차마 죽음이라는 말은 입에 담지 못했다고. 어머니와 보낸 마지막 2주를 회상하며 날마다 어머니가 약해지는데 눈에 보였고 간호사인 누이와 돌아가며 보살폈다. 많은 노인들이 차가운 병원이나 호스피스 시설에서 간호 전문가의 보살핌을 받으며 죽는 걸 보면 저자가 어머니와 맞이한 죽음은 요즘 거의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사랑에 둘러싸여 있다는 건 아주 특별한 느낌이라는 말, 죽어서냐 살아서나 나 여기 있다고 미소짓는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는다. 저자는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기왕이면 자는 동안 빨리 끝나 죽음이 찾아오길 기다린다고 말했다. 어려운 일이겠지만. 순간적으로 소멸하는 죽음을 끝내 이루지 못한다면 삶을 돌아보며 ‘멋진 삶이었다고’ 한마디는 남기는 마지막이 되고 싶다. 신경외과 의사가 이야기하는 심오한 의학세계와 삶과 죽음의 통찰이 느껴지는 책이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협찬을 받았고
본인의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