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깝고도 먼 이름에게
가랑비메이커 지음 / 문장과장면들 / 2022년 4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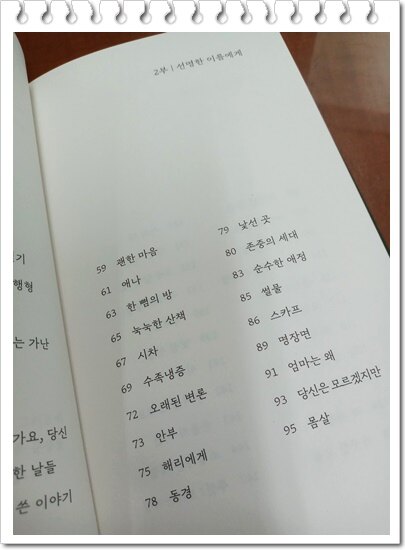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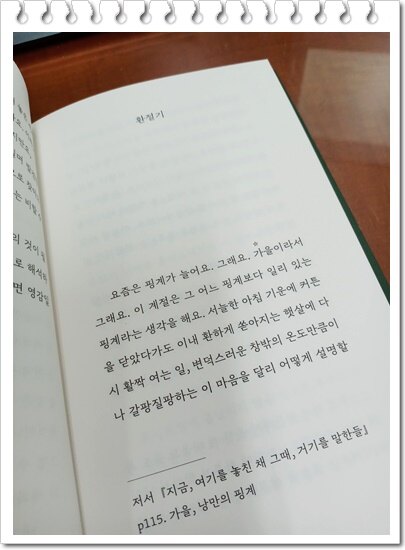
가깝고도 먼 이름에게
이름을 생각하니 김춘수의 ‘꽃’ 이나 윤동주의 ‘별 헤는 밤’ 이 생각난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패,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중략) 내 이름자를 써 보고, 흙으로 덮어 버리었습니다.’
수많은 이름들 사이에서 불러보기도, 불러보지 못하기도 한, 가까워지고, 멀어지기도 하는 이름을 우리는 목격하고 만나고 떠나보낸다. 저자 가랑비메이커는 혼잣말처럼 입을 떼고 있지만 자신이 조금 이르게 대화를 시작한 것이라며 독자와의 이야기를 추구하고 확신한다. ‘희미한, 선명한 그리고 여전한 이름에게’ 라는 부제를 붙여 편지글의 형식으로.
눈에 띄었던 글들 중 <엄마는 왜>가 있었다. 어제가 어버이날이라 그런지 부모님의 존재에 대해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 ‘엄마는 왜 이토록 좁은 화장실 안에서 몸을 잔뜩 수그린 채 다 자란 딸들의 허물을 줍는 걸까요.’ 라는 물음과 함께 화장실 가장 서늘한 가장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다. 수챗구멍을 가득 막아 놓은 내 머리카락을 줍고 계시는 엄마. 어리고 서툰 내 뒷모습을 아무말없이 보듬어주시는 이름, 엄마였다.
<동경>에서는 ‘동경이 미움으로 가는 경사’ 에 대해 이야기했다. 크게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서 그 길에 아무 생각 없이 서있다간 형편없는 마음이 되기 쉽다며.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던 누군가, 혹은 물건이 어느 순간 싫어지고 미워 진다는 건 슬픈 일인데 그 경사의 기울기만큼 마음 또한 삐뚤어져 버리기 십상인 것 같다. 내가 동경하던 대상이 무엇이었나 곱씹어보게 된다.
<깨끗한 오늘>은 어제를 용서하고 깨끗한 오늘을 마주 서고 싶어 하는 저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유연한 사랑과 다정한 포옹을 기대하며. 내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고 조건 없이 바라보는 이름은 누구일까. 나부터 나를 그렇게 볼 수는 없을까.
저자는 길고 지루한 편지라 자괴(自愧)했지만 독자인 나로선 편지를 받는 여러 이름들의 의미를 떠올리며 다양한 표정을 지었었다. 우린 가깝고도 멀지만 서로를 궁금해하는 이 거리가 싫지 않다.
출판사로부터 도서협찬을 받았고
본인의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