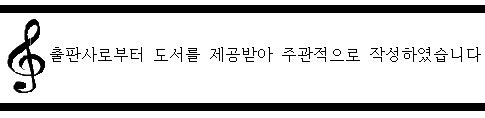-

-
돌봄의 언어 - 삶과 죽음, 예측불허의 몸과 마음을 함께하다
크리스티 왓슨 지음, 김혜림 옮김 / 니케북스 / 2021년 4월
평점 :

절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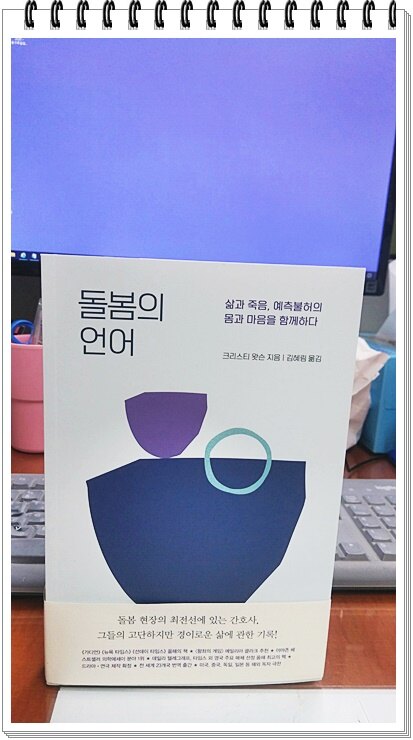
돌봄의 언어
엄마가 간호사였기 때문에 오늘 읽은 책이 더 와 닿았다. 영국의 간호사이자 작가인 크리스티 왓슨은 20년간 간호의 현장에서 경험한 희로애락을 우리에게 나눠주었다. 단지 생물학이나 약학, 해부학만이 자신의 영역이라 생각했던 신규 간호사 시절을 거쳐 철학과 심리학, 윤리와 정치가 간호학의 실체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 여정을 함께 들여다보자.
그녀는 응급실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소개했다. 그곳은 참 두려운 공간이었다. 생명이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지를 상기시키기 때문이었다. 인간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앞일을 알 수 없고 미약한 존재다. 하지만 그곳만의 매력이라면 모든 갈등을 잊게 하는 일체감, 허투루 지나가지 않는 시간, 하루를 강렬하게 체험하고 숙고하며 진정한 삶을 산다는 느낌일 것이다. 위급 환자를 대하는 간호사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소아과 신생아실에서 근무할 때 만난 아기들, 특히 특수간호영아실의 아기들은 거의 예외 없이 사랑스럽고, 상태가 호전되어 집으로 돌아간다고 아이를 안아주는 것이 업무의 일부라는 사실을 좋아한다고 고백했다. 부모들은 인내와 차분함으로 자신의 아기가 삶의 벼랑 끝에서 안전지대로 옮겨올 거라는 믿음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간호라는 명칭의 유래가 된 ‘유모’ 는 오늘까지 건재하며 그 정신은 아직도 간호의 중심이라고 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이 바로 간호다. 간호의 기능을 ‘간’ 의 그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한 저자는 간이 감염을 통제하고 조직재생에 관여하는 효소를 만들 듯 몸 안의 독소를 직접 제거해줄 수는 없지만 희망과 위로, 친절을 통해 나쁜 것을 변화시키려고 많은 시간을 들여 노력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소아중환자실에선 평생 간직할 인생관을 배우기도 했단다. 자신의 실수를 등에 짊어지고 이전에 취했던 행동을 돌이키며 영원히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아이들을 보살피는 일.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자들은 그렇게 그들 안에 머무는 것이다. 인간 생명의 극한을 경험하고자 선택한 곳이 소아중환자실이었는데 점점 감정이 무뎌지는 자신을 발견하고 때로는 끔찍한 괴로움을 보고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이미 수백 번 죽었을 아이 샬롯, 그 병의 위중함이 의사와 간호사의 능력을 넘어섰음에도 샬롯은 질병보다 강한 생존의 의지로 살아남았다. 샬롯의 의지가 간호사로서 치러야 하는 비용을 감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소회가 감명깊었다.
1950년대 간호사들에게서 처음 발견된 ‘연민피로’ 는 남을 돌봐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기 쉬운데, 끊임없는 정서적 공감이 오히려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불안 등 정서적 고갈을 가져와 결국 환자에게 필요한 돌봄과 친절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것이다. 간호의 진정한 모습인 ‘노인 돌봄’ 의 경우 나이팅게일은 “환자가 감기에 걸리거나 열이 있거나 정신이 희미하거나 체하거나 욕창이 생긴다면, 이는 병의 문제가 아니라 간호의 문제다” 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저자는 가장 연약한 존재를 다루는 이곳에서 다시 친절로 돌아가기를 희망했다. 책의 제목대로 돌봄의 언어는 말뿐 아니라 간호사 그 자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