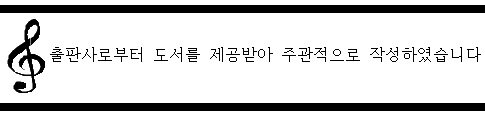-

-
글밥 짓는 여자
이지영 지음 / 지식공감 / 2021년 3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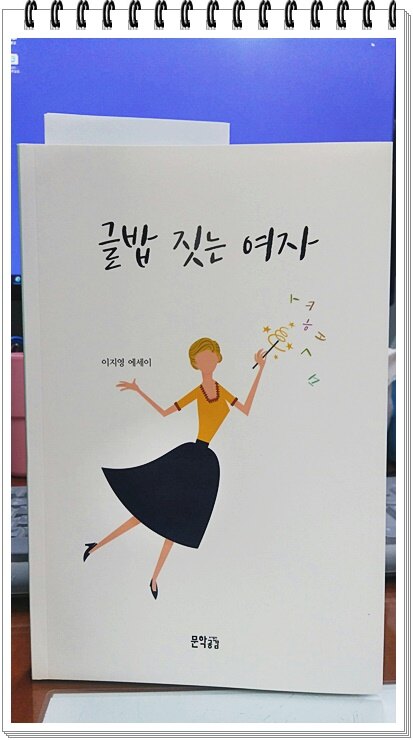
글밥 짓는 여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 글밥이란 단어가 익숙했다. ‘글밥이 많은 그림책’ 은 책에 들어 있는 글자의 수가 많다는 뜻이 그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글밥 짓는 여자>에서 막 날아가려는 것들을 붙잡아 글밥을 지었다고 했다. 여기서 글밥은 홀연히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퍼담아 먹을 수 있는 든든한 ‘양식’ 이었다. 내가 수필을 좋아하는 이유도 밥같이 익숙하고 친근해서다. 이지영 작가는 부디 온 우주를 통틀어 단 하나의 예술품인 ‘나’ 와 나의 삶이 활자와 더불어 아름답게 춤추기를 기원했다!
봄부터 겨울, 그리고 명상 이야기까지 더불어 계절감으로 나눈 일기 같은 수필이 저자의 삶을 오롯이 보여주는 것 같다. 아버님의 칠순 잔칫날 늙으신 부모님을 등에 업고 속 빈 강정같이 가벼운 느낌에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는 마음이 독자인 나도 느껴져서 슬퍼졌다. ‘그러니 부모님을 뵐 때마다 자식은 더욱 든든해져 갔고 그럴수록 늙으신 부모님은 텅 비어 울림통이 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문장이 와닿았다. 엄마랑 나는 키가 비슷했는데 어느 순간 엄마의 키가 줄어들어 있었다. 허리가 굽은 건 아니었는데 점점 왜소해져 가는 엄마의 모습에 울컥했다. 내 시선이 엄마를 내려다보는 것 자체가 슬펐다. 저자도 텅 빈 울림통 같은 부모님의 모습에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눈물겨운 자아 성찰> 이란 제목의 에세이에서 잘 익은 목화 다래를 키워본 에피소드가 소개되었다. 뿌리를 새싹으로 알고 하늘로 뻗쳐 놓은 채 목화가 매달리기를 바랐던, 자신의 확신과 선의가 어리석고 산 생명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는 성찰이 재밌기도 하고 나도 살면서 이런 오해는 없었나 생각해보게 되었다.
<네 마음속 어디까지 들어가 봤니?> 에선 해녀의 계급을 언급했다. 깊은 수심까지 들어가 작업이 가능한 해녀가 ‘상군’ 이라면 자기 키만큼의 곳에서 물질하는 해녀를 ‘눈질래기’ 라고 한단다. 계급이라고도 할 수 없는 계급 밖의 해녀인 셈. 해녀가 바닷속을 헤엄쳐 들어가듯 나도 나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을까? 내 마음속 심연까지 들어가면 저자의 말마따나 전복이나 소라같은 보물을 발견할 수 있을까? 난 아직 그런 경지엔 다다르지 못한 것 같다. 피상적이고 순간적인 감정에 일희일비하니 명경지수를 꿈꾸는 것은 머나먼 얘기 같다. 하지만 나를 들여다봄으로써 무언가를 이루어 내는 것보다 더 심오한 건 ‘나를 들여다보는 나를 볼 수 있다는 것’ 이라 하니 지루함도 못마땅함도 없어질 것이다. 저자의 포근한 글밥이 나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기분이 들어 행복해졌다. 글밥 한 그릇 잘 먹은 기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