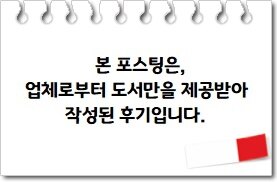-

-
뒤돌아보는 사람은 모두 지나온 사람 ㅣ 걷는사람 시인선 26
이돈형 지음 / 걷는사람 / 2020년 8월
평점 :




뒤돌아보는 사람은 모두 지나온 사람
시인은 영리하게 관찰하고 자신만의 언어로 그것을 풀어낼 줄 안다. 이돈형 시인도 그랬다. 앰뷸런스란 시에서 ‘대화를 듣는 것보다 하려는 의지가 강해 강동대교를 건널 땐 강물마저 출렁거렸다’는 문장이 눈에 확 꽂혔다. 앰뷸런스를 타고 가는 아침 풍경에서 말을 하려는 그가 시각적으로 출렁이는 물결처럼 어른거리며 어지러워 마치 입덧을 하는 것처럼 메스꺼웠다. 덜컹거리는 몸과 함께 얼마나 마음이 급했을까. 얼마 전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에게 영장이 신청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다. 사고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 살인을 검토했단다. 이 시를 읽으니 앰뷸런스의 삐뽀삐뽀, 누군가의 비켜비켜를 듣고 톨게이트를 빠져나오는 그 모습이 안쓰러워졌다.
‘모르는 것’ 이란 시에선 ‘웃어 보이려 해도 입꼬리만 올라가고 돌의 웃음같은 까마득한 웃음을 지을 수 없어’ 라는 문장을 보고 내 모습을 떠올렸다. 웃음이 어색할 때가 있었다. 웃기 싫은 날이었을지도 모른다. 내 마음은 얼어붙었는데 웃어야만 할땐 웃을 일이 없었음 좋겠다 싶었다. 시인은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에 수긍할수록 웃을 일이 없어 편하다고 했다. 아는 게 병이다. 맞다. 몰라도 되는 것에 알게 되어 우린 웃고 운다. 웃는 것마저 힘에 부칠 그때는, 그래서 부끄러워지면 시인과 같이 시치미를 떼보자. 이 시에서 무성이라는 말은 ‘잎이 잎에 닿을 수 없어서’ 이고 간절이란 말은 ‘입이 입에 닿을 수 없어서’였다. 내가 내게 닿을 수 없다면 다행일까?
유성호 문학평론가는 이돈형시인을 이렇게 평했다. 지나온 날들에 대한 스스로의 자긍과 위안, 새로운 도약의 의지를 담은 정서적 실감의 기록이라고. 얼마나 스스로의 삶을 꿰뚫어볼 수 있는가를, 이 시들을 통해 증명해보였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투과한 경험적 직접성이 발화의 대상이 되었다. 자신의 언어는 타인을 향한 절실함에서 생겨났음을 알리면서.
걷는 사람 시인선의 26번째 작, 이돈형 시인의 <뒤돌아보는 사람은 모두 지나온 사람>은 내가 겨우 두 번째 접한 시집이다. 23번째 김대호님의 <우리에겐 아직 설명이 필요하지>를 읽어봤었는데, 출판사 걷는 사람은 참신한 시인들의 작품을 잘 발굴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 가을이다. 가을은 시집이 필수인 계절. 이돈형 시인의 시집을 통해 시인 특유의 서늘한 충격을 맛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