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검찰수사관 내전 - 검찰수사관의 “13년 만에 쓰는 편지”
김태욱 지음 / 바이북스 / 2020년 5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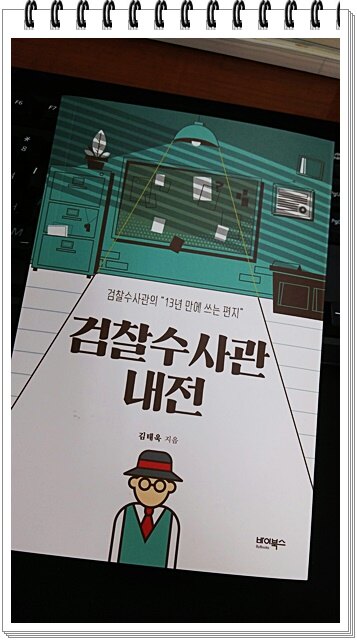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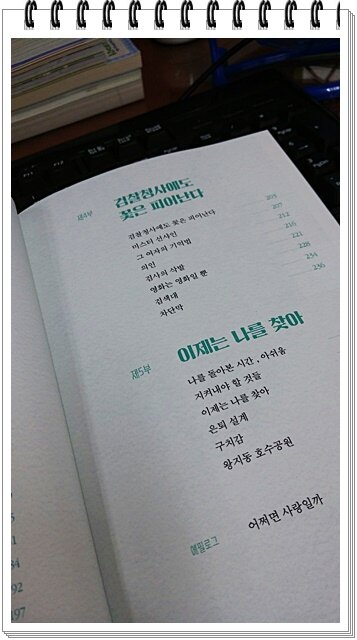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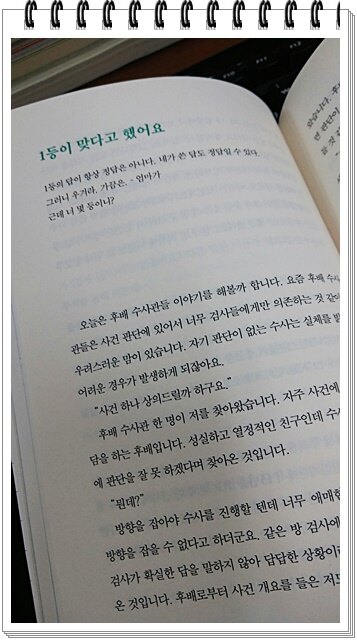
검찰수사관 내전
이번 서평도서가 반갑다. 저자의 책을 이미 한번 만난 적이 있어서다. 그땐 <어쩌다 검찰수사관>이라는 책으로써 검사실에서 하는 일, 사무국에서 하는 일 등이 적혀있어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관계가 궁금한, 검찰공무원 준비생의 필독서라 할만 했다. 하지만 이번 책은 13년 전 떠나신 직장상사(라 읽고 형님으로 부른다)에게 보내는 전상서의 형태의 에세이로 풀어써서 그런지 저자 김태욱님이 갖고 있는 현직 검찰수사관이라는 직업보단 브런치작가라고 소개된 단어가 더 눈에 들어왔다.
나도 법을 전공했고 검찰직을 준비했던 한 사람으로서 이루지 못한 직업에 대한 궁금증과 아쉬움이 아직도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어 이 책을 더욱 진지하고도 의미 있게 읽을 수 있었다. 저자 또한 검찰에 입사했던 시기의 이야기를 언급했다. 그도 역시 법대 출신이었고 거의 대부분이 시도해보는 사법시험 공부를 기웃거리고 있던 차에 우연히 검찰직 시험에 응시하여 만 27세의 젊은 나이에 입사하게 되었단다. 저자에게 차를 한잔 내주던 지청장이 ‘법대 출신이 왜 사시를 보지 않고 수사관으로 들어왔느냐’ 며 소금도 없는 염장을 질러댔을 때 부임 첫날부터 ‘검사가 될 걸 그랬나?’ 란 생각을 한동안 지울 수 없었단다. 벌써 30년이 흘렀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게 인생이라 그간 이 전상서의 주인공인 ‘형님’을 비롯하여 수많은 인연들이 너무 소중하기에 오르지 못한 지위 때문에 ‘나 돌아갈래!’를 외치고 싶지는 않다고. 저자는 마음 한구석에 뚫린 구멍정도는 스스로 막아낼 정도의 내공이 쌓였단다. 우리 부모님과 비슷한 연배기에 가능한 내공이겠지? 난 아직도 나 스스로에 대해 자괴감과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다. 원했던 직업을 갖기 못한 것에 대한 후회일까? 이곳에서도 난 비슷한 질문을 여러 번 받고 똑부러지게 대답을 못했다. 여전히 인사치레같은 그들의 질문이 부담스럽고 가슴을 찌른다.
<차별이 불만이면 검사를 하라>라는 제목도 와 닿았다. 인천으로 인사이동을 한 뒤 마련된 오찬 자리에서 기관장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해보라는 하교에, 동료 수사관이 “관사가 너무 좁고 열악하다”고 말했단다. 아뿔싸! 관사는 검사 이상에게 해당되는 표현이었고 직원들의 임시거처는 그냥 숙소라고 해야 맞았나보다. 기관장은 억양을 올려 “관사?” 라고 반문했고 눈치 없던 그 동료는 나름 최대한 공손하게 불만사항을 답했지만 기관장의 대답이 가관이었다. “그렇게 불만이면 검사로 들어오시지?” 숙소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할 판에 감히 불만이 웬말이냐였다. 충격적이었지만 핵심을 찌르는 당연한 말에 모두 할 말을 잃었다. 사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남보다 더 인정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아닌가. 도둑놈심보처럼 노력은 안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으려는 건 어불성설이겠지. 하지만 인정받는 결과를 얻지 못한 대다수는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인정받는 위치에 선 이들은 거기까지의 수고를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가 있고 자신이 처한 현재사오항만 생각하는 본인 위주의 심리가 작용한다. 여기 언급된 기관장처럼.
따뜻한 검사의 사례도 나와 있었다. 재소자들에게 8년간 100여 권의 책을 선물한 검사라든지 22개월 아기의 억울한 죽음을 수고로움을 다하여 발겨준 검사의 이야기. 지위라는 허울보단 인품으로 그릇을 가득 채운 그들의 선샤인이 재소자들의 어두운 과거를 닦아내기를 저자와 함께 기도해본다. 미스터 선샤인의 메인 포스터 삽입글처럼 그저 아무개지만 그 아무개들 모두의 이름이 의병인 것처럼 이변이 없는 한, 검사 외에 검찰청 직원들은 검찰의 역사 속에 한낱 이름 없는 병사, 아무개로 존재할 뿐이라고 자조하며 ‘아무개’ 로 존재하는 자신과 검찰청 아무개들의 생각, 열등감, 자존감, 그리고 주변이야기, 검찰의 세상을 편지글 형식으로 쓴 이 책에 왜 이리 공감가는 것일까. 내가 가보지 못한 세계를 이렇게 책으로 내준 저자에게 감사하다. 주목받지 않아도 진짜 검찰을 사랑하는 저자의 마음이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