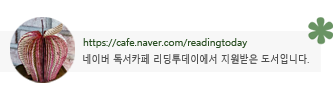-

-
빛의 공화국
안드레스 바르바 지음, 엄지영 옮김 / 현대문학 / 2021년 12월
평점 :

절판


"어떤 것이든 일단 믿기 시작하면 그 어떤 현실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주변의 도덕에 따라 행동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으로 본 것을 정말로 믿어도 된다는 걸까?"
독서 모임에서 토론하기 좋은 소설이다.
스페인어권 문학은 겨우 보르헤스라는 이름의 작가만 알뿐인 낯섦 그 자체다. 21세기 판 <파리대왕>이라는 띠지의 문구에 혹해서 읽기 시작했는데 윌리엄 골딩의 <파리대왕>과 무엇이 같고 다른지 읽어보자.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화자는 산크리스토발에서 사회복지과 직원으로 겪었던 20년 전에 발생했던 32명의 아이들의 죽음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자료들(회의록, 신문 칼럼, 기고문, 다큐멘터리 등)을 토대로 회상하기 시작한다.
찔끔찔끔 모여들기 시작한 아이들은 어느덧 32명까지 확장되었다. 그들은 그들만의 언어로 대화를 하고, 저녁이면 도시의 거리에서 사라지곤 했다. 서너 명씩 몰려다니면서 구걸을 하기 시작한 아이들은 급기야 도둑질을 하기 시작했고, 도시의 어른들은 그 아이들을 골칫거리로 취급하기 시작하면서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고 정치인들은 고아원 예산을 늘린다는 어이없는 정책만 늘어놓기 바쁘다. 어느 나라나 정치인들은 다 똑같은 모양이다.
그 아이들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먹는지 어디서 자는지는 일도 관심이 없다가 그 아이들이 총을 훔치려다 경찰관 1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고, 슈퍼마켓에서 난동을 부리고 사람들이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하고 난 후에 그 아이들이 증발한 것처럼 한순간에 보이지 않게 되자, 그제서야 경찰들은 밀림으로 아이들을 찾아 나서게 된다.
우두머리가 없는 아이들의 행동은 즐거운 놀이처럼 보였다. 어른들의 질서에 길들여지고 있는 도시의 아이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모습이었다. 다만 가진 것이 없었고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구걸하다가 훔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을 보고 있던 어른들은 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일까?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못 본 것처럼 피해 다닌 것이리라. 어른으로서 실격이다. 자신들이 피해를 입고 자신들의 아이들이 실종되는 일이 발생하니까 그제서야 자신의 일이 된 것이다. 너무 부끄럽다. 나도 그들과 다르지 않음을 인정하게 만들었고, 어른인 나를 너무 부끄럽게 만들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이 헤로니모는 밀림에서 구출된 것일까? 도시의 어른들이 납치한 것일까? 다른 아이들이 있는 곳을 알아내기 위해서 40시간을 재우지 않고 고문하는 모습은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달려가는 비겁한 어른의 모습이었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잣대로 세상을 보는 모습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벌어졌던 인디언 학살과 아즈텍 문명의 멸망과 선이 닿아 있다고 생각된다.
왜 윌리엄 골딩의 <파리대왕>과 비교를 했던 것일까? 어른과 아이들의 충돌 때문인지, 문명 대 문명의 충돌 때문인지, 밀림도 아닌 하수구 속에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빛의 공화국에 대한 찬사로 그런 말을 한 것인지 여전히 나는 아직 모르겠다.
"즉 도와달라는 간절한 요청이었다. (···) 아이들의 세계는 어른들과 전혀 다르다. 오히려 약자가 위협하고, 강한 자는 꼼짝도 않는다."
사족
뱀에게 물려서 죽은 여자아이의 시신은 엄마 배 속의 아기처럼 웅크려 있었다는 모습은 나스카 라인(사막에 그려진 새, 거미 등의 그림)으로 유명한 나스카 문명의 무덤 양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