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춥고 더운 우리 집>
공선옥 작가님의 집에 대한 생각이
담겨있는 책인 줄 알았는데,
읽고 보니 공선옥 작가님의 인생, 가치관이
담긴 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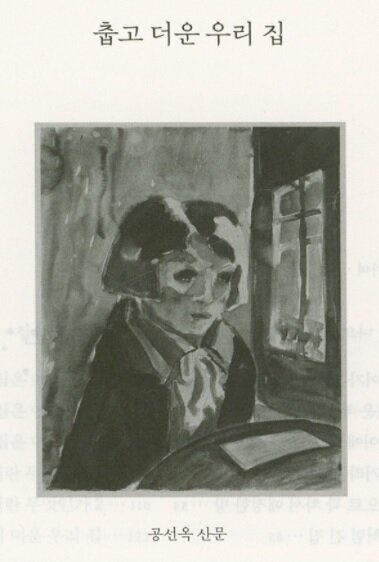
집을 소재로 자신의 인생을
쭉 뽑아낸 이야기에 공감하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의문도 가지면서 읽어나갔다.
총 3부로 구성된 이 책은
1부에서는 집을 중심으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2부에서는 자신의 집을 찾는 과정을,
3부에서는 인생에서 집의 의미를
밥과 연결해 풀어내고 있다.
은근히 공통점이 많았기에
읽기가 더 수월했던 것 같다.
전라남도 출생이며
시골마을에서 자란 어린 시절이 비슷하고,
이른 아버지의 죽음,
임대주택에서의 생활들이
나의 추억과 겹쳐져
눈앞에 생생한 장면으로 펼쳐졌다.
광주가 가장 가까운 도시였던 나도,
책을 읽으면서
휴일이나 특별한 날이면
버스 타고 친구들이랑
광주 충장로, 금남로 시내에
놀러나가던 기억이 나서
애틋해지고 그리워지기도 했다.
70년대 시작에 태어난 남편과
70년대 끝에 태어난 내가
공유하는 추억도 신기했는데,
60년대 태어난 공선옥 작가님과
동향에서 자라서
비슷한 기억들이 있다는 게
재밌기도 하고
사람살이가 다 비슷한 건가 싶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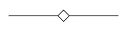
북향집을 시작으로 시작된
집에 대한 기억은
담양 수북, 석 달 열흘간 뚜덕뚜덕 지은
집까지 이어진다.
세상의 온갖 집들이 다 나오는 것을 보니,
이곳저곳 많이 떠돌아 사셨던 것 같다.
변소 위에 걸린 시렁에
닭둥우리를 올려놓아
동네 엄마가 달걀을 훔쳐 가기도 하고
구렁이가 달걀을 깨물어 먹던
첫 번째 북향집을 뒤로하고,
아버지가 지은
'부로꾸집'=블록집으로 이사한다.
이 집은 공선옥 작가님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지만,
사랑한다. 그리고 미워한다.
그 깊은 애증의 감정은
집에게도 감정을 부여한다.
인격을 부여한다.
말을 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한다는 집.
그렇게 큰 의미로 다가온
아버지가 지은 첫 집
'부로꾸집'이다.
집을 이런 애정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다니,
신기할 뿐이다.
요즘 집에 대한 관점, 논점은
집값, 인테리어, 편의시설 인프라인데,
집이 감정을 가지고
말을 건다니
괜스레 우리 집도 이곳저곳 눈여겨 살펴보게 된다.
너는 우리 가족에게 무슨 말을 건네고 있니?
작가님에게 아버지는 단편적인 기억이다.
계속 객지로 나가 일을 하시고
한 번씩 돌아오시면
집을 짓거나
농사를 짓거나
일을 벌이고 떠나버리는 존재이다.
자신의 소원대로 집을 짓지만,
항상 정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나
온 동네 하수가 쏟아지는 집이거나,
비 오는 날이면 아궁이에 물이 고여
퍼내야 하는 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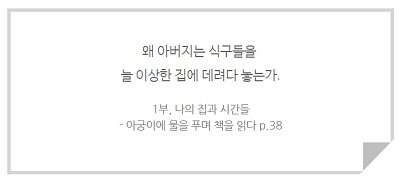
남들처럼 입식 부엌에
기름보일러를 놓는 것이 꿈이었던
아버지는 끝내 꿈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기 위해
떠난 두 번째 '부로꾸집'을 끝으로
그렇게 고향 집 시절은 끝이 났다.
고등학교 시절 지냈던 식당 방,
서울 용산 여자 속옷 공장 기숙사를 거쳐
다시 광주 자취방(식당 방)으로 돌아오면서
다들 잘 적응해서 살아가는 데
자신만 아닌 것 같아 자책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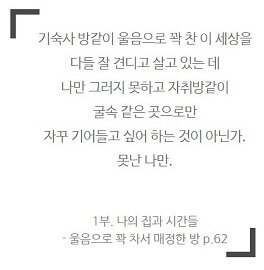
책을 좋아하는 소녀가
척박한 세상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나가
평범하고 솔직한 이들의 시샘을 받으며
눈치도 챙기게 되고
남몰래 흘렸을 눈물이 많았으리라.
한껏 꾸미고 놀면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이들도 있고,
작가님처럼 책을 통해
위안을 얻는 이들도 있을 텐데
자신과는 다른 이가 부러우면서도
미웠으리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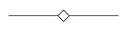
내게 내 집이란 어떤 집인가.
어디로 떠나도 언제고 돌아올 수 있는 집.
나와 오랜 세월을 함께한 내 물건들이 편히 자리 잡고 있는 공간.
그럼, 나에게 내 집이란 어떤 집인가?
책을 읽으면서 계속 생각해 봤는데
내 집은 우리 가족이랑 함께 웃고 울며,
떠들고 자며,
먹고 마시는 공간이다.
우리들의 역사가 새겨진 집이
내 집이면 좋겠다.
작가님 말씀처럼
우리네 어린 시절 집처럼,
할머니 할아버지 댁처럼,
보물창고요
역사가 되는 집이
우리 집이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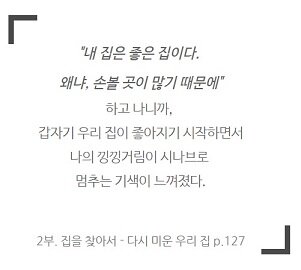
하하하,
우리 집도 좋은 집이 되었다.
손볼 곳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집을 ?? 사랑해봐야겠다.
시간을 두고 사람을 사귀듯,
집도 하나하나 고쳐가고
바꿔가면서 정을 나누고
우리 가족을 익히게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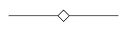
<3부. 밥이나 집이나 한 가지로>는
수북에 자리 잡은 후,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냈다.
생생한 표현들과 현실적인 대사가
인상적인 챕터이다.
우리네 어머니들의 푸근함과 아늑함이
가득한 이야기들이라
책을 읽는 중
가장 따스함을 느끼며 읽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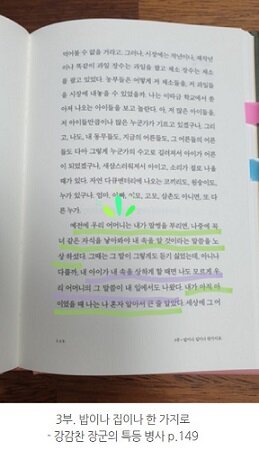
정말이지 내 마음이다.
나는 나 스스로 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절로 크는 것은 없다.
내가 내 자식을 낳아 키워보니
이제서야 부모님의 은공을 깨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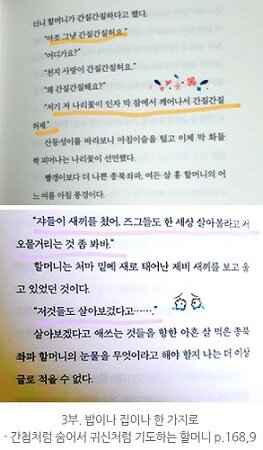
3부 중 <말의 온기> 챕터가 기억에 남는다.
작가님의 아버님은 신발을
아궁이 불에 대고
따뜻하게 데워주셨는데,
이를 신발을 구워준다고 생각했다.
그랬던 아버지에게
육성회비 고지서를 들이밀자,
"돈 없따아, 이놈아"
하셨다 한다.
그 단단하고 차가운 한마디 이후
아버지가 백날 신발을 구워주신다 한들,
그 신발의 따뜻함을 느낄 수 없게 되었다.
이 역시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
이해가 된다.
고달프면서도 그득하고 뿌듯한,
그 마음이 담긴 말 한마디였다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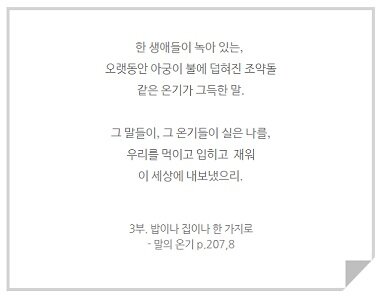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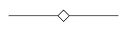
책을 읽으면서 '집'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다.
'의식주' 라 칭하며
살아가는데 중요한 부분이라 배우며 자랐건만
그 격차들이 커지고 있다.
옷도 추위를 막아주는 기능에서
자신을 표현해는 매개체로,
식사도 영양분을 공급해 성장하게 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역할에서
미각을 자극하고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영역으로,
집도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가족들이 모여
식사하고 눈 마주치며 얘기 나누고
지친 몸을 뉠 수 있는 보금자리에서
삶의 성공 척도, 평균을 알 수 있는 기준이거나,
돈을 투자하는 대상으로
변모하고 있다.
그래서 예전의 가치관으로
의식주를 대하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특히 집은 그 격차가 엄청나서 파장이 크다.
부동산 정책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그에 따른 사람들의 반응, 대응도 격렬한 것을 지켜보면서
씁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집을 보금자리가 아니라,
돈으로 바라보는 세상이라
집값에 따라 요동치는 감정 기복.
나 또한 집값에 무심할 수는 없지만,
내 집값이 오르면, 또 다른 집들도 오르니
매양 똑같지 않나 싶다.
살 곳이 필요한 우리는 살고 있는 집을 팔더라도
또다시 집을 사거나 빌려서 살아야 하니 말이다.
너무 바쁘게 흘러가는 우리네 인생이
집도 자꾸 바꾸게 만드는 건 아닌가 싶다.
예전에는 한곳에 정착해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웃들과 함께 채워갔지만,
지금은 필요한 부분들이 채워진 곳에
내가 가면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아쉬움이 없고, 간절함이 없는 것 같다.
공선옥 작가님은 <춥고 더운 우리 집>을 통해
너무 빠르게, 간편하게 살아가려는 현대인들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마음가짐을
일깨워주시고자 한 것 같다.
수북에서 호미를 든 작가님의 모습이 그려진다.
버스 타고 장에 들러 온갖 유혹을 물리치고
필요한 것들을 손에 들고 돌아오는 모습이 그려진다.
참 따뜻하다.
<한겨레출판사에서 제공받아 작성한 서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