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잘 쓴 이혼일지 - 지극히 사적인 이별 바이블
이휘 지음 / 21세기북스 / 2024년 9월
평점 : 



안 만나봤으니 정의롭고 다정하다는 작가 소개 글은 모르겠고 방송 작가 이휘, 그가 꿈꾼다는 울창한 미래는 궁금하다. <노는 언니>, <섬총사> 등 참여한 15년 차 예능 작가이며 브런치에 글을 쓴다.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굿파트너> 열혈 애청자였다. 그 세계를 잘 모르니 신선했다. 극중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잘 하기 위해 이혼을 선택해야 한다는 대사가 와닿기도 했고. 사람들은 끝보다는 시작에 좀 더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가.
아직까지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무슨 일지까지 쓰냐, 싶었다. 그렇게 어수선했을 감정들을 복기하면서 헤어짐을 복기하는 이혼이 '왜'가 아니라 '어떻게'라는 게 당최 헤아려지지 않았다.
이 지구상에서 사람은 지긋지긋하게 많고 그 중에 눈에서 스파크가 튀고 귓가에 종이 울리고 주체할 수 없는 감정 호르몬이 롤러코스터를 타게 만드는 딱 한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겠다는 결심은 어쩌면 판타지가 아닐까.
그런데 이 판타스틱 한 결심을 끝내는 데에 어떻게 '왜'가 중요하지 않을까?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왜(이유)를 알아야 어떻게(정리)가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그는 그런 판타지를 끝내는 과정에서 겪었던 감정들을 이혼 결심 전과 후 그리고 현재로 나누어 기록했다고 했다.
그의 이혼할 결심, 그러니까 AD 7일을 읽다가 생각이 아내까지 이어졌다. 그가 한 결심인데 마치 아내도 그가 했던 결심처럼 망설이는 건 아닐까 하고 괜히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혹시 아내는 23년 중 얼마큼 후회하고 있을까.
가정법원을 들락거릴 만큼 소원하던 '이제 니들은 남이야'라는 끝을 허락 받는다. '부부는 등 돌리면 남이다'라는 명제를 비로소 확인하는 시원함에도 여전히 룸메처럼 동거로 서로의 감정을 갉아 먹는 관계로 유지하는 게 어이없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가 '돈' 몇 푼이 없었다는 게 궁색했다. 딸라빚을 내서라도 '남'이 되는 게 자연스럽지 않았을까. 도무지 내 깜냥으론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는 한편 이혼이라는 사회, 주변, 가족의 시선에 부담을 느끼며 자기검열에 매진하는 그가 그려졌다. 그렇게 아파한 그의 시간이 필름처럼 순서대로 느껴져 수많은 감정이 공감으로 수렴된다. 그래서 이혼은 위로와 축하 어느 것이 적절한지 궁금했다.

78쪽, 이혼 후 2개월 만에 받은 전화
결혼을 팀플로 기막히게 풀어낸 그의 표현력에 감탄했다. 팀플을 할 때마다 분노 게이지 버튼을 참아내야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과제였던 걸 생각하면 결혼 생활과 팀플이 닮았다는 걸 깨닫고 웃었다. 그 기분이 십분 이해돼버렸다.
근데 지옥 같던 그가 팀플의 끝에서조차도 가졌던 그의 다정함이, 쭉 그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불쌍이라거나 안쓰럽다거나 하는 감정에 호소할 의도는 없었겠지만 마음이 그렇게 된다. 술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복도에 누워있는 아내를 사진 찍어 놀리는 인간이라니 가족 요금을 쓰지 않을 결심은 아주 잘했다, 칭찬해 주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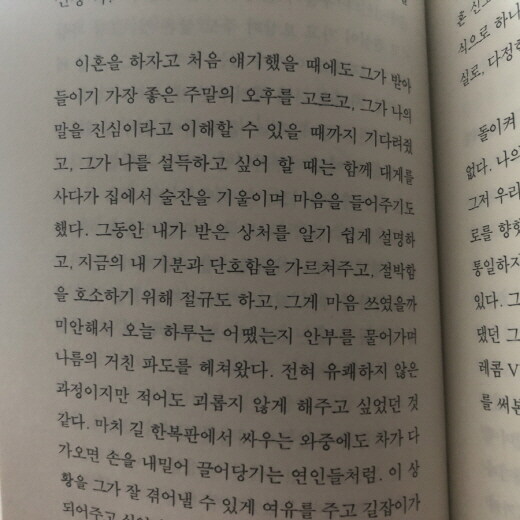
108쪽, 다정한 사람이 이혼하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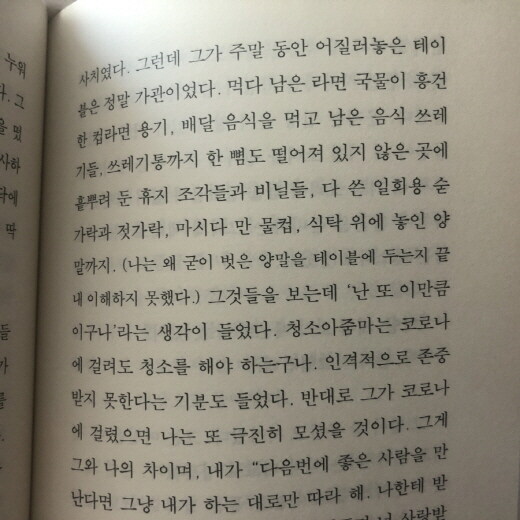
115쪽,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면
뚜껑 하나 제대로 닫지 못하는 그의 남편의 무심함이 나와 데칼코마니라는 게 저릿했다. 나도 손 많이 가는 남자라고 아내에게 핀잔을 듣곤 한다.
습관적 태도를 포기하는 수순이 '사람 안 변한다'거나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일 텐데 사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 대부분은 알면서도 귀찮음에서 오는 '미루는 것'이라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변하거나 고쳐 쓸 수 있다. 상대를 생각하면 당연히 그러해야 할 테고.
나는 아내와 23년을 살면서 한 번도 뚜껑 좀 제대로 닫으라는 말은 들어보지 않았다. 하지만 세수나 양치하면서 거울에 남긴 흔적은 한 번도 닦아 보지 않아서 그의 지적에는 찔끔거릴 수밖에 없다. 오늘부터는 의식하고 제대로 닫고 닦을 결심을 한다. 아내도 늘 빡침으로 뚜껑이 열렸었을지.
책장은 끝을 향해가는데 꿀꿀한 기분은 영 좋아질 기미가 없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 초록은 여전할 텐데 덩달아 그의 감정이 길고 질기게 되살아날 것 같아서 그럴 거면 그냥 커플컵을 쭈욱 계속 같이 쓰는 게 낫지 않겠냐고 질질대는 그에게 따끔하게 말해주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트리플 티라서, 또 이혼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절대 알 수 없는 감정들이지만 트리플 에프인 그가 깔끔하게 감정을 털어낼 수 있을지 염려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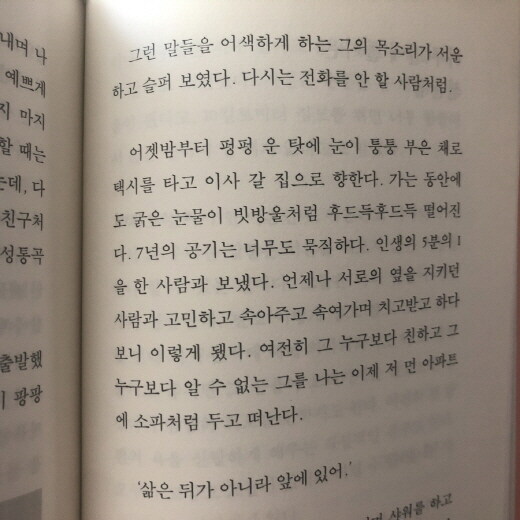
191쪽, 이사하는 날, '두고 감'
"만나면 하나같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자 노력한다."라는 그의 말을 곱씹고 있다. 결혼이나 사랑에 관한 정의 같은 게 넘쳐나는 세상이라서 나까지 보탤 필요는 없지만 은근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느낌이 들어서, 굳이 노력하는 게 느껴지는 사람과 만날 필요가 있나 싶다.
노력은 결과를 얻으면 더 이상 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탓에 7년의 마음 부침이 있었으니 따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끌리는 사람을 만나면 어떨까 싶은 오지랖이 발동해 버렸다. 긴 방학, 뭐 어련히 알아서 잘할 테지만.
이혼이 '결별'이 아니라 '이별'이라는 것을 알려주겠다고 고집부리는 것 같은 그의 지난한 이혼 이야기가 답답하기도 했다. 한데 방송국을 오랜 시간 들락거릴 정도의 필력을 지닌 깜냥이 있는 터라 책장이 술도 없이 너무 술술 넘겨지는 통에 순삭이 뭔지 실감 나게 하는 책이다.
이혼을 앞두고 있거나 하루 25시간 이혼 생각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이 이 책을 읽고 나면 이혼할 결심을 잠시 미뤄둘지 모르겠다는 생각 들었다. 그의 이혼은 결코 시원하지 않고 질퍽한 늪에 빠진 기분이랄까.
그럼에도 필력 탄탄한 방송작가인 그의 트리플 에프적인 이혼이 궁금하다면 강추한다.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완독 후 솔직하게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