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내 마음은 바다에 있어 - 이별의 계절, 긴 터널을 지나는 당신에게
오지영 지음 / 북노마드 / 2024년 11월
평점 :




작가 오지영은 무엇이든 남기고 싶어 쓰고, <아픔이 내가 된다는 것>을 썼다. 표지를 보고 '이별'에 대한 이야기인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지 궁금했다. 양양의 바다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바다가 그리울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사랑이든 이별이든 끝이 있는 터널이면 좋겠다. 길든 짧든, 힘겹든 아니면 그 반대였든. 그건 그렇고 제목이 감성이 마구마구 터진다.
"모든 것을 함께 나누다가 끝내는 모든 것을 둘로 나누게 된다는." 43쪽, 민
소설이었구나. 등장 인물을 상상하면서 몇몇 이름 모를 배우의 이미지가 떠올리는 기분이 좋다. 드라마여도 좋겠다. '민'의 말에서 지독한 사랑 이야기면서 동시에 이별 이야기임을 알아챘다. 그리고 좀 먹먹해졌다.
또, 희나의 말이 많이 아렸다. "돌이키지 못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해결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어쩌면 우린 해결하지 못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터널 속을 헤매는 것은 아닌지.
"다들 요동치는데 밖에서는 안 보이는 거겠지. 웃을 때 웃고, 울 때 울고, 사랑할 때 사랑하다 보면 닻이 하나하나 생기지 않을까. 파도가 쳐도 덜 흔들리고 덜 슬픈 날이 오지 않을까.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해." 81쪽, 새봄
희나가 새봄에게 했지만 자조적인 이 말이 이별이 한편으로는 가슴 한쪽을 도려낼 만큼의 상실이라는 것을 새삼 실감한다.
"사랑은 그런 거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라고 쥐여주면 나도 갑자기 좋아지는, 그런 거니까." 98쪽, 민
또, '민'의 이야기는 이별이면서도 사랑이기도 한, 아니 그 반댄가? 어쨌든 그리움에 잔뜩 취하게 만든다. 피천득의 <인연>이 '준'에게서 민에게로 그리고 잊었던 내게로 온 느낌이 들었다. 그 세 번째가 내게도 있었을까. 그런데 아니 만나야 했을 만남도 인연이라면 기억해야 할 그런 인연일 수 있을까. 역시 사랑은 어렵다.
또, "소중하지 않은 것 때문에 소중한 것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지안의 말을 여러 번 곱씹는다. 정확히는 서른이 넘었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말이 그랬다. 그러면 일은 소중하지 않은 걸까. 오십이 넘으니 다른 어떤 것보다 일이 소중한데. 그걸 미처 몰랐는데. 삶은 여러 방향이 있겠지만 정작 자신은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걸 이른 퇴사를 하고 알았다. 괜히 지안과 같은 처지여서 울컥했다.
이별 이야기만 있다면 그런 끝난 아픔만 있다면 아쉬웠을 것이다. 그런데 새봄이 다시 사랑을 시작해서, 지안이 새롭게 자신을 찾는 것도, 민이 준의 '밥 먹었냐'라는 안부를 다시 기억해 낸 것도 다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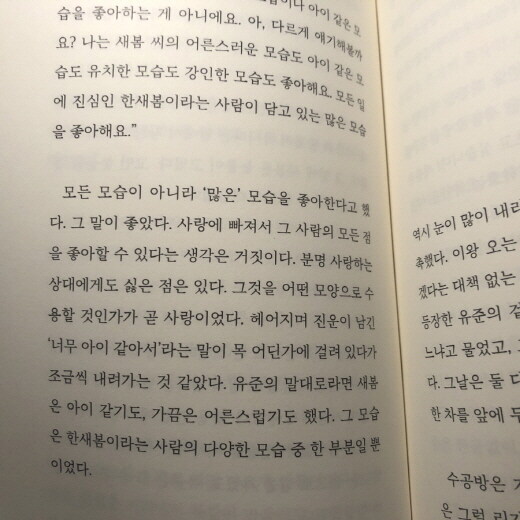
152쪽, 다시, 새봄
잡자마자 단숨에 읽었다. "서투르지 않은 것은 사랑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희나가 말했다. 공감하지 않을 수 있을까. 사랑이 능숙해지면 우린 이별을 예감할 테니 말이다.
각 인물에 빙의하면서 겪지도 않은 이별에 아파하고 기억조차 나지 않는 사랑을 뒤적거리면서 가슴을 조였다. 책장 마지막, 작가가 실어 온 바다를 보니 가본적 없는 그곳에 마치 서있는 것 같았다. 이별을 하지 않았어도 위로받았다.
아무튼 천성이 게을러 알 수 없지만 가능하다면 필사하고 싶은 책이다. 이렇게 쓰고 싶을 만큼 좋았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