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소영의 해방 - 너머의 미술 ㅣ 우리의 자리
박소영 지음 / 편않 / 2024년 9월
평점 :




언론·출판 종사자가 자신의 철학이나 경험, 지식, 제언 등을 이야기 해보자는 출판사 ‘편않’에서 기획한 <우리의 자리> 두번 째 책. 현대 미술의 감상을 너머 비평 어디쯤을 문화부 기자의 시선으로 담았다.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모든 예술을 아낀다는 저자 박소영은 문화부 기자임과 동시에 동물 구조 활동가다. <살리는 일: 동물권 에세이>와 <청소년 비건의 세계: 동물을 먹지 않는 삶이 주는 곤경과 긍지 그리고 기쁨에 대하여>를 썼다.
나는 저자의 이력이나 미술보다는 ‘해방’이란 단어에 꽂혔다. ‘해방’의 사전적 정의는 ‘구속이나 억압, 부담 따위에서 벗어나게 함‘이다. 나는 해방이 필요한 걸까? 얼마간 울컥해서 시작한다.
시작은 현대 미술이 ‘돈’ 잔치를 앞세운 자본주의의 생리라는 점을 단전부터 끓어 오르는 문제의식으로 견지하면서도 솔직한 비평은 속으로 삼켜야 하는 미술 기자로서 울분을 토하는 듯하다.
덧붙여 그런 애매한 위치가 문제의식을 키우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의식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애매한 위치를 만드는 것인지에 대한 헷갈림을 토로한다. 한데 미술작품 감상을 가뭄에 콩 나듯, 아니 사실 즐겨 하지 않는 나로서는 그가 견지하는 현대 미술과 작가가 성찰해야 하는 문제 의식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그 연장선으로 ‘마우리치오 카텔란’이란 생경한 작가에 대한 글을 보면서 ‘악동’이 붙은 거의 모든 인물들은 얼마간 문제적 경향을 띠면서도 천재성으로 포장되어 용인하는 건 아닌지로 생각이 미치는데 저자의 글을 보면 카텔란 역시 그런 의미로 포장되고 있어 보인다.
나아가 미술사에서 동물이 이용된 관행과 통념, 즉 동물은 인간에 비해 열등하므로 인간의 목적을 위해 이용될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한 지적은 놀랍다. 적어도 그렇게 의식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고, 특히 제주도에서 본 이중섭의 <황소>는 위압감을 느낄 정도로 붉은 생명력이 느껴졌었다. 저자의 시선으로 본다면 이중섭 역시 황소를 통해 인간의 생명력을 표현하는데 이용한다고 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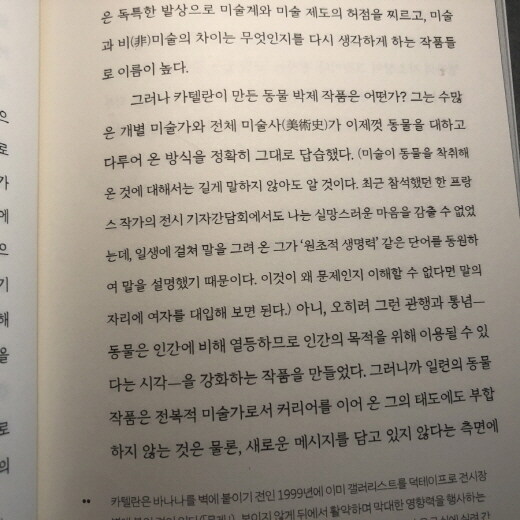
31쪽, 기자 vs 애호가
눈이 번쩍 뜨일 만큼 멋들어진 문장이 있다. 미학에 대한 정의인데 철학자 자크 랑시에르가 했던 ‘미학은 곧 정치’라는 말을 그의 언어로 저자는 이렇게 표현한다.
“미학이란 감각적인 것의 나눔, 즉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감각 지각의 틈새를 벌리는 일이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게 함으로써 현실을 제대로 가시화하는 일. 이때 미학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은 더 이상 구별되지 않는다.” 51쪽, 나는 왜 문화부 기자가 되었나
‘감각의 틈새’를 벌리는 일이라니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슴이 덜컹거렸다. 미술을 포함한 모든 예술적 자질은 털끝만큼도 없는 주제인데도 저자가 극찬한 ‘시오타 치하루’의 작품을, 빨간 실이 '내리는 것' 같다던 <영혼의 떨림>을 찾아 보고나니 그럴 수밖에 없었달까.
또 한 대목, 민중미술 작가에서 자연주의 작가를 표방한 임옥상 작가의 작품에서는 그는 이렇게 사유한다.
"삶에서 나오지 않은 것으로는 보는 사람을 결코 울릴 수 없다는 것. 나는 이것이 예술의 위대한 측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68쪽,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
옳다. 속내를 말하자면, 글을 쓰고 싶다는 소망을 갖고 나서 글을 쓸 수 없다는 것은 내 이야기를 삶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보는 사람에게 들려 주려는 이야기로 포장되는 순간을 마주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저자의 단언에 가까운 사유의 글이 공감되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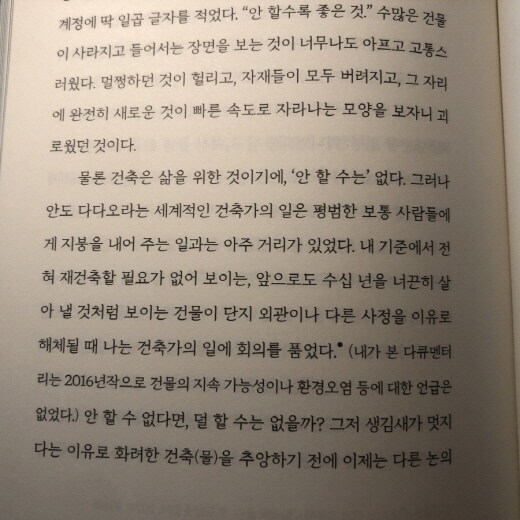
96쪽, 당신은 어디에 있는가? 1
나는 솔직히 책에 등장하는 미술가나 건축가들을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의 작품이나 사상을 저자가 견지하는 대로 의존하게 되는 것은, 예를 들면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건물을 보면 감탄했던 것과는 다른 저자의 평가에 동의하게 되는 것은 내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되는 것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매 순간 세상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작품들이 세상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날카롭게 질문할 수 있느냐에 대한 기자로서 스스로의 성찰적 고백처럼 느껴져 그 진정성이 오랫동안 울림이 있다.
얇지만 거대한 질문을 던지는 책이다.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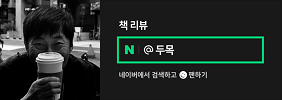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