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학준의 주변 - 끊임없이 멀어지며 가라앉기 ㅣ 우리의 자리
오학준 지음 / 편않 / 2024년 6월
평점 :




나는 책을 읽을 땐 목차를 그다지 눈여겨 읽지 않는데 요상하게 이 책은 그러질 못했다. 그러다 심상치 않은 '펺집자'란 단어를 보았다. 오탄가? 싶었다가 뒤에 이어진 코멘터리를 보고 편집자가 꽤나 마음 부침이 있었나 보다 했다. 역시 요상한 책이다.
몰랐다. 이 요상한 책이 방송 PD의, 그것도 교양국 PD의 생존 분투기였다다는 걸. 그럼에도 그의 분투기에서 내 의지가 덩달아 꿈틀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말한 '밥벌이는 신성하다'라는 선언과 그 신성함을 몰라본 죄로 정수리 벗겨질 정도로 뜨거운 날들에도 오한이 들 정도로 추위에 떨고 있으면서 '매일같이 출근하고, 매일같이 실종되'던 그날이 차라리 좋았다며 곱씹고 있는 나날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아흑.
저자가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영화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에서 다카하시가 목이 졸릴 때, 자신의 목에도 손자국이 남는 듯했다고 한 문장에서 나 역시 저자처럼 숨이 막혀 얼굴이 벌겋게 달아 오르는 것 같았다.
부당한 대접이나 지시 혹은 모멸감을 견디지 못하고 사라진 동료들을 보면서도, 그래도 버티는 게 이기는 것이고 상책이라는 세뇌로 스스로 최면을 걸면서 침묵했던 시간들이 다카하시의 목을 조이던 손아귀의 힘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했다. 방송국이나 복지관이나, 저널리즘이나 이타심이 사라진 건 별반 다를 게 없다.
그가 다큐에 진심인, 그래서 방송사 면접에서 방송사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다들 떠드는 것이이라 말할 때 잘 듣는 것이라고 그렇게 세상에 존재하는 그렇지만 잘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전파해 주어야 한다'라고 대답했다는 그의 말이 단전에서 울컥한 것이 묵직하게 치밀어 올라 목구멍을 틀어막았다. 나는 사회복지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사회가 정한 계급에서 얼마간 비켜나 있는 장애인들을 대신해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장애인식개선’이란 그럴 듯한 포장지를 씌워 여기저기 강연 비슷한 교육을 수년 간 다니고 있는데 머리 속에서 거대한 징소리가 울렸다. 나는 그들의 목소리를 낸다면서 정작 그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은 적이 있던가 반문하면서 많이 부끄러웠다. 나의 호흡은 짧아도 너무 짧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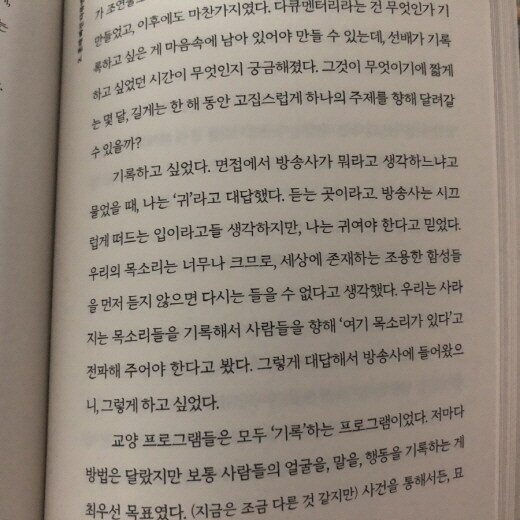
39쪽, 보여 주고 싶은 마음
'거짓'과 '비진실'의 경계에서 어느 것이 도덕적 의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반론과 그런 일에서 '내게는 합리적인 것들이, 타인에게는 불합리한 것이 될 때' 우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욱신거렸다. 불편한 '진실'은 어디에나 있고, 우린 어떤 질문을 해야 하고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알아내야 하고 결심해야 한다.
"인간은 기억의 주체가 아니다. 기억은 인간의 의지와 다짐을 무시하고 불현듯 밀고 들어온다." 118쪽, 팝니다: 타인의 고통, 공감한 적 없음
사람의 고통스러운 기억에 대해 카메라를 들이대야 하는 '작업'이 갖는 폭력적 딜레마를 이야기 하는 그를 궁금해 하고 있다. 그가 가진 사람에 대한 성정이 부럽고 한편으로는 그러지 못한 나를 부끄러워한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타인에 대한 이해는 ‘자신의 인식과는 별개로 존재하고 그 낯선 ‘다름’을 수용하지 못하는 자신의 편협함을 탓해야 한다’라는 그의 지적은 편견에 휘둘리는 장애에 관련한 인식을 변화시켜 보려는 시도를 해오고 있는 나로서는 오랫동안 가슴에서 맴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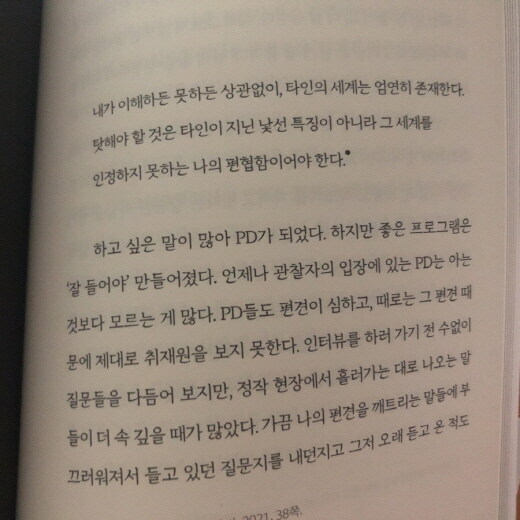
179쪽, 얼렁뚱땅 역지사지
반가웠다. ‘멸종된’ 줄 알았다던 종족이 여기에도 한 명 있다고 번쩍 손이라도 들고 싶었다. 이제 숨 좀 쉬어 보겠다며 책방 속으로 숨어드는 사람의 냄새가 나는 듯했다. 그 퀴퀴한 종이 냄새에 취하는 게 행복한, 그런 책방에서 안도하는 내 모습이 겹쳐져 한참 가슴이 뻐근했다. 그가 기억하는 책방에 숨어드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내 모습도 있길 바랐다. 그렇게 길을 잃은 그에게서 나는 길을 찾으려 애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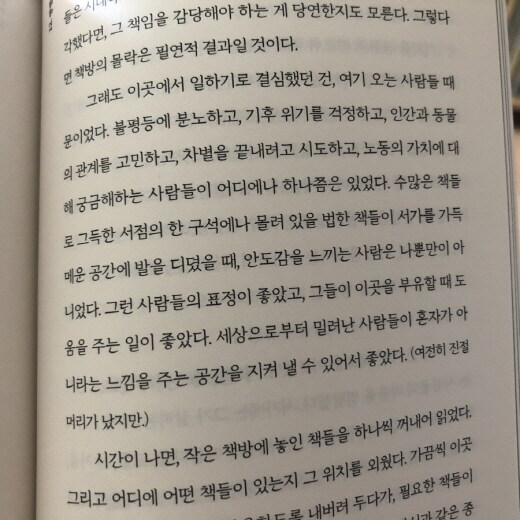
223쪽, 방황 PD
그의 새로운 콘텐츠 제작에 대한 고뇌와 딜레마를 공감하면서도 ‘무플’보다는 ‘악플’이 낫지 않겠냐는 자기 체념적 말을 곱씹으면서 결국 아니다 싶었다. 그도 표현한 ‘콘텐츠의 내용이 어떤지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거나, 상대방이 그 말에 상처받는 모습을 즐기’려는 인간들의 존재를 경험해 봤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악플’보다는 ‘무플’이 낫다는 기조를 아주 오랫동안 유지한다.
“주변부에 있다는 것은 경계와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깥도 안도 아닌 애매한 자리, 하지만 그렇기에 고유한 시선이 깃들 수 있는 자리를 자의든 타의든 대부분은 경험하기 마련이다. 우리는 대부분 비슷하게 잘나거나 못났고, 특별한 몇몇을 제외하면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에서 중심을 바라보는 삶을 산다. 주변부에 오래 거주하면서도 끝내 중심부로 들어가기 위해 중심의 시선을 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어쩌면 우리가 오래 머물러야 하는 곳이 우리의 자리라고 받아 들이고, 이곳에서만 보이는 풍경을 정교하게 묘사하는 쪽이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272쪽, 그래서 뭘 말하고 싶었냐면…
모든 사람이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에 오래 머무르는 게 인생이라는 그의 말이 얼마간 서글픔을 준다. 최소한 내게는 그랬다. 12년의 사회복지현장에 있으면서 매번 벽에 부딪쳤고 그때마다 내가 여기서 뭘하고 았을까,라고 자문하던 시간이 그의 부침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마음에서 위로 받는다. 이 책을 조금 일찍 만났더라면, 그랬다면 어쩌면 퇴사보다는 주변부에서 좀 더 버텨보는 삶을 선택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서툴렀던 내 선택은 생각보다 심한 정신적 육체적 부침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항상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다가 시한폭탄과도 같은 동맥류를 앓는다는 사실에, 그는 삶의 태도를 바꾼다.’라는 문장에서 그렇다면 이것도 내 인생이지 않겠냐는 공감이 생기기도 한다.
콘텐츠를 제작하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진심일 리 없다는 것도 알지만 덕분에 방송국 것들의 진심과 태도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가 또 이렇게 재밌어도 되나 싶을 만큼 몰입해서 읽었다. 그러면서 예상이 했다. 아마 올해 한 권을 뽑으라면 이 책이 아니겠냐고.
여하튼 매일 수면시간이 부족해 온종일 비몽사몽에 허덕였다. 그렇게 ‘파리 올림픽’이 완독을 방해하는 통에 오래 붙잡고 있었음에도 결국 끝을 보고야 말았다. 그만큼 이 책의 어느 한 문장도 마음이 동하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리고 그의 감각이 담긴 영상물이 보고 싶다. 또 그리고 그든 펺집자든 조금 더 행복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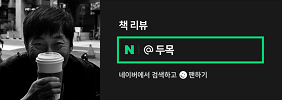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