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 ㅣ 총총 시리즈
황선우.김혼비 지음 / 문학동네 / 2023년 6월
평점 :

구판절판


작가 김민섭의 책 <당신은 쓸만한 사람>을 읽으며, '작가의 작가'라는 말에 꽂혀 김혼비라는 인물이 너무 궁금해 덜컥 그의 책을 주문했다. 세상에 제목도 딱 내 취향이다.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니. 나는 절대 죽을 일 없겠다,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그다지 매사 최선을 다하지 않을 예정인 마음으로 흐뭇하게 창을 닫았다.
젠장! 조금만 조급하면 그나마 없는 꼼꼼함도 백만스물한배쯤은 더 없어지는 걸까. 책을 받고 보니 작가 황선우와 김혼비의 콜라보다. 그것도 편지를 주고받은 걸 모았다니. 두 작가의 책을 읽어 본 적이 없지만, 우선은 작가 김혼비의 필력이 궁금했으므로 얼마간 김이 샜다.
표지에 주저 앉은 곰이 눈에 띄었다. 제목만큼 최선을 다한 미련한 곰일 테지. 매사 영혼을 갈아 넣는 일이 별로 없는 적당히 게으른 인간이라서 번아웃은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까지 보내지 않는 기술을 터득한지 오래라서 이 책이 공감될까 싶다.
나는 모든 만남에서 서열을 따지지 않지만(나보다 네 살 어린 국장과 십수 년 어린 팀장도 모시는 처지라 분명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호칭은 예외적이게도 예민한 편이라서 '빠른'을 주장하며 맞먹으려 드는 꼴에는 꼴값 떨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을 만큼 숟가락질한 세월을 내세우는 편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 두 사람이 퍼올린 숟가락질이 솔찬한데 '씨'로 갈음하는 게 눈에 거슬리지만, 본인들이 좋다는데야 내가 뭔 상관이랴 싶어 시린 눈을 꼭 감았다.
보통 최선을 다하지만 죽을 만큼 최선을 다하고 싶지는 않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들도 나눠하는 것을 즐겨 하고 싶다는 김혼비의 말을 쉽게 지나치지 못했다.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도 아이들에게는 최선을 다하라 요구하는 편이라서.
어쨌든 이렇게 다정한 편지를 보고 있으니 뭔지 모르게 남의 일기나 연애편지 훔쳐보는 것처럼 맥박수도 빨라지고 뭐라도 막 쓰고 싶어진다. 한데 쓰고 싶은데 쓸 상대가 없다는 게 슬픈 일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 결국 나는 이렇게 다정한 편지를 쓰려면 답신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국군장병 위문편지를 써야 하나 싶었는데(그나저나 요즘 아이들도 위문편지를 쓰나?) 답신을 기다리게 될까 봐 그냥 말았다.
책 제목을 책 속에서 읽게 되니 재밌다. 그게 작가 김옥선의 말이었다니 얼마간 실망스럽기도 했는데, 또 가만 생각해 보면 칠십 년쯤 살아내신 연륜이 쌓이셨으니 득도하신 거겠다 싶기도 하다. 우린 아직 최선을 다해야 살 수 있다고 믿고 살아 가니까.
은근 아니 묘하게 눈길을 되돌리는 문장이 많은데, 이를테면 '아주 하는 짓마다 주변에 민폐를 흩뿌려 얄밉기 그지없는 모 계열사 팀장'처럼 말이다. 보통 민폐를 '끼치지'라고 하지 '흩뿌리지'는 않나 싶어 흩뿌린다는 표현이 새삼 맛깔스럽게 변신하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작가와 같이 사는 박태하 씨의 집요에 가까운 정확성에 슬쩍 웃음도 흘리게 된다. 항저우에서 총을 쏘게 했으면 금메달을 가져 왔을까?
여하튼 작가 김민섭이 말한 작가 김혼비의 출중함이 이런 언어의 유희가 부드러운 표면에 돌기처럼 튀어나와 걸리 적 거리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표면이 삽시간에 돌기처럼 도드라져서 어느 문장이 돌기였는지를 잊게 만드는, 애초에 언어유희라는 돌기를 읽던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힘, 같은 걸 알려주려 했던 거라면 수긍하고도 남는다.
불경의 리듬을 타던 목탁이 잔망스러운 품바의 리듬에 불경스러워 한대도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만나 즐거워 하면 좋겠다는 그의 말에 웃지 않을 이가 몇이나 있을까. 그때 그의 가방을 내가 봤다면 그를 도라에몽쯤으로 보지 않았을까? 그의 주머니는 소주와 벽시계와 목탁 등등의 것들이 나오니 말이다. 그나저나 그 '전국축제자랑'이 열리면 초대장이 날아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언뜻 스쳤지만 나는 현악기든 타악기든 다룰 줄 아는 게 없으니 초대는 글렀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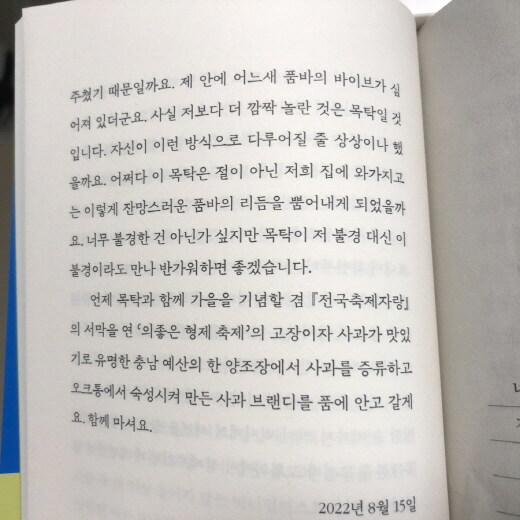
48쪽, 왓츠 인 마이 백
2022년 11월과 12월 사이의 편지를, 그해 10월을 관통하는 그들의 이태원 이야기를 나도 모르게 손까지 모으면서 숙연한 자세로 읽게 되고, 또 세상을 향한 내가 생각하는 것의 백만스물한배쯤은 따뜻하고 섬세한 시선을 가져야 이런 글을 쓰는 거구나, 싶어 더 숙연해져 버리게 만드는 그들의 필력에 기분이 심해를 향해 가라 앉는 바람에 책을 잠시 덮었다.

126쪽, '쟤랑 놀지 마라'의 '쟤'를 맡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친구 '흔'의 상실에 관한 이야기에 나이 오십셋에 갈만한 곳은 없어지고 오라고 부르는 곳이 자주는 아니더라도 상가인 게 비슷해서 그에게 빙의해서 읽으면서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못했던(쓰레기라고만 여겼던) 화환의 위력이 기억에 가시가 박힌 것처럼(왠지 작가를 따고 하고픈 심정이 됐다) 뜨끔하고 박혔다. 나는 내 이름 석자를 걸고 뭘 하지도 않는 데다 직장에서도 가장 바닥을 기는 형편이라 그럴싸한 작명을 미리 몇 개 해놔야 겠다는 위기감이 생겼다.
공자님 환생이 은근 기대되면서 잠자리에 드신지 꽤 오래됐음에도 귀가 가려우셨을 것도 같은 논어 이야기에 웃다가 용기는 나도 못지않게 없는 처지임에도 불끈 했다가 기가 막힌 사자성어 퍼레이드에 빵 터졌다. '군자비추'에 '임신강추'라니. 크하핰이닷!
시작에 썼던 꼼꼼하지 못한 클릭질로 읽게 됐다고 젠장스러워 했던 기분이 싹 날아 갔다. 되레 그 꼼꼼하지 않은 클릭질로 이렇게 다정하고 재기 넘치는 두 작가의 이야기를, 오백 원에 영화 두 편을(한편은 반드시 야했던) 동시상영으로 보던 고등학생 때처럼 땡잡은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다정함으로 무장한 그와 동시에 존칭과 '씨'를 올려 붙일 적당한 거리의 친밀감이 있는 누군가와 서신을 주고 받고 싶은 마음이 강렬해졌다, 지만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 갑자기 내 관계망이 심히 허술했음을 자각하며 잠자리가 뒤숭숭해질 것을 예감한다. 이 책 강추하고도 남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