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손며느리, 딸 하나만 낳았습니다
김혜원 지음 / 탐프레스 / 2023년 6월
평점 :

절판


와, 용기가 쩐다 싶을 정도로 당찬 제목이라고 생각했다. '장손'을 운운하는 집안 며느리라면 보통의 며느리보다 몇 곱절은 고되고 순종적이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한 집안의 대를 이을 장손을 딸 하나로 퉁치다니 그 기개가 남다르지 않은가.
난 장손도 아닌데 우리 엄마도 그랬다. "난 애 못 봐준다"라고. 너희 삼 형제 키우느라 생고생했으니 너희들 애는 너희들이 건사해라는 엄마 말이 그다지 서운하지 않았다. 아내 역시 놀라거나 화 내거나 하지 않았다. 그저 "네, 알았습니다"라고 했다. 어쩌면 "후회 하실걸요?"라는 심정도 없지 않았을지도.
임신하자 아내는 시원하게 회사를 그만 뒀다. 그리고 출산하자 엄마는 진짜 내 애를 봐주시지 않았다. 아내가 기꺼이 독박 육아를 했고 바깥 일보다는 집안일이 더 좋다고 했다. 시간이 지나 힘들게 외벌이 하는 아들을 보며 엄마는 다른 집 며느리는 돈 벌러 다닌다고 대놓고 부러워 했다. 그러게 회사 다닐 때는 애 키우라 시더니 이제 그러시냐며 웃는 아내 말에 엄마는 입을 닫았다.
작가가 시어머니에게 맺힌 게 많아도 엄청 많구나 싶다. 친정 엄마 얘기에는 입에 침이 마르고 눈에선 꿀이 뚝뚝 떨어지는데 시어머니는 첫 장부터 좋은 소리 한 마디가 없어서 웃프다. 이렇게 심한 고부살이라면 안 사는 게 서로 좋지 않을까 싶을 정도다. 살면서 이렇게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험담이 쌓였다면 남편도 중간에서 팍팍했겠다.
사실, 제목을 볼 때는 장손 며느리의 분투기를 생각했다. 엄청 많은 친척 식구들과 줄지어 있는 제사 같은 일에서 웃고 우는 장손 며느리의 생활사 같은. 나 아는 장소는 며느리도 한 달에 한 번 많게는 두 번도 제사가 있다고 하던데. 그런 장손 며느리로 겪어내는 고초라기보다 주야장천 시어머니가 육아에서 빠진 데 대한 넋두리만 넘쳐난다. 아마 작가는 딸에게도 너희 할머니는 너한테 손길 한 번 줬다고 독박 육아에 대한 서운함을 자주 털어 놨겠다 싶어 슬며시 웃음이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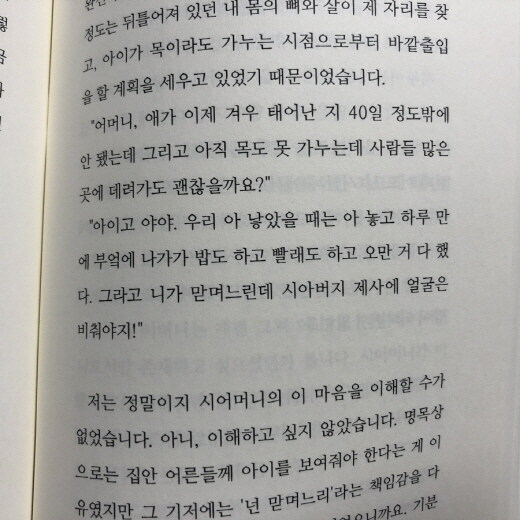
143쪽, 출산 후 30여 일, 그래도 제사를 지냈다
남아선호 사상에 가부장적인 뿌리 깊은 장자 중심의 유교문화를 가진 한국 사회에서 '장손'이라는 신분은 집안을 잇는다는 명분이 있다. 이런 문화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일축하는 세대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선대에 대한 공경이 사라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아쉽기도 하다.
그것도 수백 년 이어온 유서 깊은 류성룡 집안의 대가 끊겼다는 사실은 집안 사람들에게 쉽게 인정할 수없는 일임에는 분명한 일이고. 고리타분하고 구태의연한 집안 문화처럼 말하는 게 깨어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물론 장손이라는 원치 않은 의무감에 시달리는 것도 피해야 할 일이겠지만 이렇게 일방적인 주장처럼 들리는 이야기에 피로도가 많이 느껴진다.
몇 번 책장을 덮고 싶었지만 참고 읽었다. 혹시나 골이 깊을 대로 깊은 고부간의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화해나 훈훈한 반전 같은 게 있을지 몰라서. 이렇게 시댁과 친정이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고부간의 이야기로만 끝까지 질주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
내가 남자라서 며느리의 입장을 이해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결혼하면 집안 문화를 좀 배워야지 않겠냐며 장남은 3년, 동생들은 2년씩 무조건 같이 살아야 한다고 쉽지 않은 시어머니와 3년이나 같이 살면서 며느리 고충을 봐왔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며느리만 고생이고 힘든 건 아닐 테고 시어머니도 같은 입장이었을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최소한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말은 나오지 않을까 싶다.
블로그에 썼다는 짤막한 글 한두 편을 본다면 응원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시어머니에 대한 일방적인 하소연은 피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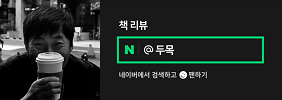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