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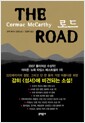
-
로드
코맥 매카시 지음, 정영목 옮김 / 문학동네 / 2008년 6월
평점 :



몰입도 70%
좋은 책이란 혹은 좋은 소설이란, 읽고 나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좋은 소설 혹은 재미있는 소설이란 극중 화자 혹은 주인공에 몰입해서, 읽는 시간 내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경험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다 읽고 난 지금, 이 책 앞에서는 이런 나의 생각과 소설을 읽고 적는 몰입도라는 수치가 무의미함을 깨달았다.
사실 그의 다른 소설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읽으면서도 '이 작가,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이구나'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소설이야말로 극한을 넘어서는 작가의 역량을 보여준다 하겠다. 보는 내내 혹은 다 읽고 나서도 그 먹먹함이란 마치 너무 어두워서 바닥이 보이지 않는 물 속에 머리를 쳐박혔다 겨우 빠져 나와 가쁜 숨을 몰아쉬는 상태라고 해야 할 정도다.
핵전쟁이나 대재앙 이후의 디스토피아를 그려낸 소설이나 영화, 애니메이션은 일본이나 미국에서 꽤나 만들어 왔지만, 이렇게 건조하고 냉정하게 그려낸 작품은 없을 것 같다. 신도 버린 세상에서, 오직 아들을 이 세계에서 지켜내기 위해 -불을 지켜 내는 신성한 의무처럼- 고군분투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신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삶과 죽음, 시간, 사랑, 의무 등 인간의 존재론적 질문들이 무수히 던져진다. 그리고 작가는 그저 삶의 터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자연과 하루하루 살기 위해 먹을 것을 찾고, 어디서 올 지 모르는 위험으로부터 아들을 지키려 안간힘을 쓰는 아버지의 모습과 끊임없이 고민하며 때론 침묵하고 때론 질문을 던지는 아들의 모습을 무뚝뚝하게 그려낼 뿐이다. 그리고 그 퉁명스런 묘사와 난데없는 대화를 읽는 이에게 툭툭 던져지는 묵직한 질문들이 있을 뿐이다. 그 중에서도 잊혀지지 않는 한 질문, '우린 좋은 사람들인가요?' ...
'남자가 아는 것이라고는 아이가 자신의 근거라는 것뿐이었다. 남자가 말했다. 저 아이가 신의 말씀이 아니라면 신은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는 거야.'
'남자는 소년이 자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걷잡을 수 없이 흐느끼곤 했다. 하지만 죽음 때문이 아니었다. 남자는 무엇 때문인지 잘 몰랐지만 아마 아름다움이나 선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다.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 도저히 생각할 방법이 없는 것들'
'아이를 기쁘게 해주려고 자신이 잃어버린 세계를 구축할 때마다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도 함께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어쩌면 소년이 자신보다 이 점을 더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자는 꿈을 기억하려 해보았지만 소용없었다. 남은 것은 꿈의 느낌뿐이었다...'
'사람들은 늘 내일을 준비했지. 하지만 난 그런 건 안 믿었소. 내일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몰랐지.'
'저 아이가 신이라고하면 어쩔 겁니까?'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에서는 신도 살 수가 없소. 당신도 알게 될 거요. 혼자인 게 낫소... 마지막 신과 함께 길을 떠돈다는 건 끔찍한 일일 테니까...'
'있지도 않았던 세계나 오지도 않을 세계의 꿈을 꿔서 네가 다시 행복해 진다면 그건 네가 포기했다는 뜻이야. 이해하겠니? 하지만 넌 포기할 수 없어. 내가 그렇게 놔두지 않을 거야.'
'네가 모든 일을 걱정해야 하는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굴지 마' '그렇다고요. 제가 그런 존재라고요.'
'우리가 사는 게 아주 안 좋니?' ... '나는 그래도 우리가 아직 여기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우린 아직 여기 있잖아.'
'함께 있고 싶어요' '안 돼. 너는 불을 운반해야 돼'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요' '모르긴 왜 몰라' '그게 진짠가요. 불이?' '그럼 진짜지' '어디 있죠?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왜 몰라 네 안에 있어. 늘 거기 있었어. 내 눈에는 보이는데' ...
사족1. 오랜만에 꼼꼼히 다시 읽고 싶은 책을 만났다.
사족2. 툭툭 끊어지는 무뚝뚝한 문체는 역자의 의도가 강하게 개입된 듯하다. 교보에서 본 원문들은 그 정도는 아니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