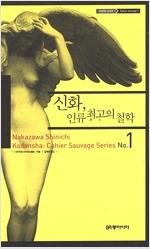<나카자와 신이치 인류학 첫 번째>
무거운
마음으로 이 글을 시작한다.
오늘 오후 귓바퀴까지 얼아붙는
듯한 추위에 웅크리고 산책을 하던 중 어느 청소년들의
얘기가 귀로 흘러 들어왔다.
“야, 걔 녹색이 튀어나오더라.
입냄새가 장난아냐.”
대충 이런 내용을 웃으면서 공유하던 무리들과 스치듯 지나갔다.
녹색 입냄새라니,
어쩌면 우리는 야생을 녹색으로
모두 퉁치는 걸까.
뒤돌아서 물어보고 싶었다.
어이,
학생,
방금 녹색 나오는 거 그거 좀
더 얘기해줘.
아이구 안 하길 다행이지, 했으면
얼마나 서로 무안했겠는가.
『녹색자본론』이 바로 떠오른
건 아니다.
며칠 전 어떤 글을 스치듯이 읽다가
이 책 얘기가 나와서 잠시 멈췄던 일이 생각났던 것이다.
나는 이 책을 몇 달 전에 읽었는데
그때 슈토크하우젠 이야기까지 읽고 완전히 멀리 둔
일이 있었다.
나카자와
신이치는 꽤 유명한 인류학자인데,
그가 쓴 책『신화,
인류 최고의 철학』,
『예술인류학』,
『대칭성 인류학』,
『녹색 자본론』이 한글로 번역이
된 상태다.
이 중에 『대칭성 인류학』은
<카이에
소바쥬>라는
시리즈 5번째
책으로 레비 스트로스를 차용한 야생의 사유를 조명한다.
유명해진 '압도적
비대칭'
세계라는 비판적 접근의 핵심
관점은 그가 제시한 여러 인류학적 사례에서 대칭성을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자본주의를 비판할
열쇠를 건넨다.
고대 신화,
조몬 시대,
불교,
인간과 동물의 관계 각각은 대칭성에
묶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칭성이란
뭘까. 나카자와의
논의에서는 이 사유 구조는 유동적 지성(무의식)인데,
대칭 세계에서는 탈성장,
생태 회복을 위한 방향 전환을
추동할 힘이 발생한다.
대칭성이 어떻게 그런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단 말인가.
나카자와가 보기에 현대적 비대칭은
인간이 우선하고 먼저인 탓에 갈등하고 고통받는
사회다. 물론
나카자와가 말하는 대칭성이 완전한 좌우 균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구조와 반구조의 동시적 현상으로,
비대칭을 포함하면서도 균형을
유지하는 상태다.
비대칭이 뒤덮은 현대사회는
병리적이다.
무의식을 억압하며 인간과 자연의
불균형으로 생태적 위기 상태로 진입했다.
자본주의가 증식 강박을 갖는
괴물이 된 것도 압도적 비대칭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다.
신화에서조차 동물과 인간은 상호
침투하며 (대칭성으로)
자연을 회복하는데,
자본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현대사회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인간
우위를 의심하자.
증식 강박이 문제적이다,
국가와 자본 중심성을 벗어나자
등의 주장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인류학적 탐구를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장으로 이끈다.
나카자와는 대칭이 변증법적
정반합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 말은 언제나 동시성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
동시성에서 방향 전환이 일어난다는 뜻이다.
즉 대칭을 만들면서 동시에 깨버리는
행위와 연결된다고 강조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비판은 기독교적인
'삼위일체적
증식'이
바로 이 동시성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나카자와의 논의 근거가 되는 몇 가지 사례를 찬찬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는
인류학자라기보다는 영성을 중심에 둔 종교학자와도
같다.
나카자와가 처음
유명세을 얻은 책은 옴 진리교와 연결되는 탓에 자주
언급된다.
옴 진리교 교주가
나카자와의 책을 토대로 자신의 밀교를 완성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카자와가 곤란해 진다.
'그루 숭배'와
영적 혁명은 나카자와의 티베트 불교와 밀교
해석서(《雪片曲線論》,《虹の理論》에
나오는 위험한 환상이 아니었느냐는 것이다.
나카자와를 종교적
테러리즘의 지적 뿌리로 취급하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나카자와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실로
중요한 문제이며,
바로 종교적 폭력의
가능성과 종교 현상이 첫 번째 문제가 된다.
또
다른 중요한 지점은 잉여 에너지와 관련된다.
나카자와는 마셜
살린스의 잉여 에너지가 축적되지 않는 낮은 욕망론,
레비 스트로스의
신화 / 토템의 장식성을 잉여 에너지로 설명하는 논의를
넘어서는 발언을 한다.
그것은 나카자와의
인류학자로서의 야심이 담긴 조몬 시대에 관련된다.
“조몬 토기의 복잡한
장식은 잉여 에너지의 직접적 발현이다”라는 부분이다.
나는 잉여라는 개념을
마르크스의 잉여가치에서 다시 사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는 세 번째 논의에서
풀어보겠다.
마지막으로
대칭성의 근거로 인용되는 조몬 시대에 관련된 문제가
있다.
이 마지막 문제를
먼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시대를 읽는다는
일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인류학자들이
밝혀 낸 바에 따르면 조몬 공동체의 특이성은 토기
파괴와 관련된다.
고고학적 탐구를
토대로 조몬인들이 만들고 깨뜨리고 묻고 다시 만드는
토기 파괴와 관련된 순환 의식을 나카자와는 중요시하다.
조몬 사람들은 흙을
캐기 전에 숲에 제사를 올리고,
토기를 빚는 동안엔
노래와 춤이 함께 했다.
토기를 그릇으로
사용하면서도 의도적으로 깨뜨리고 죽은 사람과 함께
묻는다.
영혼이 빠져나가게
일부러 구멍을 뚫거나 깨뜨린다.
무덤 위에 토기를
거꾸로 놓거나 일부러 산산조각 내서 뿌린다.
이 매장 의식이
흙으로 돌려보내는 순환이라고 나카자와는 해석한다.
죽은 자는 우주의
태양과 달 처럼 깨진 토기에 둘러쌓여 있게 된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무덤에서 파헤쳐진 토기 조각이 다시 조몬인들에 의해
새로운 만들고 있는 토기의 장식이 되면서 순환 의식이
완성된다는 것이다.
나카자와는
이렇게 아름다운 의례를 복원했다.
토기 무덤과 수백
점의 토기에 난 파괴된 자국,
그리고 원형으로
배열된 채 묻혀 있는 상태는 수천 년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우주적 순환 의식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믿었다.
조몬 사회는 대칭성
세계로 위계 없는 관계망을 14,000년을
이어 온 것이다.
인간과 비인간,
자연과 사회,
신과 인간의 대칭성을
보존할 수 있던 공동체사회였다.
여기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논의가 생명과 죽음,
생산과 파괴가 서로
대칭적으로 연결해서 공동체를 유지한다는 점이다.
잉여 에너지와 위험한
에너지,
큰 차원에서의 대칭성
질서와 혼돈의 균형이 일어난 조몬 사회를 조금 더
들여다 보려면 '유아
살해'를
말해야만 한다.
조몬의
위험한 에너지 방출로서 유아 살해와 조몬의 붕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縄文が終わったのは、クリの森が消えたからではない。人間が『子供を殺さなくてもいい世界』をあまりにも切実に望んだからである。その切実さは、いまも私たちのなかに生き続けている。私たちはその欲望に従い続けていて、その欲望がいま地球を破壊しているという事実を直視しなければならない。」
🇰🇷
번역
“조몬이
끝난 것은 밤나무 숲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다.
인간이 ‘아이를 죽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다.
그 간절함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욕망을 따라가고
있으며, 그
욕망이 지금 지구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나카자와는
조몬이 붕괴한 이유를 노동시간에서 찾는 게 아니라
불안과 죄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한다.
조몬시대는 저생산 • 저소비로
다른 차원의 풍요를 누린다.
나카자와는 조몬 토기에서 불꽃
무늬를 발견한다.
그리고 곧이어 불꽃무늬 토기를
구조가 아니라 반구조의 극치라고 평가하면서 아름다움으로
욕망을 소진시켰다고 해석한다.
이 말은 조몬 시대가 욕망을
통제하면서 장기간 지속될 수 있었다는 말인데,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는 이상적인
방향 전환을 다룬다.
조몬
사회는 도토리 경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500시간이라고
한다. 조몬인들은
일년 365일
동안 500시간만
일해도 풍요를 얻을 수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의 계절에는 쉬고
수확철에 대부분의 작업을 했다.
조몬인들은 참나무 • 밤나무가
우거진 숲에서 심고 가꾸지 않아도 가을에 1년치
식량을 안겨주는 풍요로운 환경에서 살고 있었다.
조몬인들은 저노동 상태에서
수확철인 나머지 11개월을
보낼 여가가 필요했다.
여기서 고고학 • 인류학자들이
중요하게 지적하는 점은 조몬의 풍요로운 환경에서
인구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저노동으로도 생존이 가능했던
풍요의 시대에 어떻게 인구가 증가하지 않았을까.
나카자와는 유아 살해의 흔적과
토기 파괴를 통해 이를 설명한다.
황금같은
시대라도 불안이 발생하고 이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공동체가 파괴된다고 한다.
조몬은 번식 욕망을 낮추고,
나머지 토기 제작과 같은 창조와
장식, 의례
욕망을 폭발시키면서 균형을 찾은 사회다.
나카자와에 따르면 조몬 토기
깨기는 공동체 구조를 형성하고 다스려지지 않는 불안을
의례적 폭력을 통해 해소하고 이를 반복한다.
상호순환이란 폭력이 새로운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는 다시 폭력을 산출하는 조건을 제공한다.
여기서
중대한 의문이 생긴다.
그렇다면 안정된 정주성과 물질문화의
장식성으로 풍요를 이룬 조몬은 어떻게 붕괴했는가이다.
나카자와의 해석처럼,
사회적 잉여 에너지를 토기,
춤,
의례,
죽음의 과잉 장치로 돌렸고 이것이
잉여를 폭력이 아니라 아름다움으로 돌린 덕에 공동체가
지속할 수 있었다는 촘촘한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붕괴했는가이다.
조몬은 인간이 원래 살아야 할
원형적 기억을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증거가 된다는
해석이 무색할 만큼 그 붕괴는 일반적이었다.
잉여 에너지의 관리가 함께 먹고
함께 늙는 법을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그 붕괴의 실마리에
이르면 공평함이 무엇인지를 되살아나게 한다.
다음에
인용하는 문장은 비록 그 일부만을 보여주지만,
나카자와의 조몬 시대 해석의 결을
보여준다.
그
해석은 각자의 몫이지만 나눌 수 있는 바는 나눠져야
한다.
「縄文の人びとは、余剰のエネルギーが危険な力へと転化するのを恐れていた。そのために、幼児の犠牲を含む儀礼を通して、危険なエネルギーを共同体の秩序の中に取り込んでいった。」
(번역:
“조몬 사람들은 잉여 에너지가
위험한 힘으로 전환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유아 희생을 포함한 의례를
통해 위험한 에너지를 공동체의 질서 속에 끌어들였다.”)
「縄文の精神は、森と人間のあいだに危険なエネルギーを循環させることで保たれていた。犠牲の儀礼はその循環を維持するためのものであった。しかし人びとは、子供を殺さなくてもいい世界を望み、そのために土偶を壊すという象徴的な行為へと移っていった。」
(번역:
“조몬의 정신은 숲과 인간 사이에서
위험한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것으로 유지되었다.
희생의 의례는 그 순환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이를 죽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원했고,
그 때문에 토우(土偶)를
깨뜨리는 상징적 행위로 옮겨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