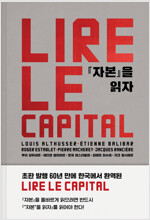<자본을 읽자>가 도서관에 들어왔다. 참 어이없는 게 출간하자마자 두 차례 희망도서 신청을 했었는데 모두 거절당했었다. 그런데 갑자기 세 군데 도서관에 들어온거다. 어떻게 된 일일까? 나처럼 희망도서 신청한 이들이 계속 증가하자 도서관이 협상한 걸까. 아니면 누군가 -조정권력이 있는 사람의- 이 도서는 구비해야 한다는 지시가 있었던 것일까. 아무튼 나는 <자본을 읽자>를 대출해 왔다. 그리고 여기저기 포스트잇을 붙여가면서 읽고 있다.
아주 가능성이 낮은 일이지만 '좌파에 헌신'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시대의 부름을 받은 것일 수도 있다.
가끔 좌파란 누구인가를 생각하다가 밥때를 놓치고 라면을 끓인다. 지금 저 조그만 냄비에 라면이 끓고 있다. 밖에서 들려오는 지글지글한 빗소리는 정념을 더해준다. 좌파란 라면과 빗소리와 굶주린 독자를 안도하게 하는 장치가 된다. 더 솔직해지자면 많은 이들이 좌파보다는 좌파 이론가에 더 매혹된다. 좌파(이론가)는 위대한 지향성을 현장에 이식해 정세를 주도할 준비가 된 적이 있었을 것이다. 좌파에겐 여러 번 기회가 있었다. 그 계기가 좌파와 이론가를 하나로 묶어주기도 했었다.
좌파 독자들은 이론가들이 대중의 인식론적 편향을 바로잡고, 잠자고 있는 혁명 열기를 밝혀내는 일을 하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었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잠재성, 절대정신을 깨울 관념과 테제들에 기꺼이 스며들고자 책을 집어드는 좌파 독자들이 있을 것이다. 첩첩산중에서 수십 년 수행성을 획득한 후, 드디어 시장으로 내려온 짜라투스트라처럼 동시대성의 혼탁함을 가뿐히 비껴갈 구도를 펼칠 현자의 모습이 좌파와 좌파 이론가들의 통합된 이미지였을 것이다. 니체가 시대의 망치를 들고도 쓰러질 수밖에 없었듯이 좌파*이론가들에게도 사태로 진입하는 일은 극도로 어려웠다.
좌파라서 얻게 된 가난이나 핍박이 훈장이던 시절은 갔다. 우파 이론가들에게 헌신 불가능성이 확실했듯이, 좌파 이론가 역시 불가능한 헌신이 당연시 되고 있다. 좌파는 존재들의 헌신으로 숨을 쉬고 있고, 예전과 다른 이름이 되었다. 좌파와 이론가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좌파 이론가는 하나가 아니었다. 좌파-존재 또한 당연하게도 하나일 수 없다. 좌파 독자는 그보다 더 많은 양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