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거짓말 상회 - 거짓말 파는 한국사회를 읽어드립니다
김민섭.김현호.고영 지음, 인문학협동조합 기획 / 블랙피쉬 / 2018년 5월
평점 :

품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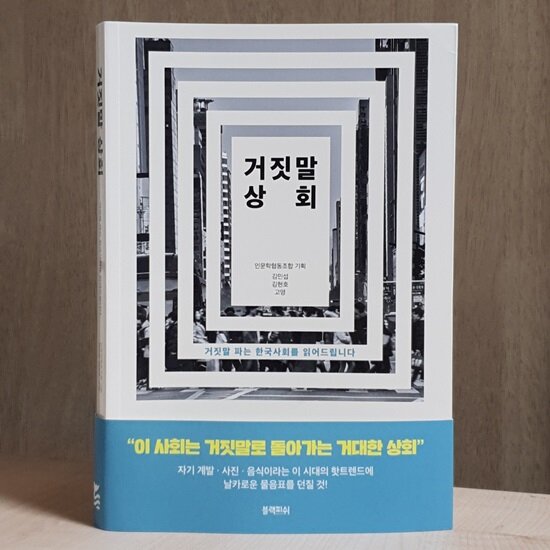
프레임(frame). '액자, 틀'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한 장의 단순한 사진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 이 단어는 주로 언론 보도에서 '하나의 고정된 생각이나 관념'의 의미로 많이 쓰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마치 의사들이 사용하는 전문용어나 변호사들이 사용하는 법률용어처럼 들리는 것 같다. 그러나 나처럼 언론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이 '프레임'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익숙하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 프레임의 존재에 대해 자각하게 되었으니까.
≪거짓말 상회≫는 자기계발, 사진, 음식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사회를 덮어 씌우고 있는 프레임에 대해 이야기한다. 몸과 마음이 지친 대중들은 유독 이 세 가지 주제에 기대었고 그 사이에 한국 사회는 그들이 진실을 보지 못하도록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이 책의 큰 흐름이다. 시대를 관통하는 한 관념들에 물들다 못해 푹 젖어버린 사람들을, 단 한 장의 사진으로 수많은 이야기를 써내지만 그 이야기 중 가운데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마치 음식의 본질을 찾은 것처럼 믿는 사람들을, 책의 저자인 김민섭, 김현호, 고영은 이 질문 하나로 프레임 밖으로 끌어낸다.
무언가 잘못된 게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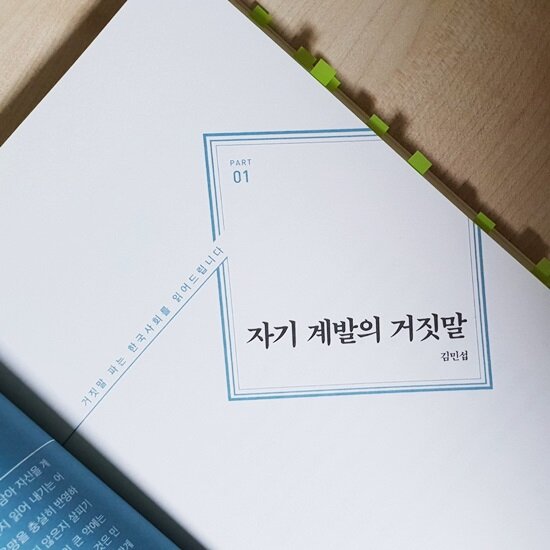
'청춘'의 프레임
만나는 사람의 영역이 넓어지고 생각과 생각 사이에서 오는 이질감과 괴리감에 몹시도 지쳐 있을 때, 내가 꺼내들었던 것은 자기 계발서였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서점가의 베스트셀러 10권 중의 절반 이상은 자기 계발서였다. 지금은 그 트렌드가 '힐링 에세이'로 바뀐 것 같은데, 솔직히 자기 계발서나 에세이나 내가 좋아하는 분야는 아니다. 자기 계발서를 꺼낼 당시만 해도 그것이 문화의 흐름이었기에 무언가에 홀린 듯 집어 들었다. '청춘', '20대', '미쳐라!', '즐겨라!' 식의 키워드들을 제목으로 달고 있었던 자기 계발서들이 불티나게 팔렸고 물론 나도 그중 몇 권을 골라 읽었다. '왜 죄다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해결책은 알려주지 않는 건데? 질문만 던지는 게 전부야?' 그 뒤로 나는 자기 계발서를 찾아 읽지 않았다. 어차피 뻔하디 뻔한 내용일 테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원래 힘들고 아픈거야', '나처럼 노력하면 아프지 않을 수 있으니 힘내' 하는 식이었다. 청년은 그러한 방식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고, '스스로를 계발해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으니 사회적 보살핌과 자기 계발이 함께 필요하다면서, 우리 사회는 청년이라는 한 세대의 권력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p.28)
≪거짓말 상회≫는 사회가 '청춘'에게 씌운 프레임을 들춰낸다. 청춘의 전유물처럼 제시된 꿈, 열정, 도전은 오히려 청춘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다. 사회는 성공과 실패, 단 두 가지 잣대로 청춘들을 분류했고 성공의 기준은 명문대 졸업, 대기업 입사, 높은 연봉 등으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청춘들에게 노력을 강요했고 청춘들이 "힘듭니다!"라고 외치니, '노오력, 노오오오력'을 하라고 대답했다.
졸업을 앞둔 4학년. 사회가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창의 인재'를 일컫는 청춘이 되었다. '남들이 하니까'라는 생각으로 대입을 목표로 삼았고 입학 후엔 자기소개서 한 줄을 채우고자 일명 '스펙'이라고 불리는 활동들을 했다. 여전히 충분하다는 생각보다 모자라다는 생각으로 살아간다. 뭐, 위로가 되는 점은 나만 그런 건 아니라는 사실이다. 자기 계발서에 있는 내용대로 모두가 노력하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더 큰 구덩이에 빠지고 있었다. 이래서 나는 자기 계발서를 싫어한다. 왜 자꾸 나한테만 잘하라고 강요해? (이렇게 불평하면 요즘 청년들은 이게 또 문제라고 어른들은 말한다. "그럼 보여드릴 테니 충분한 기회 좀 주십시오!")
개인에게 가혹한 '잘'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에도 그래서 "그쪽은 '잘'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필요하다. 사실 개인들은 일을 좀 못해도 괜찮다. 더구나 '잘'은 사회가 정해 둔 기준일 뿐이다. 우리는 일을 충분히 잘해 왔고 또 잘하고 있다. (p.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