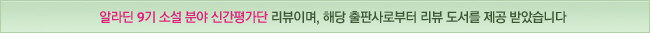[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을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을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
알베르토 망구엘 지음, 조명애 옮김 / 세종(세종서적) / 2011년 8월
평점 :

절판

“이 산맥 이쪽에서만 진실이고, 그 너머 세상에서는 거짓말인 것이 어떻게 진실이란 말인가?”
미셸 드 몽테뉴, 「레이몽 스봉의 변호」, 『수상록』
난,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한 권의 책을, 읽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읽지 않은 것도 아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한다면, 읽지 않은 것에 더 가깝겠다. 결코 두껍지 않은 책, 그리고 생각보다 빽빽하지 않은 활자들로 나열되어 있는 책은, 적어도 나라는 사람에게는 그곳에 아무런 애정도 가 닿지 못했음이 분명하다. 활자만 읽어 내려가야만 하는 책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매력이 없다. 나는, 책을 읽고 난 후,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줄거리인지조차도 가늠하지 못하고 책을 덮기에 이르렀음이, 나는 정말 편독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구나,를 새삼 깨닫게 된다. ㅡ 그래서, 두 번에 걸쳐 읽었다. 줄거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활자만 읽어내려간 것이 첫 번째라면, 줄거리를 알고 난 후에 읽는 것이 두 번째였다. 그래, 그제서야 눈에 들어온다. 나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책을 읽어왔던가. 그것은 비단 여유없음,을 핑계로 들기엔 부끄러움이 인다.
30여 년 전, 마드리드에 거주하는 알레한드로 베빌라쿠아. 그가 쓴, 아니 그가 썼다고 말하여지는 「거짓말 예찬」은 떠난 그가 남긴 걸작,이라고 불리워진다. 작품의 출판기념회 이틀 후, 그가 자신의 아파트 발코니에서 투신 자살을 하기에 이르른다. 그는 분명 신예 작가로 촉망받을 수 있었는데! 도대체 왜? 어째서? - 그의 죽음을 기자인 테라디요스가 재조명한다!
테라디요스는, 알레한드로 베빌라쿠아와 가까이서 생활한, 네 명을 목격자로 꼽는다. 첫 번째로, 알베르토 망구엘(작가 자신)이 화자로 나오는데, 그는 베빌라쿠아의 어둡고 우울함에 가득찰 수밖에 없었던 삶 전체를 아우른다. 철도 참사로 인해 돌아가신 그의 부모를 대신해 엄하기만 했던 외할머니에게 밑에서 자랐던 그에게는 분명 결핍이 존재했고, (개인적으로) 그가 그것을 사랑으로 대체하려고 했음도 눈에 띈다. 하지만 그의 사랑은 언제나 힘겨웠고, 그것은 결핍을 더욱 증가시키는 꼴이 된다. 후에, 그라시엘라와의 만남에서 결핍이 채워지는가 싶었는데, 독재에 저항하던 그녀는 그의 삶을 안아 다독거리지는 못하고 그대로 헤어지게 된다. 뒤이어 감옥에서의 고문이라던가, 저자 자신 몰래 출간된 작품 「거짓말 예찬」은 그에게 최고조의 우울을 선물하고, 결국 그는 자살할 수밖에 없었다,고 화자는 그를 그렇게 ‘변호’하고 있었다. 두 번째 화자, 저자 몰래 작품을 출간했던 베빌라쿠아의 에스파냐 애인, 안드레아. 그녀는 베빌라쿠아의 「거짓말 예찬」이 자신으로 하여금 불러일으켰던 감흥을 이야기하며, 그의 책을 출간하게 된 과정을 설명한다. 세 번째, 감방 동료였던 마르셀리노 올리바레스 (돼지라 불리워진다)의 이야기는 독자의 머릿 속을 혼란시키고, 미궁으로 빠져들게 만든다. 가령, ‘어? 뭐야? 오마이 갓.’ 같은 거. 그는 「거짓말 예찬」의 저자는 따로 있으며, 그 저자가 다름 아닌 자신,이라고 말한다. 마지막, 네 번째 화자, 티토 고로스티사. 이 사람은 누구인지, 감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들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라고 시작되는 그의 첫 문장은 죽은 사람,을 연상케했고, 역시나_ 어쨌든 그는, 다른 이들과는 확연히 다른 점을 보였는데, 세 명의 화자는, 「거짓말 예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에, 네번 째 화자, 그만은 그것을 볼품없는 작품이라며, 꾸밈이 많고 젠체하는, 특색 없고, 생기 없는 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무래도, 난 티도 고로스티사의 ‘두려움에 대한 참작’은 두어 번 더 읽어봐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온다.) ㅡ 그리고 기자 테라디요스의 독백. 그는 어떠한 결론도 내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즉시, 만나게 된다. 자신의 베빌라쿠아를.
한 사람의 삶을 타인의 눈을 통해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타당성이 있는지, 나는 그것이 궁금하다. 한 사람이 생애를 산다는, 아니 살아낸다는 것은, 돌연적인 요소가 무수히 많아서 타인의 생애를 두고, ‘그의 생애는 -였을 것이고, -였을 것이며, -였다.’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우리도 유명인의 죽음을 두고, -였을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꼬집는 한 마디가 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_ 진실은, 그 생애를 살았던 오직 단 한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말이다, 그것을 다른 시각에서는 볼 수 있지 않은가.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떤 생애를 보고, 듣고, 느꼈느냐의 차이인 게다. 나 또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대하는 것에 차이가 있듯이, 그도 그렇지 않았을까_라는 것, 그것의 간극은 이해해줄 수도 있지 않은가 싶은 것. 하지만 「거짓말 예찬」을 두고 벌이는 저자 논쟁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베빌라쿠아가 살아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네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가 된다.
오탈자 : 그것들을 조금만 다른 방식으로 배치하면, 어럽쇼! → 어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