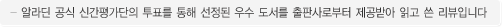[추억의 절반은 맛이다]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추억의 절반은 맛이다]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추억의 절반은 맛이다 - 박찬일 셰프 음식 에세이
박찬일 지음 / 푸른숲 / 2012년 7월
평점 : 


얼마 전, 요가를 시작했다는 지인이 말한다.
“우리 요가선생님은......... 정이 없어.”
“엥? 요가선생님한테 무슨....... 정을 바래?”
뜬금없는 정 타령에 크게 웃었더니만 덧붙이는 설명이 분명 초보인 자기가 보기에도 틀린 자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손으로 만져가며 세세하게 교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정이라....
분명 이 책에서 저자도 겨울바람에 손을 비비며 화롯불에 청어를 구워먹던 이십 년 전의 맛을 더듬어 다시 속초를 찾아와 내뱉은 말이 ‘정이 없어졌다’였다.
그 많던 정은 다 어디로 갔을까?
현대식으로 지어진 건물은 오로지 빠른 회전만을 고려한 듯했고 노동에 지친 아르바이트생들의 얼굴은 식욕의 수은주를 떨어뜨리게 했다는 것이다.
추억의 절반이 맛이었다면 그 맛의 절반은 음식을 함께 먹던 사람과 풍경 아닐까.
어떤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 집 앞에 있던 감나무에서 따먹었던 감이 그렇게나 달고 맛있었다며 죽기 전에 다시 한 번 먹어싶다 하여 구해 와서 먹어본 결과,
“이 맛이....... 아니여~”
그 맛은 추억 속에 박제된 맛인데 어떻게 현재에 재생될 수 있겠는가.
저자가 어렸을 때 숱하게 들렀던 시장통 냉면집을 근간 엄마와 다시 찾아갔을 때, 엄마가 하신 말씀은 이러했다.
“그때는 이 집이 참 컸는데....너희들은 참 작았고.....”
추억속에서 한 번 꽂힌(?) 맛은 최고의 맛으로, 배경이 되던 장소는 포샵질 무한대의 화사함으로 남나보다. 실상 추억의 맛이란 현실의 자극적이고도 강렬한 맛에 줄곧 침범당하고 공격당하기때문에 안전한 기억의 창고에 격리수용된다는 본능 아래 놓인다는 생각이다.
한 번 경험해 본 맛은 이 전의 맛과 비교되며, '지난 번이 더 맛있었어" 혹은 "지난 번 보다 더 맛있네" 하는 비교급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맛을 갈망하게 되고 자본은 사람들의 구미를 자극할만한 신메뉴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고 그 결과 근 50년 간이 음식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한다. 불명예스럽게도 온갖 병들도 출현하게 되었고.
예전에 읽은 욕망에 관한 책에 이런 말이 있었다.
"뭐 좀 맛있는 거 없나?"
이것은 식욕이 아닌 식탐인지라, 다시 말해 욕망인지라 그것을 만족시켜줄 음식은 없다고 했다.
배부르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닌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한 음식은 유감스럽게도 그리 많지 않다.
배고픔을 처절하게 겪어보신 어르신들이 의외로 명쾌한 답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배가 안고파서 그래, 배고프면 다 먹어!!"
욕망에 바탕을 둔 음식의 개발은 앞으로 인류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말 것이다.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내 맘대로 소제목을 붙여보자면
1부는 그야말로 추억의 맛에 대한 회상
2부는 세계를 돌아다니며 경험한 맛에 대한 회상
3부는 문학속의 맛과 내 혀속의 맛, 그 놀라운 미팅
쯤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운동회 날이면 자존심을 세울 일은 이것밖에 없다는 듯 높이 쌓아올렸던 엄마의 찬합,
시금치를 무치던 참기름 냄새에 깨어나던 소년의 새벽잠,
면발 킬러인 저자가 우위를 선점하다가 국물 들이켜는데서 무너져버린 짬뽕 먹기 내기,
못 쓰는 행주를 명주실로 꽁꽁 묶어 들기름을 두르고 한 광주리씩 부쳐내던 배추전,
냉면에 흑심을 품고 원조 평양냉면을 먹기 위해 감행한 중국여행,
식으면 굳어요, 쭉 내세요. 라는 격려와 지도 아래 사슴피를 마셨다는 선배의 무용담,
김승옥의 소설에서, 욕망의 집결지라 불리는 서울의 어느 포장마차에 앉아 공깃돌만한 참새머리를
파삭하고 씹으면 어금니에 부서지는 그 쩌릿한 식감,
그의 추억에는 한껏 치기가 있고 그 치기는 양념처럼 맛에 대한 기억을 풍성하게 한다.
비위가 약해 '변또'라는 말에 식욕을 잃는다는 저자가 바다에서 나오면 아가미가 붉게 변하며 죽는
성질 급한 멸치를 먹기 위해 '대변항'에 기꺼이 간다. 맛은 저자를 그렇게 끌고 다녔다.
그는 충고도 아끼지 않는다. 멸치축제가 열리는 4월은 사람에 치이니까
대변항에 가지 마세효~
내 고향의 지명과 함께 어느 유명한 소설가가 가끔씩 들른다는 게국지 집이 소개된다.
얼마 전, 친정을 방문하니 모 방송을 탔다며 (분명 방송을 탄 집은 한 집일텐데) 그 일대의 음식점들이 너도나도 '게국지' 집으로 변해있었다. 꽃게장, 간장게장은 선사시대의 음식이라도 된 것인가.다른 음식들을 간판에서 쓰나미처럼 몰아낸 방송의 힘은 역시 대단하였다.
방송은 정보의 소개를 했을 뿐이지만 그것의 결과가 맛의 획일화로 남은 것은 뒷맛이 쓰다.
다 읽고 나면 깨닫는다.
그가 먹었던 음식의 거반이 술안주였음을.
소주병을 쉬이 쓰러뜨리는 볼링공과 같은 존재였음을.
한겨레신문 기자에서 요리사로 변신한 저자의 걸쭉한 입담을 주욱 따라가다보면 나도 모르게 고여있던 침을 닦아야하는 부작용은 감수해야겠다.
(우럭매운탕편에서 나는 침이 새지 못하도록 막는 버튼을 누르듯 두 손을 불끈 쥐고 말았다. 우럭의 기름이 배어나와 국물 위로 동동 뜨는 매운탕 국물에 대한 환상을 품게 되었고 친정에 전화를 걸어 나 이번에 내려가면 아구찜 말고 우럭매운탕을 먹겠다는 이상한 결심을 말했다.)
리뷰를 쓰는 고요한 식탁위에 와인 한 잔과 달달한 멸치볶음이 서로 무심한 듯 놓여있다.
그러나 나는 조용히 와인 한 모금에 물엿이 대롱대롱 매달린 멸치를 손으로 집어먹으며 그들을 연결시켜주었다. 이 무슨 조화인고 하며 무릎을 쳤지만 '이 맛은 후일 내게 어떤 맛을 남길까' 생각하며 입꼬리를 슬며시 올려본다.
참, 그리고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보람.
그것은 만두라면 사족을 못 쓰는 나에게 인천 챠이나타운의 원보라는 만두집의 발견이다.
(뭐, 발견만 하고 게서 진도를 못나가게 되는 일이 살아가면서 왕왕 있기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