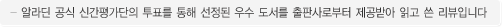[채소의 기분, 바다표범의 키스]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채소의 기분, 바다표범의 키스]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채소의 기분, 바다표범의 키스 - 두번째 무라카미 라디오 ㅣ 무라카미 라디오 2
무라카미 하루키 지음, 권남희 옮김, 오하시 아유미 그림 / 비채 / 2012년 6월
평점 :



책을 받아들고서는 이 제목에서 두 개의 구(句)가 가지는 상관관계는 도대체 무엇인지 무척 궁금했다. 이렇게 연결시켜놓으니 무척이나 시적이고 낯설지 않은가. 제목에 들어있는 쉼표는 어떤 인생의 큰 획과도 같은 큰 의미가 숨어있을 것 같아서 말이다. 책을 읽어보니 이것은 두 개의 독립된 글의 제목이었다.
“꿈을 좇지 않는 인생이란 채소나 다름없다.“ 영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인디언>에서의 대사를 끌어왔다. 그럼 어떤 채소요? 하고 묻는 소년의 질문에 뭐, 양배추쯤 될까? 하는 흐지부지한 그런 식의 대화를 하루키는 좋아한다고 했다. 하나하나의 채소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고 싶었다나?
바다표범의 키스란 캐나다를 여행하게 되었을 때 바다표범오일 캡슐 대신 생기름을 구입한 이야기이다. 그 비릿한 오일을 퍼먹을 때의 느낌이란 바로 바다표범과 딥키스를 하는 축축한 기분이었다는.
이 에세이는 너무 사사하고 소소하여서 단호함이나 비장함 같은 것은 없다. 그렇게 되는 것도 좋고 저렇게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식의 마무리 일색이다. 책표지의 소개처럼 이 책을 읽고 ‘인생을 한 뼘 더 즐겁게 사는 법’을 습득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최소한 나는 바다표범의 입술을 상상하게 됐으니 나의 픽션은 한 뼘 늘어난 셈인가.
이곳에 올린 글들은 <앙앙>이라는 20대 여성을 겨냥한 잡지에 실린 연재글이다.
20대를 위한 글이어서 그런지 잡문집에 가까울 정도로 사뭇 내용이 가볍고 발랄하다.
<1Q84>를 끝내고 쓴 신작에세이라는데 그다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없었다면 내가 너무 그에게 높은 수준의 잣대를 들이댄 것일까. 어쨌거나 무라카미 하루키인데? 허약한 번역체 탓인지 나는 하루키가 중성의 독일어처럼 느껴졌다.
<양을 둘러싼 모험>, <태엽 감는 새>, <댄스 댄스 댄스>, <상실의 시대>, <1Q84>를 진지하게 읽은 나로서는 편지라든가 일기라든가 에세이에는 통 재능이 없어 보인다는 작가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그의 에세이를 너무 기대하고 말았다.
여담이 되겠지만 나는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과 닮은 사람을 잘 떠올리는 편이다. 요즘 개그콘서트에서 ‘용감할뻔함’을 보여주는 개그맨 정태호를 보면 자꾸 무라카미 하루키를 떠올리게 된다.
같은 코너에 출연하는 박성광은 안경만 쓰면 경기도지사 김문수인데....하며 그들의 입담을 지켜보곤 한다. 하지만 무라카미 하루키에게 밝은 성격이나 유머는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다. 줄곧 침침하고 어두운 판타지를 구사해온 그였기에 생긴 편견일지 모르겠지만.
(자꾸 하루키의 말투를 닮아가게 된다.)
하루키 스타일의 에세이는
1)타인의 험담은 구체적으로 쓰지 않기
2) 변명이나 자랑을 되도록 하지 않기
3) 시사적인 화제는 가능한 한 피하기의 규칙을 준수하고 있다.
‘맥주회사가 만드는 우롱차’같은 자신의 에세이를 ‘우롱차만 마시는 독자’를 위해 제일 맛있는 우롱차를 목표로 썼다한다. 어깨에 힘을 빼고 썼으니 볼 때도 힘을 빼고 보아달란다.
반면 <올림픽은 시시하다?>는 무척 다행이었다. 그가 세운 에세이의 규칙을 깨고 목소리를 높였으니 말이다. 요지는 올림픽개최지를 아테네로 고정하라는 것이었다. 매번 개최지를 싸고 일어나는 뇌물 스캔들과 필요이상의 개막식, 폐막식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쓸데없는 토목공사나 공기오염을 줄여야한다고 말이다. 그러나 올림픽 개최지에 취재차 시드니에 가게 될 일이 있어 참석했다가 올림픽의 생동감과 현장감에 빠져들게 된다. 일본으로 돌아와 티비로 보는 시시한 올림픽에 다시 김이 빠지는 변덕쟁이 무라카미 하루키. 그러나 올림픽의 정신은 제쳐두고 국가의 이해관계와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느라 일장기가 올라갔네 올라가지 않았네 같은 꺼리로 여론 몰이하는 편협한 올림픽은 불행하다고 말한다. 다시 삼천포로 빠져 낙천주의자 하루키는 요리와 와인 때문에 시드니를 다시 방문하고 싶어한다. (그의 글 말미는 이렇게 자주 치고 빠진다.)
<체형에 대하여>는 러너로써 참가했던 지역의 목욕탕에 갔을 때 그 목욕탕을 채우고 있던 사람들의 다부진 근육들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일률적인 몸매와 체형들에 대하여 느낀 섬뜩함은 덜 고맙게도 수퍼모델대회가 열리는 지역의 여탕으로 옮아간다. 그 가운데 우연하게 속하게 된 민간인의 당혹스러움에 대하여 선행학습을 시켜준다. 그리고는 그와 함께 체형의 다양함이 공존해야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
<악마와 깊고 푸른 바다 사이에서>
이 영어식 표현은 한자로는 진퇴양난이나 진퇴유곡쯤이 되겠고 우리나라 말로는 ‘빼도 박도 못한다’ 정도의 속담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앞에는 악마, 뒤에는 깊고 푸른 바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 몰리면 깊고 푸른 바다가 매혹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어젯밤 내가 그랬죠.”
당신이라면 악마에게 안기겠는가, 바다로 뛰어들겠는가, 하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 아마, 나는 울다울다 지쳐서 탈수증으로 죽지 않을까요 하고 대답하게 될 것 같다.
하루키를 만나게 된다면 아보카도가 어려운 것은 아보카도에 관심을 덜 기울였던 탓이고, 아직 마셔보지 않았다는 캬라멜 마끼아또는 마음만 있다면 돈으로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것이고, 순무를 먹고 임신한 소녀의 이야기는 정말 건국신화 수준이라고 말하고 싶고, 주저앉은 맥주캔에 대한 불평은 좀 그만하라고 말하고 싶다. 한편으로는 에세이를 장악하고 있는 이런 식의 어투는 뭔가 고도의 계산이 깔려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 무언가 말을 해주고 싶어하게 만듦으로써 관심을 끌려는.
책을 다 읽은 나의 느낌은 뭐랄까.
무라카미 하루키식으로 <채소와의 키스>를 마친 기분이다.
아, 고추장 어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