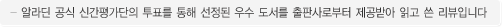[음식 그 두려움의 역사]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음식 그 두려움의 역사]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음식 그 두려움의 역사
하비 리벤스테인 지음, 김지향 옮김 / 지식트리(조선북스) / 2012년 8월
평점 : 
절판

인간에게 음식은 생명의 연장을 위한 필수다. 또한 허기를 해소해주거나 영양소를 공급받기 위한 일차적 목적 외에 맛난 음식을 통해 오감을 충족시키며 삶의 질감을 더욱 섬세하고 풍성하게 하는 요소중 하나인 셈이다. 처음 인류는 음식을 자연에서 구했다. 산열매와 구근, 동물의 살코기를 통해 영양분을 섭취했고 점차 저장기술과 더불어 대량 생산과 먼거리로의 유통이 가능해졌다. 여기에 식품산업은 의학과 과학을 만나면서 유행처럼 붐을 일으키다가 사그라들고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하는 식품은 또다시 온갖 루머와 혹은 맹목적 신임을 얻게된다. 지금도 사정은 매한가지다. 어느 유명인사가 나와 어디에 좋다라고 하면 그 상품의 소비 그래프는 껑충 뛰어오르다 정점을 찍고는 내려오기 마련이다. 도대체 누가 우리의 먹거리를 지배하는가? 무슨 근거로 우리는 식품을 선택하고 신임하는가? 영양학자의 말 한마디에, TV에 나오는 의사의 말 한마디에 우리는 너무 휘둘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음식 그 두려움의 역사>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식품과 관련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음식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해서 이익을 보는 기업과 그 기업과 결탁한 이해 관계자들의 은밀한 배후와 실체를 밝히고 있다. 먹는 것 가지고 장난 치는 인간들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 돈이 된다면 그 음식이 독이 되든말든 개의치 않는 파렴치범들은 여전히 이익이 될만한 곳에 더러운 손을 담그고 있다. 또한 식품에 대한 맹목적이고 전폭적인 지지가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 또한 흥미롭게 다루고 있다. 요구르트를 마시면 대장속의 유해균들을 죽여 140세까지 장수 할 수 있다고 주장한 메치니코프는 정작 자신은 71 세에 생을 마감하면서 그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말았다.
건강에 좋으면 무조건 맹신하고 먹어대는 '푸드패디즘'의 시대가 저물고 의사들이 의약품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자 1906년에 '식품의약품법'이 통과되면서 생명연장의 꿈은 좀더 과학적이고 시스템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식품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세균과 바이러스에대한 공포에서 어느정도 헤어날 수가 있었고 식품에 대한 맹목성에서 어느정도 가려볼 줄 아는 눈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15년에 미국의 화학자 엘머 맥컬럼에 의해 비타민 A의 발견, 그보다 4년 앞서 풍크가 발견한 비타민 B의 발견, 그후 괴혈병을 예방하는 비타민 C와 구루병을 예방하는 비타민 D의 발견은 다른 식품들을 모두 밀어내고 비타마니아에 열광하는 모습을 낳기도 했다. 비타민 열풍은 아직까지 식지 않고 있으니 마케팅의 힘은 실로 위대하다고 할 수 있다. 비타민 시장 확대의 새 지평을 열어젖힌 플라이시만 이스트 덕으로 지금 기업들은 톡톡히 이익을 남기고 있고 사람들은 비타민 과잉을 초래할 만큼 비타민 섭취가 생활화 되었다.
지금도 가공식품에서, 농약이 과다하게 살포된 과일이나 채소에서, 유전자조작 식물(GMO)에서 여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라면스프에서 1등급의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고춧가루에서 공업용 색소나 쇳가루가 나오고, 원산지를 속여 폭리를 취하는 인간들 틈에서 살고 있다. 먹거리를 안전하게 보장 받기 위해서는 유기농 농가와 소비자가 직접 체결하는 시스템을 선호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식품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받기 위함일 것이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음식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 인물들, 에피소드들, 흥미롭기는 하나 우리가 음식을 대하는 태도 또한 점검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