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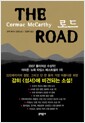
-
로드
코맥 매카시 지음, 정영목 옮김 / 문학동네 / 2008년 6월
평점 :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 이야기속에 파묻히는 희열을 만끽하고 싶어할것이다. 게다가 그 책이 세인들의 모든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최고의 찬사를 받는 책이라면 더욱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저자 코맥 매카시의 새로운 책. 미국에서는 성경과 비견되어지는 묵시록적인 이야기, 라는 문구는 내 손과 귀를 간질였다.
남자와 소년. 이들의 여정을 따라가다보니, 가슴에서 무언가 차올라서 숨이 턱턱 막히는 답답함이 느껴졌다. 알 수 없는 갈증과 번뇌가 머릿속을 헤집고 어지럽혔다.
세상의 끝,이란 섬뜩한 이야기 속 주인공으로 꽤 적합한 남자와 그 남자가 지켜줘야하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인 소년이, 함께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나아간다. 불을 가지고 - 어쩌면 불을 찾으러.
짧게 끊어지는 간결한 문체가 그들의 공간을 채워나가고, 나의 공간까지 압도해 버렸다. 딱딱 끊어지는 잦은숨처럼.
99%의 좌절이 우리를 휘감는다고해도, 단 1%의 희망만 있다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간의,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는 작품.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자신들의 살아갈 방도를 마련하여 생을 이어가는 끈질긴 굴레.
내가 위태롭다면 다른이의 위태로움따위 아랑곳하지 않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무시무시한 경고가 처음부터 끝까지 팽팽한 긴장감속에 그려진다. 정말 내가 저 상황이라면? 이란 가정을 해보지 않고 이 소설을 읽은 사람이 있을까. 내가 만약, 세상의 끝에 서 있다면 단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길을 나설 것 인가. 내옆에 누군가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로드]에선 끊임없이 묻고있다. 너는 어떤 사람인가. 불을 운반하는 사람인가. 불은 아마도 희망이 아닐까. 그에게 소년이란 희망이 없었다면 아마도 불가능했을 출발 - 여자의 말처럼 총알이 3개 남아있을때 결정했어야 했을지 모를.
그러나 남자는 선택했다. 죽음이라는 또 하나의 희망대신 철저한 고립과 고통속에서 발견할 쉽지않은 희망을. 어딘가 신이 있다면 실컷 저주를 퍼부어주며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안에 움트는 그 희망이란 단어를 붙잡고서.
p.s. 1
320페이지의 절망과 단 한 줄기의 희망, 이라고 하지만, 그 희망이란 대체 무엇인가. 소년이 다른 사람들과 다시 길을 떠나는것?
나는, 마지막부분에 나오는 여자,가 혹시 소년의 어머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소년이 죽은 것은 아닐까. 어쩌면 그 고난의 끝은 결국 [죽음]이라는 [희망]이었나.
라는, 얼토당토 않은.
p.s. 2
읽는 내내 김훈의 남한산성이 떠올랐다. 그 건조하고 텁텁하지만 가슴을 저미는 문체. 그리고 영화 투모로우를 연상하며 상상했다. 혹시 이런 모습이 아닐까, 라고.
작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해서 그들이 남쪽으로 향하게 됐는지 말해주지 않는다. 그게 바로 [로드]의 매력이다. 맘껏 상상할 수 있으니까.
비록 상상할수록 우울해지는 처참함이 있다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