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레바논 감정>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을 때, 뒤늦게 최정례 시인의 <레바논 감정>을 알게 됐고, 읽어봤지만 당시의 내게 퍽 어려웠다는 인상을 남겼다. 어쩌면 교과서적 시 해석과 쉬운 교훈시에만 익숙해져 있는 이라면 그런 낯섦과 모호함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시인의 말대로 '말하지 않고, 말 할 수 없는' 어떤 감정들을 레바논 감정이라고 부를까. 현실이 꿈만 같고, 또 꿈이 현실처럼 생생한 이런 장자적(莊子的) 경계를 레바논 감정이라 할까. 하루종일 비가 오는 우중충한 하늘을 레바논 감정이라 할까. 그런 모호함이 더는 '완전한 모호함'으로 다가오지 않고 모종의 '친숙한 모호함', '동거동락하는 모호함'으로 다가올 때, 레바논 감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


거의 모든 시를 관류하는 법칙(?), 혹은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세계와 내가 독립적이고 분절된 각각의 개별자가 아니라 서로 이어지며 뒤엉키는 상호존재 또는 동시존재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분명 나로부터 촉발되고 나와 가장 가까운 것에서 발생하지만 어느새 내가 알지 못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장소에 가닿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사물과 혼효되어 내가 그를 위해 애도하고 있고, 또 그가 나를 위해 웃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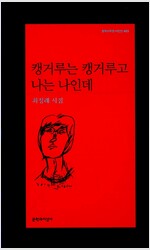
이 시집의 제목은 분명 '캥거루는 캥거루고 나는 나라는' 부정할 수 없는 명징한 인식론에서 출발하는 듯 하지만, 시집의 여러 시편을 관통하는 생각들은 그럼에도 불고하고, 캥거루와 나 사이의 어떤 통점을, 어떤 레바논 감정을 건드린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사물과 나 사이의 공통점을 찾자는 유치한 발상이나 놀이라기보다는, '나'가 '나'라고 여기는 어떤 경계의 허물어짐, '너'가 '너'라고 확신하는 부인할 수 없는 벽에 생기는 어떤 균열을 말하고 있다. 분명 캥거루는 캥거루고 나는 '나인데' 말이다. 분명 <너는 내가 아니다>(101) '너는 나를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내가 너라도 되듯이' 머뭇거리는 이유. 이런 감정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각설하고, 시집에 대해 분석하고픈 생각은 없다. 다만 <로데오 구경>이라는 시와 연이은 <있었다>라는 시를 보고 허락없이 옮겨적는다.
로데오 구경
지나가는 빛을 향해 손을 뻗으면서
저게 희망이야, 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었다
희망은 혼자 몰래 키우는 무지한 짐승
무지한 짐승 잡기 놀이
로데오 선수가 소의 잔등에서 30초도 못 버티고
내동댕이쳐지고 만다
진흙 밭에서 돼지 등에 올라타려고 기를 쓴다
미국 국가가 울려 퍼지고
카메라의 셔터가 터지는 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안다
너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안다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린다고 한다
남극의 빙하도
내 속에 너도 언젠가는 녹아내릴 것이다
언젠가는 이 땅이 몽땅
희망 나라의 부동산에 투자라도 한 것처럼
진흙 밭에 나뒹구는 선수에게 잠깐의 내기를 건다
나팔 불고 북을 친다
사실 난 희망 나라와 체결한 계약서 따위는 없었다
조용히 돌아와
기다리며 차려놓았던 식탁보를 벗기고
손도 대지 않은 접시를 하나하나 깨버려야 할
시간이 닥쳐온다
있었다
지금껏 이것들
쓰려고 했지만 써지지 않았던 것
그에게 가닿기를 바랐지만 닿지 못했던 것
이것들 어떡하나
그는 시 따위를 읽으며
시간을 허비할 사람이 아니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는 나는 누구란 말인가?
내 육체 속에 숙박하고 있는 이 말들은
터무니없이 귀찮게 구는 이것들은
그는 물결 따라 흐르다 발목에 와 걸리적거리는
지푸라기 같은 것을 걷어내듯이
혀를 차겠지
다시 한 번
나를 수치의 화염에 휩싸이게 하겠지
엎치락뒤치락 둔갑하는 그림자처럼
터벅터벅 뒤쫓아 걷는 사람들도 있겠지
황하의 뱃사공, 라스베이거스의 곡예사,
늙은 피카소의 젊은 애인들처럼
그래 그래
이것은 있었다
빚보증 섰다가 파산한 삼촌의 울화병처럼
숨어다니며 구시렁대는 금치산자의 한숨처럼
대책 없이 무거워져서
떨어져 내릴 비구름의 형상으로
뭐라고 시작해야 할까
그에게 그에게 너에게
무수한 별들이 높은 데서 폭발하고 있는 동안에
오늘은 이렇게 초라했었다 전전긍긍했었다
속수무책으로 있었다
네가 있기 때문에 있었다
그러나 끝내 이 말은
가닿기도 전에 얼굴을 붉히리라
이 생각의 불, 불, 불은
흘러가던 붉은 구름 한 점처럼
저녁 빌딩 유리창에 걸려서
있었다 덧없이
시인에게 희망은 짐승을 잡는 놀이와도 같다. 그러나 이 희망이라는 짐승은 무지하다. 그것은 30초도 제대로 버티기 버거운 위험한 놀이다. 시의 중간에서 희망은 '너'와 겹치기도 한다. 그러나 너는 곧 녹아버릴 북극의 얼음같다. 제아무리 견고한 남극의 빙하라하더라고 그것은 끝내 녹아버릴 것이다. 마치 녹기 위해 얼어붙은 것처럼. 너는 결국 내 안에서 녹아 사라질까. 그러나 시인은 이런 아직 다 흘러내리지 않은 얼음, 그 얼음에 대한 희망, 소의 잔등에서 누리는 몇 초의 희망을 이제 과감하게 잘라버리기로 한다. 너를 기다리며 차렸던 식탁의 식탁보와 접시를 하나하나 깨려한다. 그렇다면 희망은 과연 무가치한 것인가. 들뜨고 기다렸던 모든 일들은 끝내 깨버리고 치워버려할 무지일까.
연이은 시 <있었다>는 그런 가치판단을 중지하고 다만 '있었다'는 존재론적 의미를 다시 되짚게 한다. 너에게 다 쓰지 못했던 부치지 못했던 그런 감정이 있었다. 여기. 울화병처럼, 한숨처럼. 허나 동시에 나는 "네가 있기 때문에 있었다". 치솟는 불같은 내가, 아무 의미 없이 유리창에 걸려있는 붉은 구름일지라도 그것은 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덧없지만 아주 덧없지는 않지 않던가.
최정례 시인의 시와는 직접 상관없지만, 최근 이창동 감독의 <버닝>을 보고 페이퍼와 엮어 몇자 적어 본다면, 영화 속 종수(유아인)의 집에서 종수와 벤(스티븐 연)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 종수의 상황과 배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밴과 마찬가지로, 종수는 벤의 생각과 생활을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의 대화는 철저하게 평행선을 달리며 자신들의 말만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벤은 동시존재라는 개념을 들먹이며 타인과 자신의 경계 허물기에 대해 말하지만, 바로 곁에 있는 종수를 이해하지도 또 이해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벤에게 종수나 해미(전종서)는 흥미롭거나 신기한 낯선 놀잇감이고, 종수에게 벤은 재수없으면서도 부러운 존재이다.
영화 속 하우스라는 메타포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겠지만, 나는 세 주인공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 찢어지기 쉽고 불타기 쉬우면서도 불투명한 비닐하우스라고 생각한다. 상대를 잘 알지못하고 그저 모호하게만 아는 한에서 그들은 모두 유약하고 상처받기 쉽다. 밴은 해미를 단순히 버려져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하우스 정도로 여기고, 불태우거나 찢어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밴 또한 종수에게는 하나의 찢어지기 쉬운 하우스가 아니었을까, 포르쉐를 타고 견고한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을지라도 말이다.
영화를 보고, 또 최정례 시인의 시를 보면서 시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에 치닫는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 불이 되는 것이 아닐까. 당신이 나를 잘 알지 못할 때 나는 쉽게 찢어지거나 타버릴 그러나 여전히 모호한 비닐하우스이고 당신은 불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당신이 아닐 때, 나는 당신이라는 하우스에 당기는 불이 된다. 시 또한 분명한 불이다. "이 생각의 불, 불, 불"! 그러나 시는 상대를 버닝하는가? 상대를 처참하게 전소시키는가? 그렇지 않음에, 어쩌면 태워도 태워도 타버리지 못한 하우스로 있는 것, 그것을 시는 말하고 있는게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