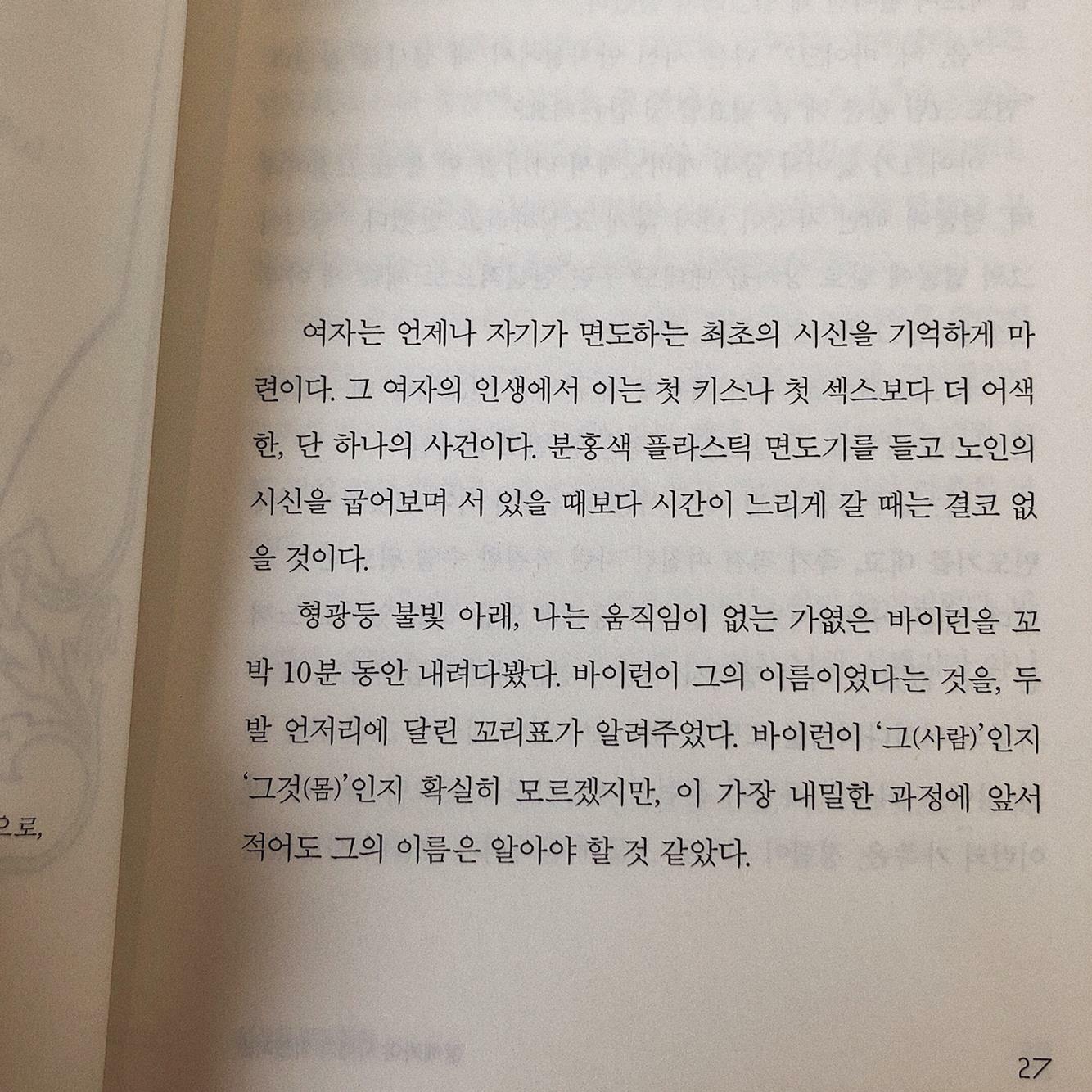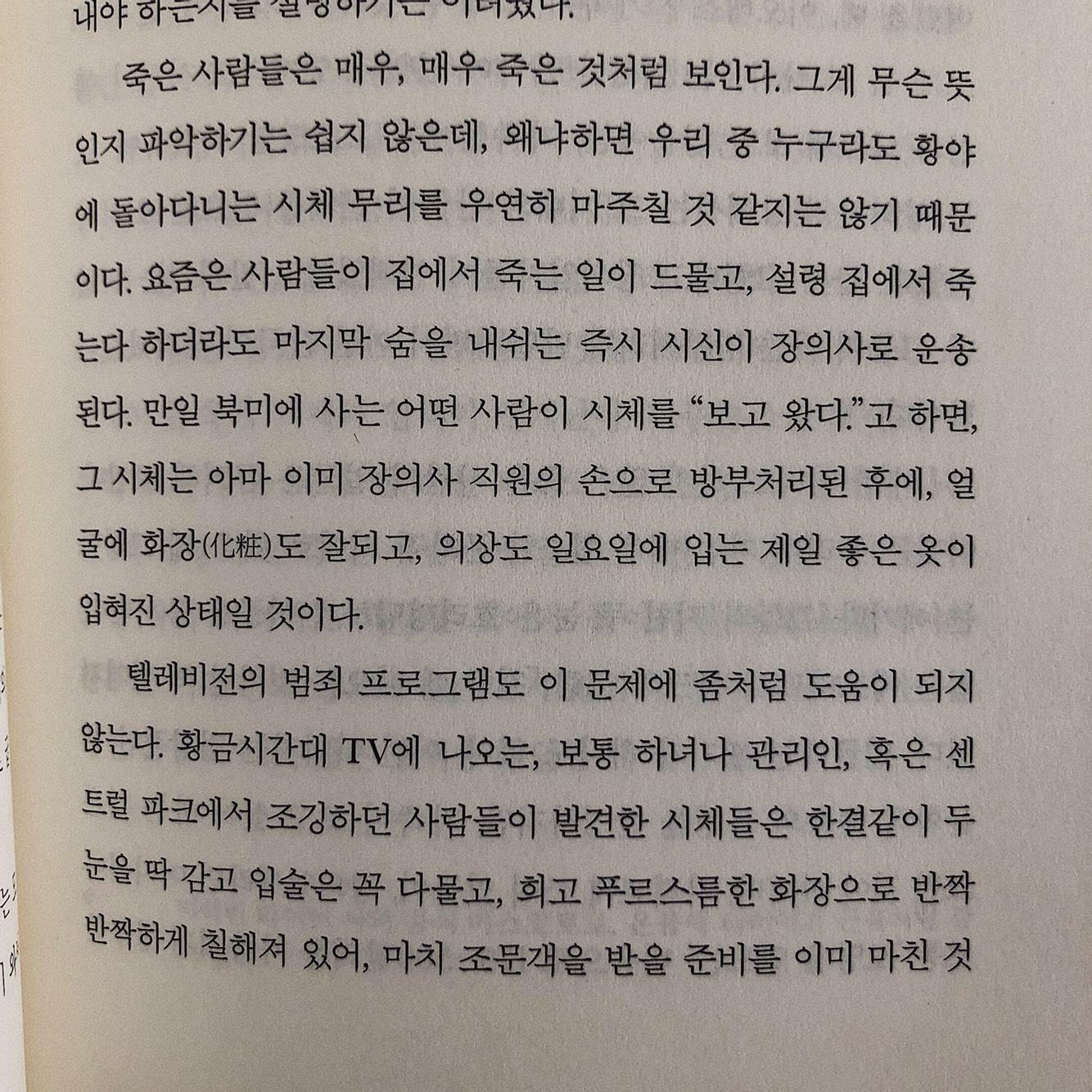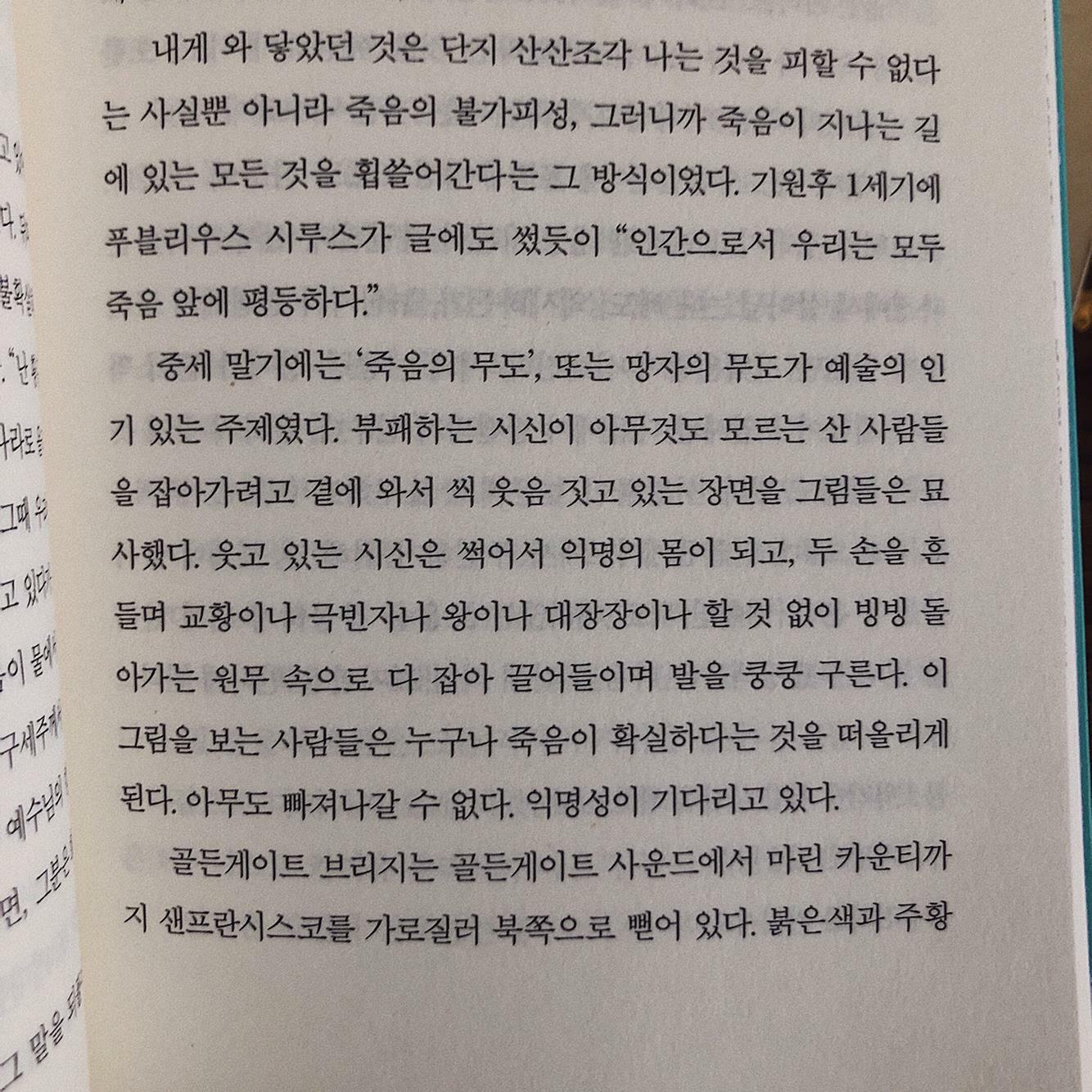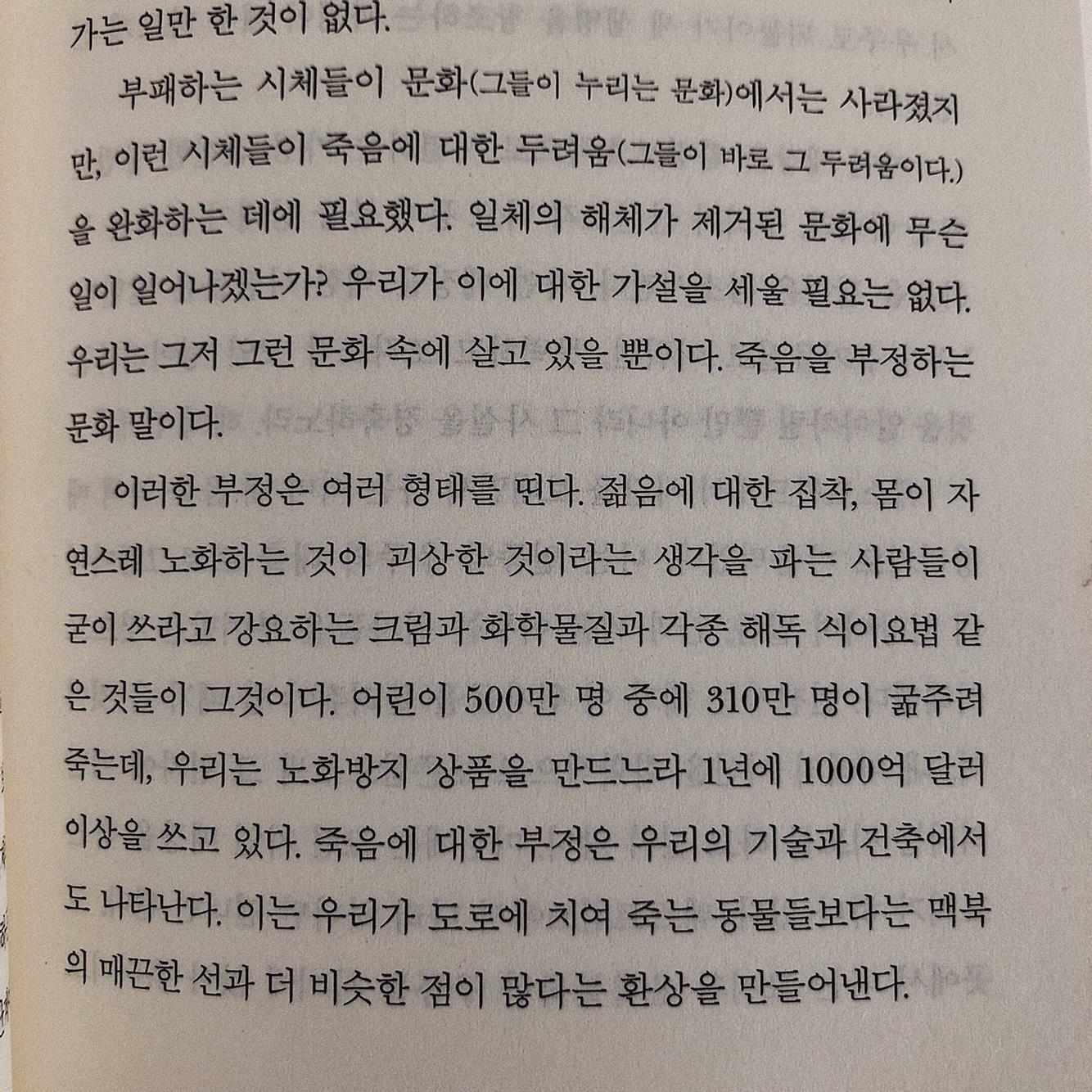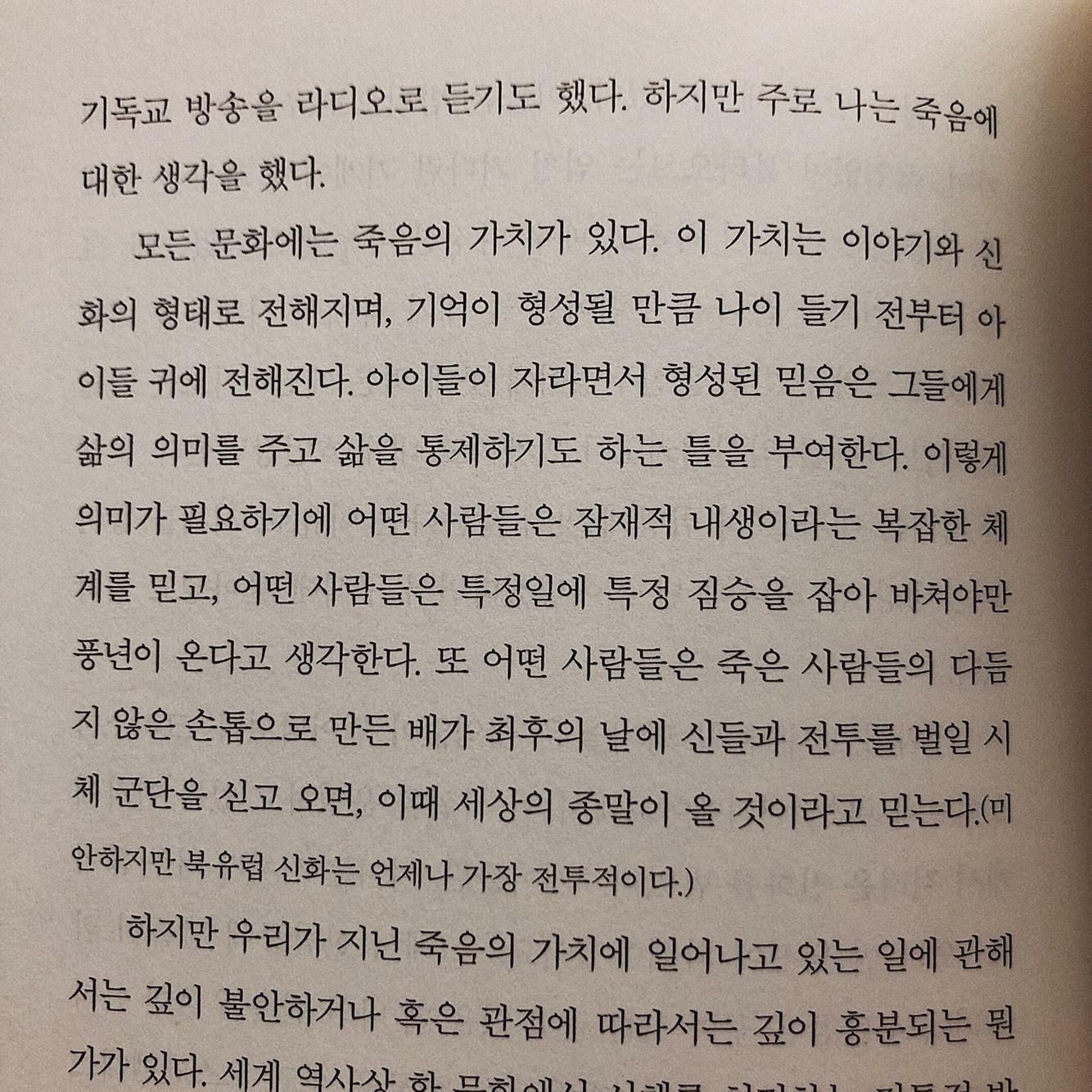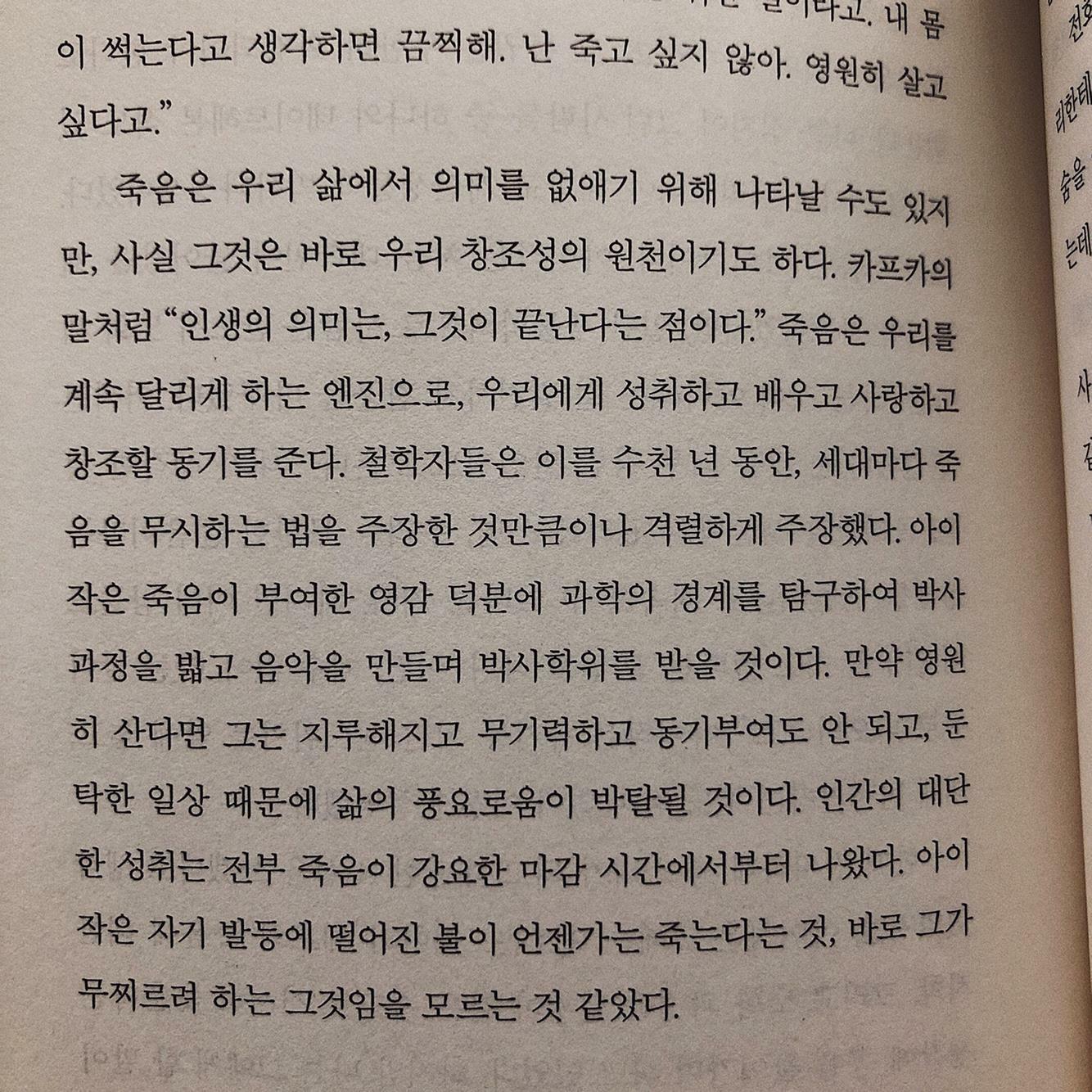-

-
잘해봐야 시체가 되겠지만 - 유쾌하고 신랄한 여자 장의사의 좋은 죽음 안내서 ㅣ 시체 시리즈
케이틀린 도티 지음, 임희근 옮김 / 반비 / 2020년 1월
평점 :



스무 살이 되자마자 화장장에 취직한 한 여성이 있다. 이 책은 그녀가 6년동안 장의업계에서 일하며 직접 겪은 시체와 죽음과 장례에 대한 이야기다. 어린시절 목격한 죽음과 그때부터 시작된 죽음에 대한 집착이 그녀를 장의업계로 이끌었다. 아무튼 책 속 저자의 여정은 취직 첫 날 한 남성 시체를 면도하면서 시작되는데, 결국 ‘좋은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우리를 이끈다.
죽음을 대하는 태도나 장례 절차는 문화권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일단 이 책은 북미지역에서 장의사로 일하는 여성의 경험담이므로 우리로서는 다소 낯선 절차도 있다. 이를테면 시체를 방부처리하여 내보이는 참관절차라던지. 그러나 죽음을 터부시한다는 면에서는 북미지역이나 한국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나는 그동안 유족으로서 장례 절차를 가까이에서 경험할 때마다 죽음이 갑작스럽고 생경한 것으로만 여겨져 매번 화들짝 놀라곤 했다. 마치 죽음이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이!
그러니까, ‘죽음은 감취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알려져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가까운 이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어렵다면 나의 죽음을 생각해보자. 사실 죽음 이후의 장례 절차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산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아, 어떤 이들에게 장례는 비즈니스다. 본질에서 점점 멀어져 상업적으로 변질되어가는 장례 문화를 생각해보라.) 어쨌든 죽음이 낯선 것이 아니라는 것, 두려운 것이라면 있는 그대로 보고 두려워하라는 것. 그게 내가 이 책을 읽고 느낀 것들이다.
사실 이 책은 엄숙하고 무거운 것과는 거리가 멀다. 상당히 유쾌하고 재미있다. 저자가 매일 시체를 마주하고 태우며 죽음을 가까이하는 하루하루는 희극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한다. 저자는 상당히 괴짜같은 면모를 지니고 있는 사람인데 그 매력이 페이지마다 묻어나있다. 아, 이 책은 뒷표지의 문구처럼 정말 ‘악마적으로 웃긴 에세이‘가 분명하다! 또한 저자는 ‘the order of good death‘라는 이름으로 페이지와 유튜브 채널도 운영중이라고 하니 관심있는 분들은 한 번 들어가 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다.
www.instagram.com/vivian_boo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