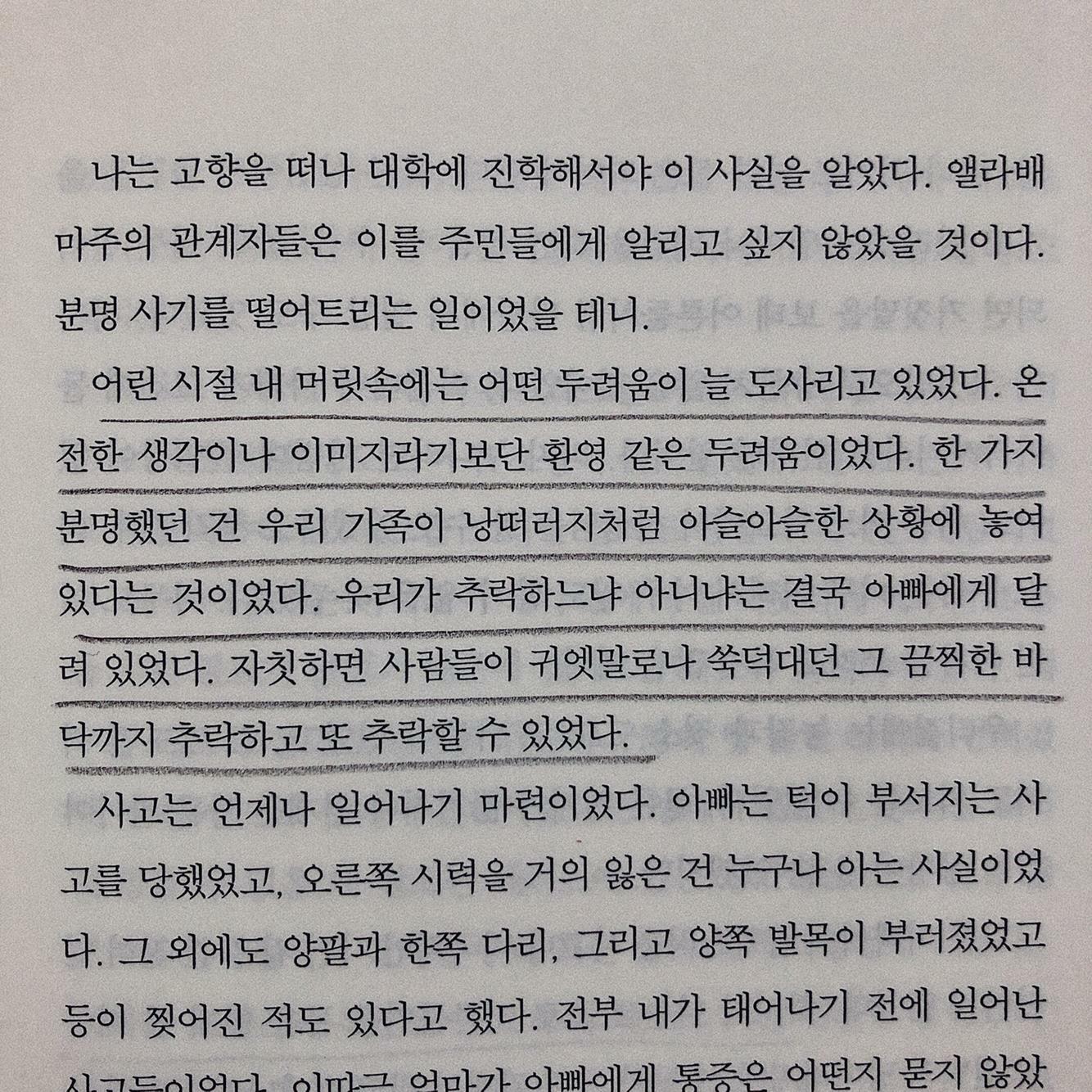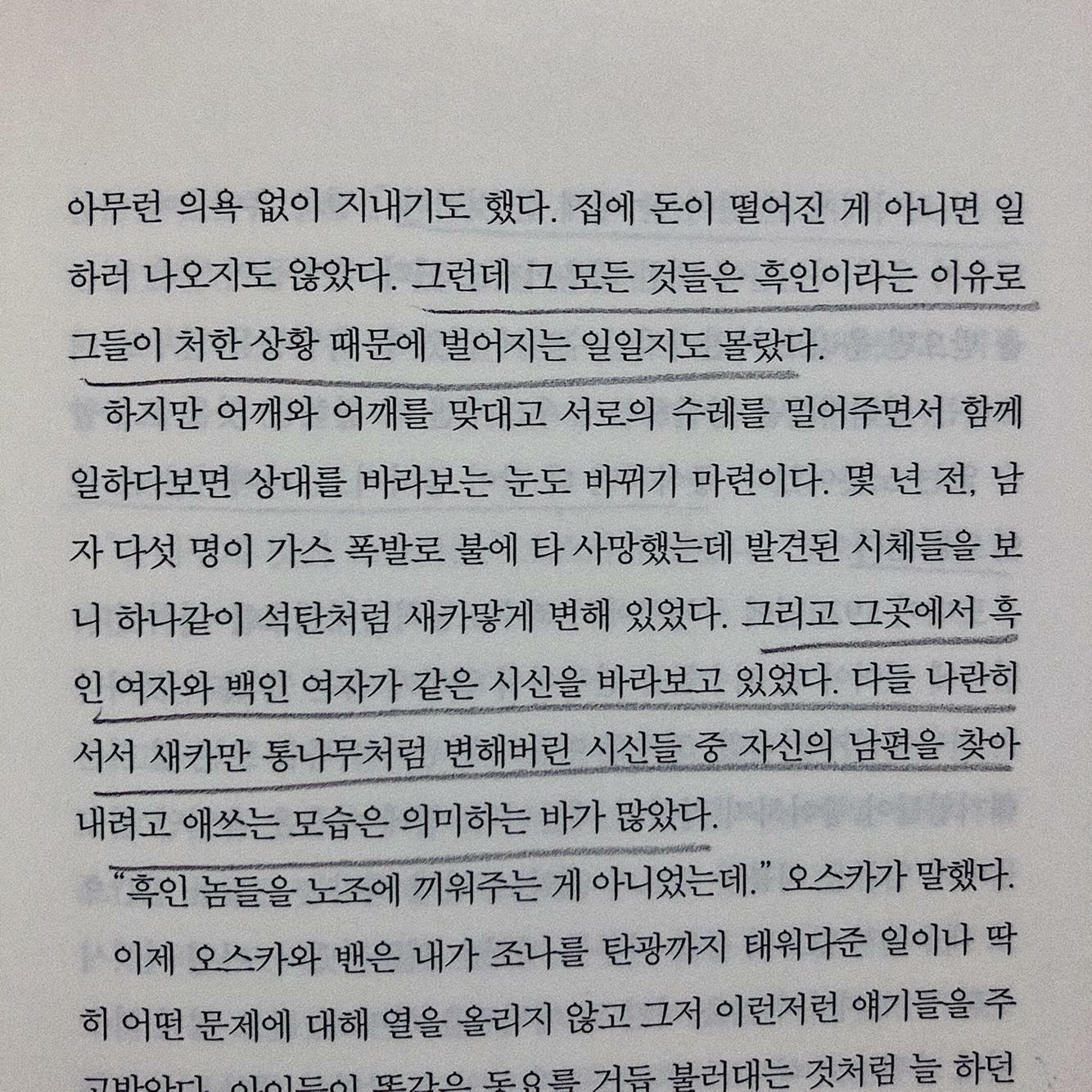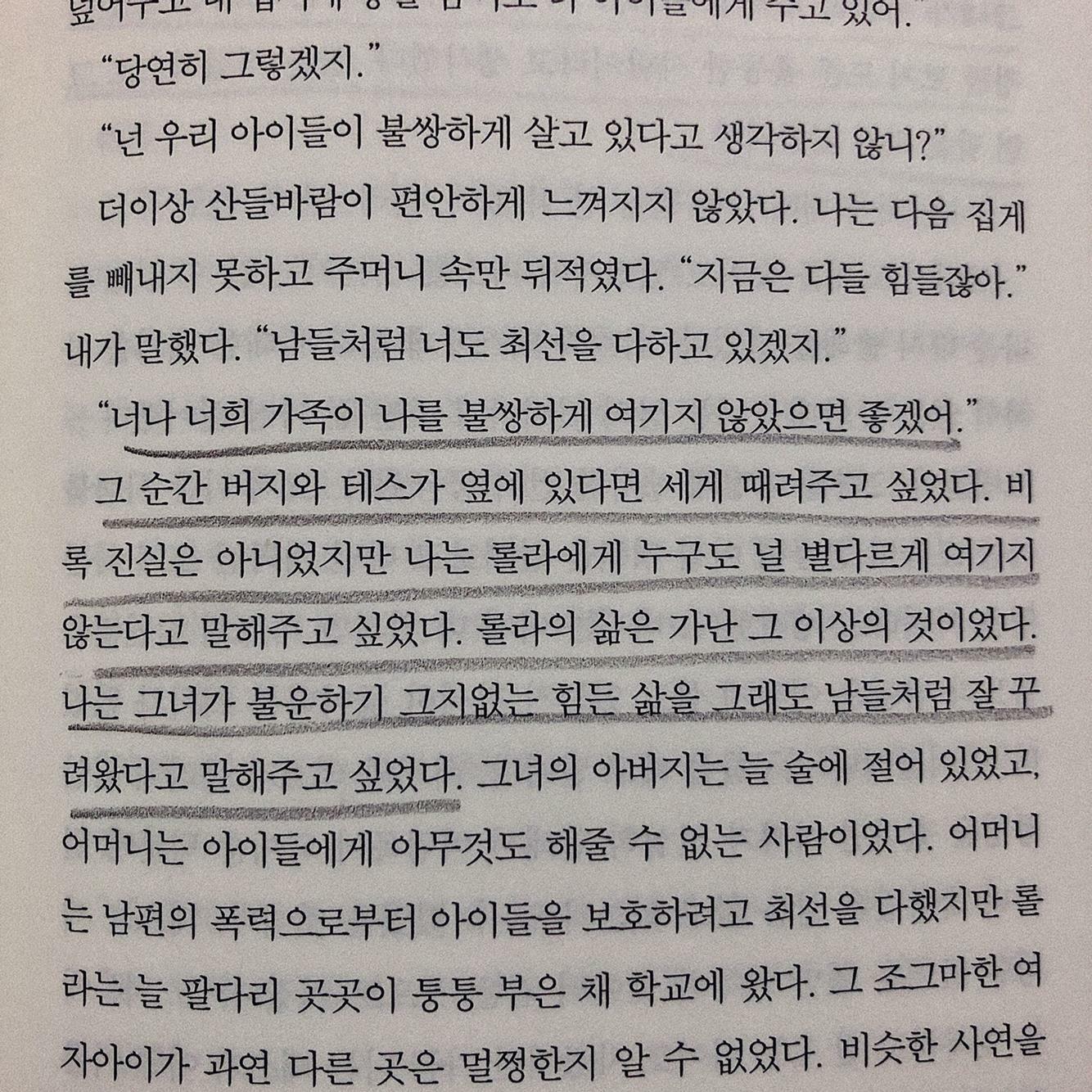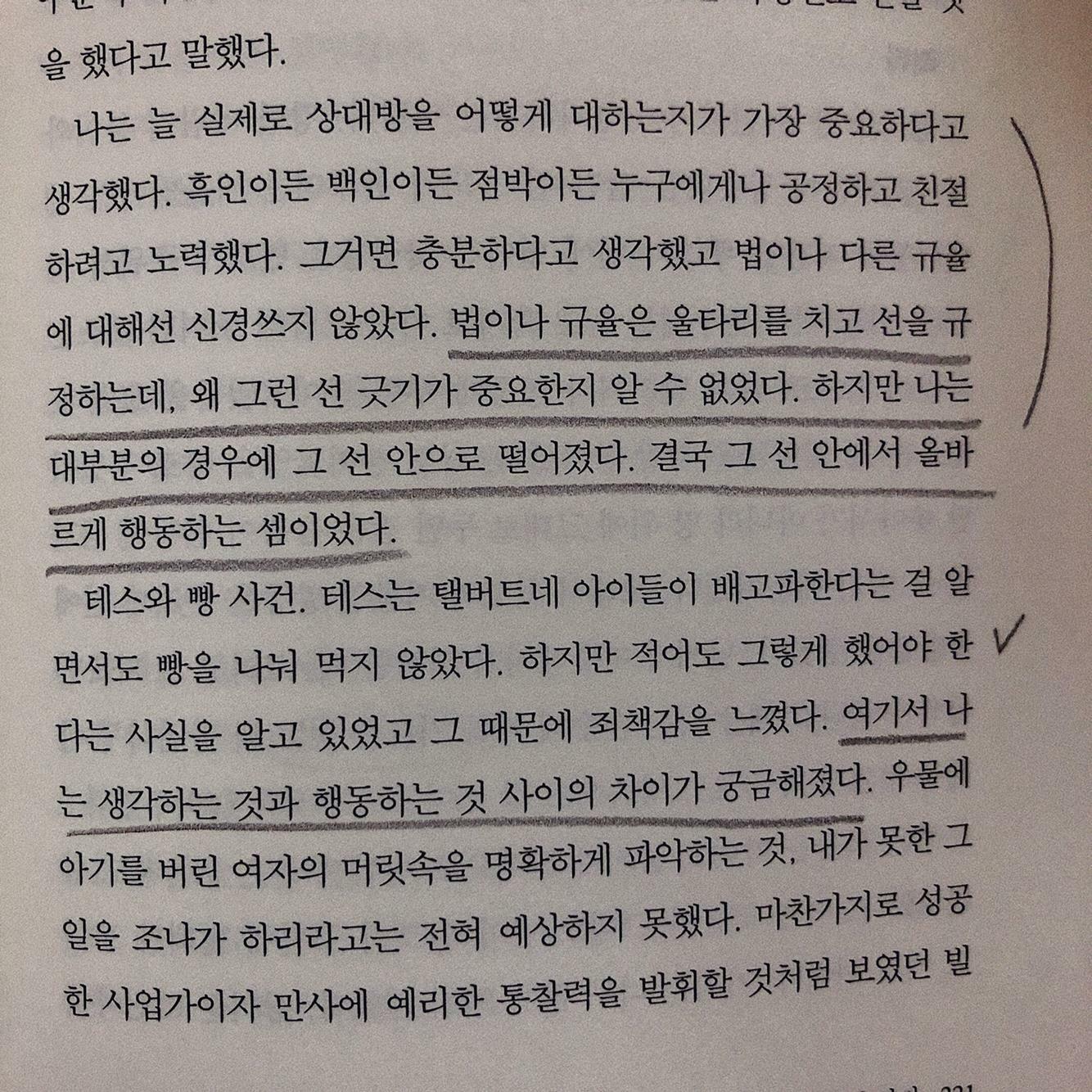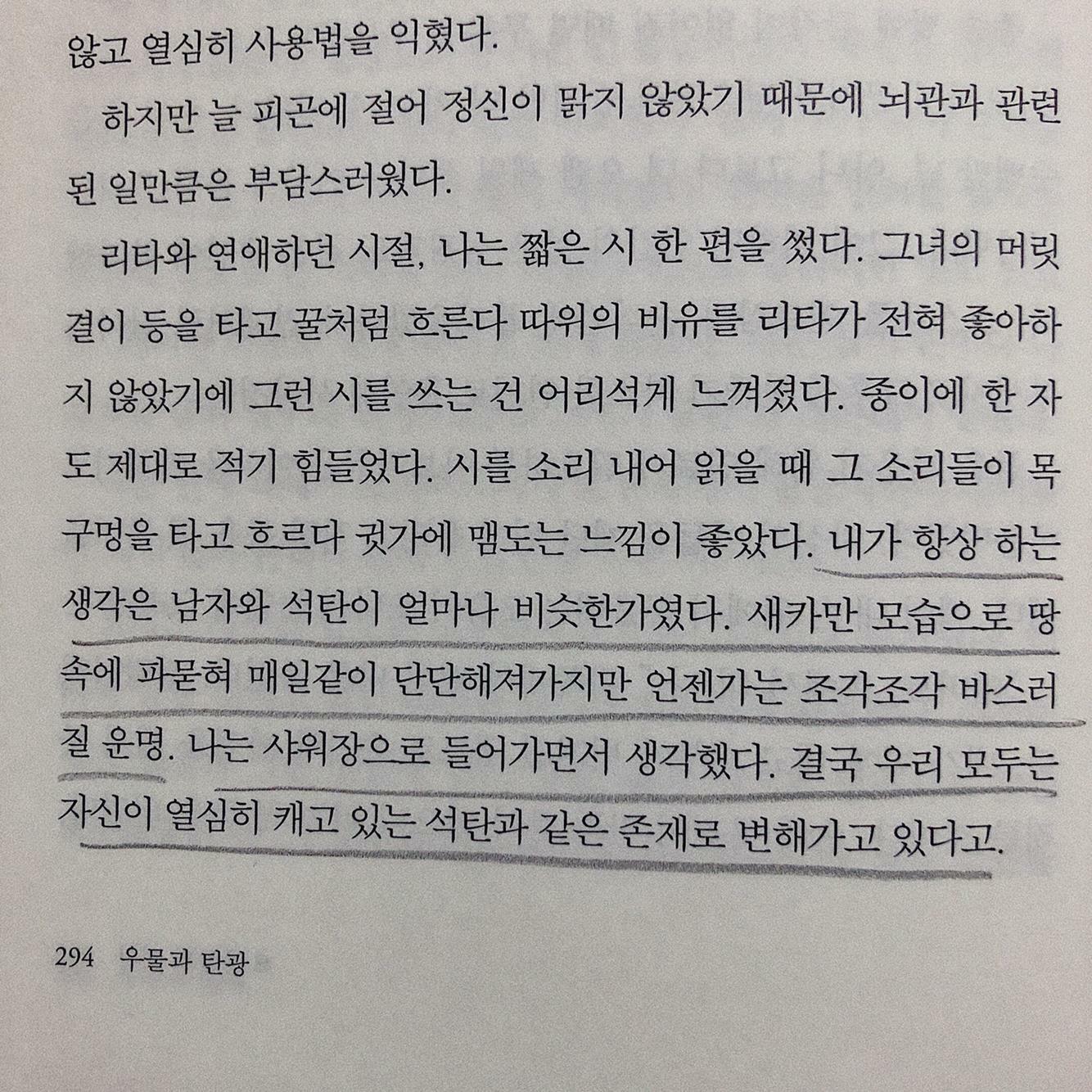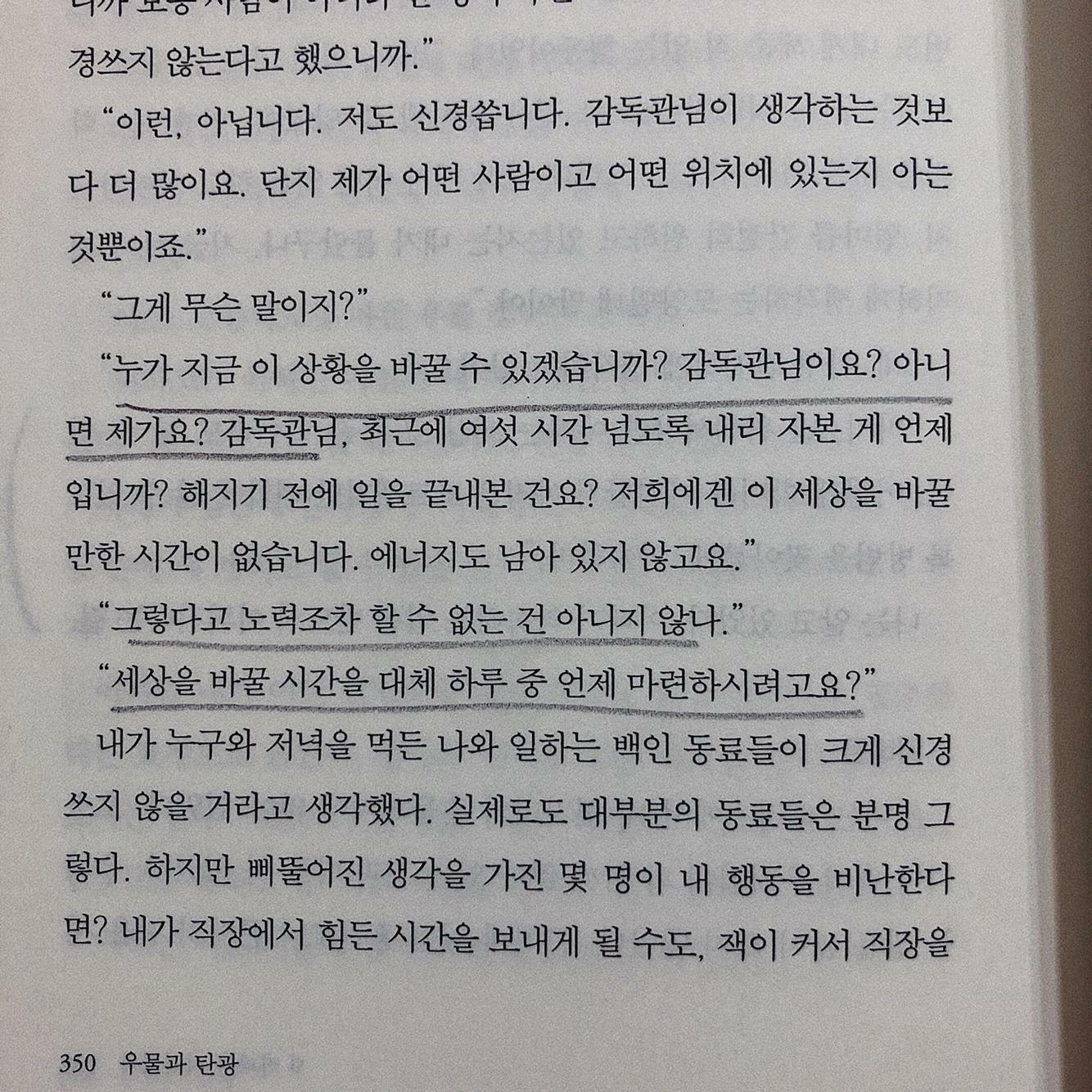-

-
우물과 탄광
진 필립스 지음, 조혜연 옮김 / 문학동네 / 2020년 1월
평점 :

절판

소설의 재미는 역시 내가 가보지 않은 시대의 겪어보지 않은 일들을 간접체험하는데 있다. 그런 의미에서 1930년대 미국의 탄광마을을 배경으로 하는 진 웹스터의 데뷔작 <우물과 탄광>을 읽는 내내 아주 재미있었다.
앨버트와 리타, 그들의 세 아이 버지, 테스, 잭은 풍족하지 않은 살림에도 성실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족이다. 소설은 그들의 집 근처 우물에 어떤 여자가 갓난아이를 던져넣는 충격적인 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 앨버트는 앨버트대로, 버지와 테스는 그들대로 누가 왜 그런 일을 벌였는지 알아내고자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들이 배우는 것은 다양한 삶의 면면들이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 누군가의 가난은 동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그리고 결국 ‘함께’이기에 살 수 있다는 것.
이 소설의 핵심은 ‘함께’라는 단어에 있는 듯하다. 나와 다른 타인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 누가 우물에 아이를 던졌는지가 아니라, 왜 그런 일을 했는지(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더 궁금해하는 것. 미스테리로부터 시작되지만 앨버트 가족의 다섯 시각으로 펼쳐지는 일상과 그 일상 속 배움들이 더 깊게 다가오는 소설이다.
연필 굿즈에 새겨진 ‘슬픔이라는 감정에 비하면 미친 건 아무것도 아니죠.’라는 문구가 어떤 장면에서 나왔을까 궁금했는데, 그 장면이 앨버트가 흑인 동료인 조나로부터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보는 방법’을 깨닫는 장면이라 더욱 좋았다. 리타가 빵을 굽고 커피를 내리는 장면만큼이나! 탄광마을에서 산다는 것은 매일 매일 목숨을 담보로 일한다는 것임에도, 배려와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꾸려가는 앨버트 가족의 모습에 명절을 무사히 보낸 것 같기도.
(*첫번째 독자-출판사로부터 제공받은 도서입니다.)
www.instagram.com/vivian_boo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