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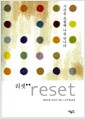
-
리셋 - 시간을 초월해 나를 만나다
기타무라 가오루 지음, 고주영 옮김 / 황매(푸른바람) / 2007년 3월
평점 :

품절


| 지은이 |
기타무라 가오루 | 고주영 옮김 |
| 출판사 |
황매(푸른바람) |
| 별점 |
|
참 아름다운 이야기...
리셋을 읽은건
이 소설이 시간 여행을 소재로 하고 있다는 겉표지의 문구에 호기심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감상적이고 진행이 느린 일본 소설에
왠 블록버스터 SF스타일의 설정인가 싶었다.
그런데 책을 읽는 내내
전혀 SF와는 상관없는
1900년대 전시 일본의 여학교 풍경이 느른하게 펼쳐지자
중간쯤부터 나른하게 졸리기 시작했다.
"이게 뭐지...역사 소설이 었나 본데?"
그러다가 갑.자.기.
마지막 80여페이지를 남겨두고
난
블랙홀로 빠져드는 경험을 했다.
책에서 눈을 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나도 모르게 다시 책 앞부분부터 다시 읽고 있었던거다.
책을 덮고 나서도
책에서 손을 뗄 수 없었다.
난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래.. 그랬구나.. 그래서 앞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복선이 소설의 느른한 일상 속에 확고하게 제자리를 잡고 있었던거다.
그리고 작가의 어조도 확고하고 또 강경하게
그 스토리 속에서 보여지고 있었다.
난 이파리만 보다가 결국 나무를 통째로 본 격이었다.
작가는 왜 "리셋"이라고 제목을 정했을까?
작가는 왜 이런 스토리를 쓰고 싶어했을까?
왜 작가는 전시의 일본속 일본 사람들의 일상 생활과 감정을 묘사하는데 그리 많은 부분을
투자해야 했을까?
그 답은 이 책을 끝까지 읽다보면
편안하게 마음으로 다가온다.
작가는 우리가 그토록 증오했던 일제 시대의 일본인들을
옹호하지도 미워하지도 않고 있다.
그가 묘사하는 것은 그 시대의 "일본 사람들"이다.
그 어떤 편견을 뺀 바로 인간으로서의 일본 사람들 말이다.
작가는 제국주의, 극우주의, 천왕 숭배 등등으로 뭉뚱그려진 이미지인 당시의 일본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서사"했다.
내가 느끼기에
작가는 더 나아가 "오히려 그 시대 일본이란 나라로부터 국민들이 소외되었다"라고 느끼는 것 같다.
내일이 없었던 국민들
내일을 장담할 수 없었기에 아무것도 꿈꿀 수 없었던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과의 미래를 잃어버려야만 했던 사람들..
작가는 그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영원한 미래"를 가져다주고 싶었던거다.
할 수만 있었다면 말이다...
작가는 그래서
시대를 "리셋"했다.
과거의 사람들이 자라 미래로 가지만
미래에서 자란 나는
과거에 잃어버린 사람과 다시 만나게 된다.
내가 그사람과 가질 수 없었던
안타까운 과거의 순간들은
미래에 다시 피어난다...
작가는 이런 의도를
"시대에 대한 복수"라고까지 말한다.
보상. 복수. 아쉬움을 멀리 보내버리는 것.
헤어진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맺어주는것..
일제 시대에 일본 사람들조차
많은 것들을 잃고 살았다는 것을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저릿하게 느낄 수 있었다.
반성, 회의, 아쉬움, 형제애, 가족애, 사소한 아름다운 것들에의 집착, 갈등, 여린 마음들. 소중하게 느끼는 마음들...
한가지 더.
이 소설에서
여주인공의 입을 통해 표현되는 "조선"의 의미도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뜻밖이다.
나이가 든 그녀는 이렇게 고백한다.
"소중한 사람을 잃고 인생을 망친 사람들의 고통은 천재지변이나 전쟁이나 마찬가지인데
...여학생이었어.. 지금 생각하면 모르는것 투성이였어.. 전쟁중이었는데도 ....전쟁에 대해서도 몰랐어..
용맹스럽다고 생각했어.. 가슴이 두근거렸어.. 아시아를 서양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싸움입니다라고 하니 중국 사람도 필리핀 사람도 모두 우리에게 감사하고 있다고만 생각했어.
조선사람의 심정도 생각하지 않았어. 이겼으면 지금도 그랬을거야..."
여주인공의 반성의 말은 작가의 말이기도 하고 어쩌면 같은 생각을 하는 수많은 일본 사람들의 말일 수도 있다.
인간대 인간으로 생각해보 볼 때
우리에게 어려운 시절을 보내게 한 일본인도
나라를 떠나서 보면
그저 "본질적으로 인간의 약점과 아름다움을 지닌 보통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이데올로기나 국수주의에 사로잡히지 않고 개별적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작가의 따뜻한 시선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다.
이 색다른 소설은
순정만화같기도 하고
역사 소설 같기도 하고
추억의 소품 선물 세트 같기도 하고..
(1900년대의 엄청난 추억의 소품들이 복선의 미끼로 등장한다.)
하지만
그런것은 외형적인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세련되고도 확고하게 표현하는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과 사람의 정을 지키는 것.
유대감을 느끼는 것.
시간이 존재하는 한
몇 수십년마다 떨어지는 유성우처럼
시간이 존재하는 한 존재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끈.
그 믿음의 끈을
이 소설은 영겹의 시간을 포괄하며
두 주인공을 통해
아름답고도 처연하게 표현해 냈다.
오로지,
감정을 격하게 표현하거나
어조를 높이지 않고도
일상 생활과
그들의 대화로
그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낸
이 작가의 작가적 역량이 부러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