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쪽별. 춥구나. 퇴근할 때 눈비 맞고 뛰어오는데 총각네 야채 가게 총각들이 우산을 빌려줘서 다행히 덜 젖었어. 봄은 언제 올까? 따뜻했으면 좋겠어.
신림동 황금 허리. 그거라면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어. 너는 모르고 나만 아는 일이야. 그날 우리는 엠티를 갔어. 방에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아. 2층 방에 모여 있는데 누군가 소리쳤어. 규동이가 춤춘다! 그래서 다들 우르르 뛰어나갔어. 나도 덩달아 뛰어나가다가 2층 계단 코너를 막 돌려는 찰나, 그만 보고만 거야. 일층 강당 앞 무대에서 춤을 추는 너 말이야. 너는 움직이고 있는데 시간은 정지되더구나. 군무인데도 유독 너만 보였어. 네 허리 놀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 누군가 하늘과 땅에서 널 잡고 돌리는 것 같았어. 누군가 하늘과 땅에서 널 잡고 물기를 짜내는 것 같았어. 너는 춤추는 빨래, 춤추는 파란 샤먼이자 애송이. 춤추는 수줍음, 춤추는 눈물방울이었어. 그 춤을 보는 순간 설명할 수는 없는 이유로 아주 부끄러워졌어. 노트르담의 꼽추에서 에스메랄다의 춤을 보던 파리 사람들의 기분이 그날의 내 기분과 비슷했을지도 몰라.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저 여인은 위험하다.’ 같은 감정을 나도 느낀 거야. 뛰어 내려가던 나는 2층 계단에서 우뚝 멈춰 섰어. 그리고는 잠시 후 휙 돌아서 문을 열고 나가 버렸어. 그때 내가 평소에 알던 너와 달라서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하니? 틀렸어. 난 당황한 게 아니야. 평소에 알던 네가 그렇게 춤을 춰서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거야. 나는 창백하고 침착하고 조심스러운 남자의 현란한 춤. 그 모순과 긴장과 생명력에서 아름다움과 슬픔을 느꼈어. 넌 그날 우리 모두를 오르페우스로 만들었어. 모두들 경고를 무시하고 뒤돌아 봐야만 했어. 오로지 나만이 거기 휩쓸리지 않고 앙상한 나무 사이를 걸어 다녔던 거야. 나만이 너의 매혹에 저항했던 거야. 그날의 너, 네가 살았던 수많은 나날 중 하필이면 그날의 네가 화석으로 남는다면 미래 사람들은 거기서 춤추는 남자의 무엇을 볼 수 있을까? 한 남자의 춤 추는 하루에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 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그건 생명력일 거야. 살아있고 움직이고 있음의 희열일 거야. 수만 년이 흘러도 누구라도 읽어낼 수 있을 거야. 어쨌든 너의 지킬과 하이드 잘 읽었어. 그 글을 읽으니 네가 무척 고독하고 순수한 상태에서 썼다는 게 느껴지고 그게 어쩐 일인지 가슴이 아파. 뭔가 좋고 아까운 걸 두고 길을 나서며 뒤돌아보는 사람이 가슴을 치며 쓴 것 같아. ‘너 요새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놓고 금세 후회되네. 너라면 ‘무슨 일이 있지 않은 적이 있니?’라고 대답하겠지.
그렇다면 전략을 바꿔서 이번엔 나 장난쳐도 되니? 윤동주의 서시 말이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 시가 어디에 제일 많이 걸려 있을 것 같아? 바로 감옥이야. 어때? 지금 당장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있어지고 싶지? 난 그랬는데. 웃기지 않았다면 정말 미안해. 누군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길 소망하지 않았겠니.
그럼 이 이야긴 어때? 내가 어려서 솜사탕 막대기 수집가였단 이야기 너에게 했었니? 다들 뭔가 수집하잖아. 우표도 있고 구슬도 있고 흔들면 여자 옷이 벗겨지는 볼펜도 있고 미니 자동차도 있고 공깃돌도 있고 딱지도 있고 초콜릿 통도 있고. 내 동생은 죽은 새 깃털 수집가였는데 그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랬던 것처럼 날고 싶은 꿈을 가졌기 때문이야. 내 동생이 지붕에서 그 날개들을 다 날고 뛰어내리는데 그 날개가 사방팔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내 동생은 벌거숭이가 되는 상상을 하면서 악몽에 시달렸던 걸 보면 내가 내 동생보단 여러모로 현실 타협적인 인간이었던 것 같긴 해. 나중에 그 털들은 어떻게 되었느냐면 내 동생이 닭털까지 모으니 냄새가 나서 나의 사주로 엄마가 동생 몰래 버렸어. 그리곤 날고 싶은 소원을 가진 도둑이 들었다고 했던 것 같아. 같은 소원을 가진 사람끼리 이해하고 살아야 한다고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동생을 위로했지. 어쨌든 나는 오로지 솜사탕 막대기만 모았어. 하나의 중심축이 있고 거기에 뭔가 구름 같은 것, 불분명한 것, 축이 없다면 흩어져 버리고 말 것들이 모여드는 그 이미지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 나는 그래서 막대기로 방안에 먼지를 모으는 실험까지 감행하기도 했었어. 내 이론에 의하면 그 솜사탕은 무지개색으로 나왔어야 했어. 낮잠을 자고 일어나면 눈앞에 먼지는 언제나 형형색색이었거든.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했어. 그렇다면 우리 영혼에도 척추가 있어서 그 뼈 중심으로 온갖 것들이 모여드는 게 아닐까. 거기엔 좋은 것 좋지 않은 것 순수한 것 불순한 것 선한 것 악한 것. 인정받고 싶은 것, 자유롭고 싶은 것. 때리고 싶은 것, 차라리 얻어맞고 싶은 것. 사랑받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형태를 유지하는 것 아닌가 하고. 그래서 난 나중에 솜사탕 막대기를 내 손으로 버릴 때 내 영혼의 축에 대해 생각해 봤어. 영혼에도 등뼈란 게 있다면 언젠간 그런 것을 갖고 싶다고 빌고 싶었었어.
난 언제부턴가 선악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게 된 것 같아. 선의 가면을 쓴 악, 착한 척하는 사람들의 악. 그런 것이라면 관심을 멈출 수가 없어. 그리고 결국엔 선을 부르고야 말 악이 존재함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사람이 자신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은 어떤 한 극단에 닿아서가 아니라 동시에 두 극단에 닿을 때란 파스칼의 이 말은 나에겐 언제나 이런 식으로 다가와. 깊은 사랑 때문에 깊게 미워하고 깊은 사랑 때문에 깊게 경멸한다고, 큰 악 때문에 큰 선을 꿈꾼다고.
난 성악설이나 성선설보다 성악설이란 걸 생각해. 그런 학설이 있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약하다는 것. 그 약한 인간이 선과 악의 아슬아슬한 균형추를 잡아가며 사는 게 삶이라고 생각해.
내가 진짜로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니? 세상은 원래 그렇다는 핑계를 대고 선한 면을 팽개치고 악해지는 사람이야. 내가 진짜로 용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니? 타락하고 악해질 수많은 이유가 있는데도 악해지지 않은 사람들이야. 내가 진짜로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니?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인간은 어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다른 인간에게 악이 선으로 될 가능성을 보려는 사람들이야. 내가 진짜로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니? 자기는 착하다고 믿고 자기의 모습에 만족하며 남에게 훈계하고 별것 아닌 일에도 깜짝 놀라는 척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너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 릴케의 『말테의 수기』가 생각나. 말테의 수기는 낯선 곳에 도착한 사람의 시선으로 쓰인 책이야. 그래 집 떠난 젊은이의 눈앞에 펼쳐진 세계의 낯섦. 그것이 말테의 수기일 거야. 그리고 이런 시선은 너무나 소중해. 바로 이런 이유에서.
 |
|
|
| |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옆으로 치워버렸다.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이 많다거나 아니면 삶이 바쁘다거나
그것들을 우리 곁에 두면 안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로 말이다.
그러는 가운데 시간은 흘렀고 우리는 사소한 것들에 길이 들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가진 것의 어마어마함에 놀랐다.
|
|
| |
|
 |
그래서 그렇게 되길 원치 않는 사람들은 탕자가 되어서 길을 떠나는 거야. 그런 길을 떠난 말테는 보는 법을 새로 배울 수밖에 없어. 보는 법을 새로 배우면서 말테에게는 전에 없던 내면이 생겨나. 내면이 생겨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너무 중요할 거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외부에만 의존하고 말겠지. 말테의 수기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이웃에 대한 이야기, 연극배우의 무대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지만, 언젠가 그 이야기도 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다른 이야길 들려줄게. 오늘 말테의 수기가 생각난 이유는 따로 있거든. 덴마크 귀족의 후손이지만 이젠 파리의 가난하고 고독한 이방인일 뿐인 말테는 어느 날 이렇게 해.
 |
|
|
| |
무심코 접시에 손을 가져가 사과를 하나 집어서 앞쪽 책상에 놓는다. 나의 생은 이 과일을 어떻게 싸고 있을까? 인생에서 이루어낸 것 주위엔 아직 이루어내지 못한 것들이 있어 이것들은 빠르게 자란다. |
|
| |
|
 |
나는 이 부분을 읽으며 사과의 씨앗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어(그리고 내 어린 날의 솜사탕 막대를 생각했어). 열매가 씨앗을 기억한다고 할 때 내 선과 악이, 내 슬픔과 기쁨이 씨앗을 기억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씨앗일까? 어떤 씨앗에서 내 과일은 자라났을까? 오늘 네 슬픔의 과일은 어떤 씨앗에서 자랐을까? 나는 지금은 오로지 강함만을 생각해. 악해질 많은 기회가 있어도 난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아. 진리에 관심 있는 자라면 어디서라도 진리를 찾아내고 선에 관심 있는 자라면 어디서라도 선을 찾아내고 악에 관심 있는 자라면 어디서라도 악을 찾아내고 말 거야. 나는 어디서든 강함을 찾아내고 싶어. 지상의 선과 악을 다 받아들이되 그것을 도덕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싶진 않아. 중요한 것은 생명력이야. 그날 네가 춤추는 너한테서 한 번 본 것. 그리고 끝까지 새겨두기 위해, 영원히 타오르게 하기 위해 눈을 감아버린 그것.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문밖으로 걸어나가게 한 그것. 그것은 바로 너의 생명력이었어. 꺼트리지 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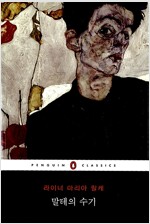 <말테의 수기> <말테의 수기>
라이너 마리아 릴케 / 김재혁 옮김
펭귄클래식코리아 / 2010년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