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서함 110호의 우편물 - 개정판
이도우 지음 / 알에이치코리아(RHK) / 2013년 2월
평점 :

구판절판

손가락 아래 노트북 자판을 낙서처럼 한 자 한 자 두드렸다.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던 구절이 모니터에 차곡차곡 모습을 드러냈다.
네 사랑이 무사하기를
내 사랑도 무사하니까
깜빡이는 커서 옆으로, 방금 새긴 문장을 진솔은 물끄러미 들여다보았다. 언젠가 건이 썼던 짧은 편지였다. 건네주지 못한 시집 속의 구절. 누구를 향한 사랑들인지, 대상은 모두 빠져 있는 그 구절. 그래서 내 것이기도 하고 그들의 것이기도 한 서글픈 바람…. 자판 소리와 함께 아래에 또 하나의 문장이 찍혔다.
세상의 모든 사랑이, 무사하기를
백스페이스를 눌러 지금까지 끼적거렸던 문장들을 밑에서부터 차례로 다 지워버리고는, 파워를 끄고 노트북을 닫았다. 방금 쓴 문장은 말이 안 된다. 세상의 모든 사랑이 무사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 서로 부딪치는 사랑, 동시에 얽혀 있는 무수한 사랑들. 어느 사랑이 이루어지면 다른 사랑은 날개를 접어야만 할 때도 있다. 그 모순 속에서도 사랑들이 편안하게 아침을 맞이하고, 눈물 흘리더라도 다시 손 붙잡고 밤을 맞이하기를 바라는 건 무슨 마음인지. 무사하기를. 당신들도 나도, 같이. -p, 394~3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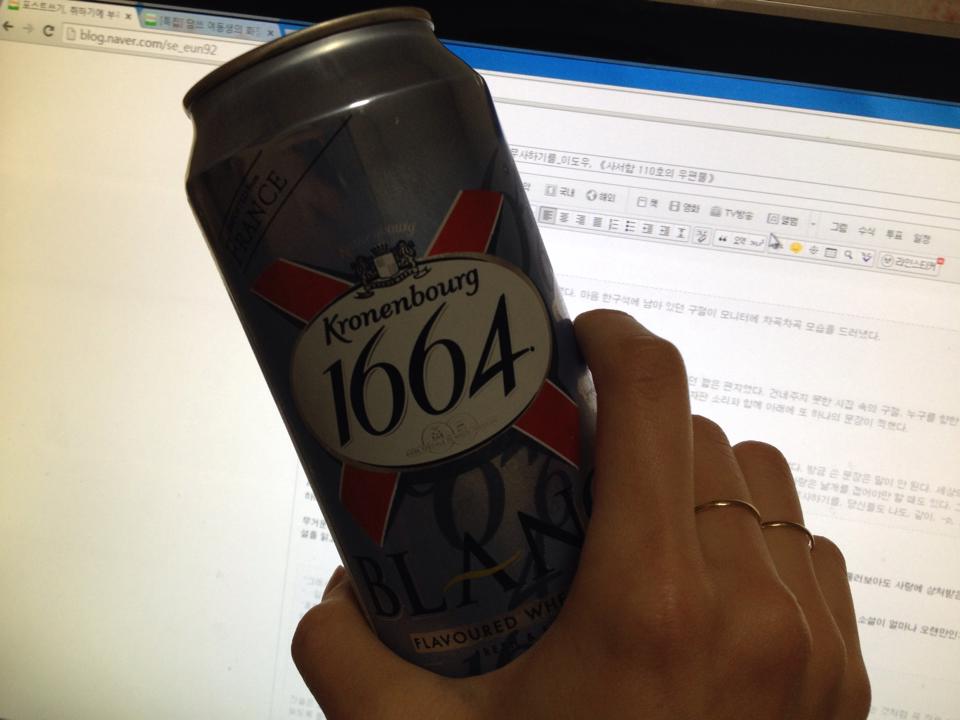
피부가 안좋아진 탓에 10시 쯤 되면 잠들겠다 억지로라도 눕곤 했는데, 오늘은 어쩌다보니 음주포스팅을 하게 되어 지금 이 시간에 글을 적고 있다.
남자친구와 나는 영화를 보든, 근사한 곳에 가서 밥을 먹든 주변에 있는 큰 마트를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도 역시 영화를 보고 마트를 한시간 정도 돌아다녔나보다. 우리 둘 다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 강아지들 간식도 좀 사고, 이것저것 서로한테 사주고싶어하며 "이거 먹어볼래? 이거 사줄게." 하고 장바구니에 잔뜩 담아댔더랬다. 그러다 오빠가 잔향이 정말 좋은 맥주가 있다며 꼭 맛보게 해주고 싶다고 저 맥주도 손에 들려보냈다. 나중에 먹으려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캔을 딴 후였고, 컴퓨터나 하며 맥주를 마시자 하고 이렇게 포스팅을 하고 있는 참이다.

무거운 내용의 책을 읽다보면 가벼이 읽을만한 책이 당긴다. 그래서 언젠가 무심히 책장에 꽂아두었던 이 책을 꺼내들었다.
이도우 작가의 《사서함 110호의 우편물》. '네 사랑이 무사하기를, 내 사랑도 무사하니까' 라는 글귀부터 책 제목, 표지까지 완벽하게 '술술 읽힐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 읽기 시작했는데 역시나 내 촉은 훌륭했다.
메인이 되는 라디오 PD인 건과 라디오 작가인 진솔의 사랑, 그 외에 애리와 선우, 가람, 희연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소설. 내가 생각하기에 결말은 해피엔딩이었지만, 이 해피엔딩의 기준이 참 애매한거란 걸 이 소설을 읽으며 알게됐다. 건과 진솔이 이루어지는 게 해피엔딩인건지, 건과 건을 짝사랑 하는 희연이 이루어지는 게 해피엔딩인건지, 건이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애리와 이루어지는 게 해피엔딩인건지. 소설을 다 읽었을 때 '해피엔딩이라 좋다.' 생각했는데, 건을 짝사랑했던 희연의 입장에선 해피엔딩이 아닐 수도 있었던 거였다.
세상 모두의 사랑이 무사했으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누군가의 사랑이 무사하다면 다른 누군가의 사랑은 무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걸까?
뭐, 나의 사랑은 무사하다. 사랑이 전부는 아니라지만 내 사랑이 무사하지 않을 땐, 그 사랑으로 인해 기분이 좌지우지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 내 사랑을 신경쓰기에도 바쁜 이 와중에 다른 사랑을 신경 쓸 여유는 없다.
다만, 가능하다면 모두의 사랑이 무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요즘 진솔 씨는, 나한테 일기장 같은 사람이에요."
"…일기장?"
"표현이 좀 그런가? 아무튼 어제도 이화동 우리 집까지 강제로 데리고 갔었지, 오늘도 당신이랑 마무리가 안 되니 뭔가 허전했지. 수첩에 몇 줄 적는 것처럼 꼭 진솔 씨한테 하루를 정리하게 되잖아요. 요즘 계속 그랬으니까."
진솔은 좀 묘한 기분이 되어 그와 나란히 걸었다.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나? 어쩐지 이건 아닌데 싶기도 하고…. 생각 끝에 그녀가 신중히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날 친구로 여긴다는 말이네요. 그죠?"
건이 핏 쓴웃음을 날렸다.
"새삼스럽소! 그건 기본이지. 그리고 친구라고 다 속에 있는 말 들려주나? 하여튼 남의 성의 몰라주기는." -p, 160~161
진솔은 물끄러미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무슨 뜻일까. 가끔 그가 툭툭 던지는 알 수 없는 말들. 그저 별 뜻 없이 지나치는 농담인지는 몰라도 그녀에겐 밤늦도록 돌이켜보게 하는 말이 되기도 한다. -p, 205
"이런 곳에 오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건 그 때문인 거 같아요. 살면서 아등바등 힘든 거, 이루지 못해서 속상했던 거 생각해 보면… 어쩌면 다음 생이 있을 거야. 다음 생에선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내 것이 될 수도 있을 거야… 그런 위안이 되거든요, 난."
건은 잠시 말이 없더니 담담하게 대꾸했다.
"내가, 진짜 천기누설을 해볼까요?"
진솔은 무릎에 뺨을 기대고 앉아 그런 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실은 유물론이 옳을 거예요. 인생은 한 번뿐이야.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이번 생에 못 이뤘으면 그만이지, 다음을 기약한다는 건 웃긴 말이야."
"죽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아닐 수도 있지…."
"설령 윤회가 있다고 쳐요. 당신, 전생을 기억하나? 아무것도 모르잖아. 내가 알지 못하는 전생과 다음 생을 왜 생각해요, 이번 생을 살아야 하는 건데."
피식 웃는 그의 음성이 씁쓸하게 들렸다.
"정말 원하는 건, 이번 생에서 해야 해." -p, 240~241
"…내가 전에 했던 말 기억해요? 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놓지도 않고 끌어안고 손 붙잡고 다닐 거라고. 내 여자한테는 그럴 거라고."
진솔은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 엉큼한 놈 아닌데… 오늘 종일 당신 만졌어요. 인사동 찻집에서도 어깨에 팔 두르고, 여기서도 껴안고, 나도 모르게 자꾸 손이 갔어."
건은 낮게 한숨을 쉬더니 진솔에게서 조금 떨어져 손가락으로 자신의 머리를 쓸어 올렸다.
"요즘 항상 같이 지냈죠. 낮엔 일터에서 만나고, 퇴근하면 둘이 시간 보내고. 당신 원고 쓸 시간까지 뺏는 줄 알면서. 오늘 아침도 오피스텔을 나올 때부터… 진솔 씨 하고 싶었던 거, 하나는 같이 해주고 싶다 생각했어요. 그 다이어리에 적혀 있던 것 중에서, 젠장."
그는 조금 쓸쓸하게 웃었다. 그녀를 돌아보지 않은 채.
"사랑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게 사랑이 아니면 또 뭐란 말이야."
진솔에게 이슬같이 눈물이 맺혔다. 사랑이 뭔지는 몰라도… 사랑 아니면 또 뭐란 말인가. 사랑이 아니면. -p, 243~244
어둠이 짙은 유리창 너머 카페촌의 불빛들을 응시하면서 진솔은 멍하니 생각했다. 웬일인지 올겨울엔 마지막인 것들이 많다고. 잘 봐둬야지. 낡은 역사도, 사라질 기차도. 그리고 올겨울 그 마지막 풍경을 그와 함께 볼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했다. 추억이란, 사라지는 풍경이란, 그 자체로만 남는 것은 아니니까. 그때 함께한 사람으로 인해 남는 것이기도 하니까. -p, 290
"사람이 말이디… 제 나이 서른을 넘으면, 고쳐서 쓸 수가 없는 거이다. 고쳐지디 않아요."
진솔은 말없이 듣고 있었다.
"보태서 써야 한다. 내래, 저 사람을 보태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라우. 저눔이 못 갖고 있는 부분을 내래 보태줘서리 쓴다… 이렇게 말이디." -p, 364
"당신 말이 맞아. 나, 그렇게 대단한 놈 아니고… 내가 한 여자의 쓸쓸함을 모조리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아. 내가 옆에 있어도 당신은 외로울 수 있고, 우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는 데 사랑이 전부는 아닐 테니까. 그런데…."
진솔은 눈물이 그렁한 채 건의 품에 얼굴을 묻고 듣고 있었다.
"그날 빈소에서, 나 나쁜 놈이었어요. 내내 당신만 생각났어. 할아버지 앞에서 공진솔 보고 싶단 생각만 했어요. 뛰쳐나와서 당신 보러 가고 싶었는데… 정신 차려라, 꾹 참고 있었는데…."
그의 속삭이는 뜨거운 입술이 그녀의 머리와 이마에 닿아 스쳐갔다.
"갑자기 당신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럴 땐, 미치겠어. 꼭 사랑이 전부 같잖아." -p, 408
*
아. 오빠가 추천해 준 맥주는 훌륭했다. 혼자 홀짝홀짝 마시는 캔맥주는 다 못마시고 버리기 일쑤였는데 이건 양이 어마어마했음에도 포스팅이 끝나는 타이밍에 맞춰 다 마셨다. 입에 남는 잔향도 좋았고 적당히 알딸딸한게 오늘은 눕자마자 잠이 잘 올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