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이그 테일러의 <런더너>(최세희 역, 오브제, 2012)는 제목만 놓고 보면 충분히 낚일 법한 책이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그렇다. 런던 관련 책을 꽤나 사 읽은 나 역시 제목에 눈길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내용을 살펴보았으니 제목의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이겠다.
‘파리지엔’이나 ‘뉴요커’라는 말처럼 ‘런더너’라는 말에 눈길이 한 번 더 가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러나 15쪽에 이르는 꽤 긴 ‘들어가는 말’을 읽고 나면 이 책이 독자를 낚기 위한 의도에서 ‘런더너’라고 제목을 달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베이징의 10분의 1 크기에 약 300개 언어를 사용하는 750만명이 살고 있는 런던. ‘들어가는 말’만 놓고 보면 저자에게 런던은 그다지 우호적이지도 매력적이지도 않았던 것 같다. 심지어 “나는 도시가 자체적으로 날 밀쳐내고 있다고 느꼈다.”(14p)고 말할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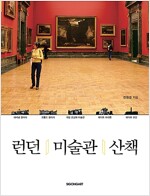
언어소통이 자유로운 캐나다인이 그렇게 느꼈을 정도이니 의사소통이 불편하고 문화 차이가 큰 동양인에게 런던은 어떻게 다가오겠는가. 그러나 이 책은 그와는 조금 다르게 접근한다.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저자가 왜 제목을 ‘런더너’라고 지었는지 이해가 간다. 저자는 “나는 한 번도 누가 런더너이고, 누가 런더너가 아닌지 구분한 적이 없다.”(22p)고 했다. 이는 진정한 런더너라면 “런던 토박이이고, 마리르보 교회 종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태어난 존재여야만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싶겠지만,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런더너에 대한 규정 대신 진정한 런더너를 만나려면 어찌 해야 한다는 대답을 들을 뿐이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런더너를 정의하는 말들 중에서 내가 유일하게 이해한 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런더너라는 것이었다.”(23p) 저자 크레이그 테일러는 5년간 런던 전역을 돌며 200명의 ‘런더너’를 만나 인터뷰한 결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 이 책은 바로 그 말을 내놓는 데 이르기까지 저자가 인터뷰한 기록이다. 3장에 걸쳐 18개의 테마에 85명의 인터뷰이들이 등장한다. 그들 중에는 이란, 우간다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다채로운 일을 하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등장한다. 그들 모두가 ‘런더너’이다. 그들 얘기를 들어보고 싶지 않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