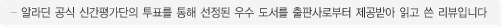[죽음이란 무엇인가]을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죽음이란 무엇인가]을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죽음이란 무엇인가]을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죽음이란 무엇인가]을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죽음이란 무엇인가 - 예일대 17년 연속 최고의 명강의 ㅣ 삶을 위한 인문학 시리즈 1
셸리 케이건 지음, 박세연 옮김 / 엘도라도 / 2012년 11월
평점 :

구판절판

벌써 5년 전 일이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였나? 친구 녀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것도.. 그렇게 그렇게.. 그 친구가 존재하지 않은 세상도 여전히 잘 흘러가고 있었다. 그 친구를 죽음으로 몰아 넣은 입시 전쟁이 원망스러웠고, 너무 나약했던 그 친구, 그리고 그 친구의 손을 잡아 주지 못한 나도 원망스러웠다.
그렇게 나는 고등학교 시절 버텼고, 20대에는 뜨거운 열정을 불사르리라 했지만, 지금도 역시 그렇게 뜨겁지도 미지근 하지도 않다. 가끔 그 친구를 생각할 때, 그 친구의 영혼이 나를 내려다 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친구가 맞지 못한 20대의 뜨거운 바람을 내가 대신 더 열정적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죄책감이 들기도 하다.
이 책의 저자 셸리 케이건 교수는 죽음을 3가지 부분으로 바라 볼 수 있다고 했다. 영혼의 관점에서, 물리주의적 관점에서, 인격의 관점에서 말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나는 영혼주의자 였던 거다. 그렇다. 나는 영혼이 존재를 믿었다. 나는 물리주의자의 말대로 사랑을 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기능을 하는 기계처럼 인간을 바라보고 싶진 않았다. 죽으면 끝이라는 것도 동의하고 싶지는 않았다.
종교적 관점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나는 종교가 없다) 영혼의 존재가 없다면, 신의 존재없다면, 인생을 조금 막 살 것 같았다. 나쁜 짓을 해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고, 착한 짓을 해도 아무런 댓가를 받지 못한다면 (물론 댓가를 바라고 착한 짓을 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 얼마나 비극이겠는가?
1장부터 6장까지 셸리 케이건 교수는 영혼이 없다는 물리주의자의 의견에 동의를 구하기 위해 지루한 논증을 끌고 간다. 그 논증에서 내가 느낀 것은, '영혼이 있던 없던 그게 그렇게 큰 문제라는 말인가.' 1장부터 6장까지 지루한 논증을 끌고 갈 만큼.
1장부터 6장까지를 읽는 동안, 셸리 케이건 교수에게 설득 당한건지 내가 영혼이라고 느껴왔던 것이, 나의 머릿 속에 존재하고 있는 기억일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 친구에 대한 기억, 죽은 누군가에 대한 기억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야 겠다는 끝없는 자기검열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사람이 사랑하고, 누군가를 기억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영혼의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하나의 기능이라고 해도 나한테 그다지 큰 상관이 없는 문제다.
내가 가장 관심이 갔던 부분은 9장 '죽음은 나쁜 것인가' 와 14장 '자살에 관하여' 였다. (물론 관심이 갔던 이유가 그 친구 때문이기도 했으리라.)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박탈 당하기 때문에 나쁜 것이라는 박탈이론도 공감이 갔지만, 더 공감이 갔던 것은 에피쿠로스의 입장이었다.
그러므로 가장 끔직한 불행인 죽음은 사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한 죽음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다. 하지만 죽음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미 사라지고 없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있든 이미 죽었든 간에 죽음은 우리와 무관하다. 살아있을 때는 죽음이 없고, 죽었을 때는 우리가 없기 때문이다. (p.306)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책의 한 부분을 인용하자면,
“죽음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1인칭의 죽음인 나의 죽음, 그리고 3인칭의 죽음인 그들의 죽음, 마지막으로 2인칭의 죽음, 바로 너의 죽음이다. 1인칭의 죽음은 걱정할 것 없다. 죽으면 고통이 없으니까. 죽은 후에는 감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3인칭의 죽음인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얼마 전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나고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나서 사람이 많이 죽었다. 그 소식을 듣고 슬펐던 사람 손을 들어 보라. 별로 없다. 이것이 ‘그들’의 죽음이다. 예를 들어 뉴스에서 비행기 추락으로 230여 명이 죽었다고 할 때 어떤 느낌이 드나. 그냥 ‘230’이라는 숫자로만 느껴질 것이다. 이런 것이 ‘그들’의 죽음이다.
중요한 것은 2인칭의 죽음인 ‘너’의 죽음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슬픈 게 바로 ‘너’의 죽음이다. ‘너’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들’의 죽음과 뭐가 다른지 알거다. 학기 초에 친구들이 처음 만났을 때는 모두 ‘그들’이었다. 그런데 한 학기가 지난 후에는 ‘너’가 돼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두고 떠나는 건 가장 큰 고통이다"
<생각해 봤어? 인간답게 산다는 것 - 교육공동체벗> 中 에서>
셸리 케이건 교수는 마지막 14장에서는 공리주의적 관점, 의무론적 관점에서 자살을 다루고 있다. 나는 자살도 따지고 보면 일종의 생존방식이고 (물론 의미와는 거리가 먼 방식이지만), 살아있음 그 자체가 고통일 때 행하는 것이기에 결국 죽음으로라도, 죽음보다 더한 두려움을 탈출해 생존하고 싶은 욕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자살에 대한 철학적 논쟁보다는 죽음보다 더한 두려움을 '너'란 존재로 극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한테 '너'가 없으면 '나'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닐까? 자살의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은 '너'가 없는 사람이 아닐까? 가족이든, 친구든 말이다.
그 친구에게 죽음보다 더한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그 친구에게 '너'라는 존재가 아닌 '그들'의 존재였다는 생각이, 그 죄책감이,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 나를 끊임없이 괴롭힌다. 나는 괴롭게도 이 책을 읽는 동안에 죽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 해 볼 수 있었다. 이 책은 나에게 수 많은 철학적 논제들을 던졌고, 나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나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은 없다. 삶이 귀하고,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가치있는 것이니까. 카프카의 말대로 삶이 소중한 이유는 언젠가 끝나기 때문이니까. 그 때문에 이 삶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이 내 마음 속에 반짝일 뿐이다. 내가 그 친구에게 '너'의 존재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아직도 '너'의 존재를 찾지 못한 '나'에 대한 연민으로 이 글을 마친다.